북한 전문 취재기자 니시무라 히데키의 르포르타주
입력2020.09.10. 오후 12:07
 김성수 기자
김성수 기자[프레시안books] '일본'에서 싸운 한국전쟁의 날들, 재일조선인과 스이타 사건
[김성수 기자(=전북)(starwater2@daum.net)]
나는 시위대의 후미에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전쟁에 보내지던 군수 열차를 10분간 멈추면, 1000명의 동포를 살릴 수 있다고 해서 필사의 심정으로 참여했습니다. -김시종, 300쪽
두 사람은 한반도 중앙부의 잘록한 부분을 가로지르는 선에 시선을 멈췄다. 북위 38도선이다. 이렇게 해서 지도에 다트를 던지는 것보다 약간 복잡한 정도의 절차를 거쳐 분할안을 제출했다. -데이비드 핼버스탬, 133쪽
경찰과 대치할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했다. 시위대의 선두에는 175센티미터 정도의 유달리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체격의 한 남자가 있었다. 돌출된 광대와 먼 곳을 응시하는, 옆으로 길게 찢어진 눈매는 굳건한 의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부덕수(夫德秀). 재일조선인 2세다. 시위대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어디로 향하는 것인가. 부덕수는 왜 선두에 서 있나. 그리고 누가 계획한 것인가. -니시무라 히데키, 32쪽
이 책의 저자 니시무라 히데키(西村秀樹)는 마이니치방송(毎日放送)에서 30년이 넘도록 북한취재 전문 기자로 활약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동서로 분단되었던 독일의 과거를 상기하면서 왜 전범국 일본이 아닌 식민지였던 조선이 분단되었는지 문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전쟁 시기에 일본이 소해정(掃海艇)과 LST(전차양륙함, landing ship tank)를 보내 사실상 '참전'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국헌법의 토대를 뒤흔들 정도로 중요하다. 일본이 한국전쟁 당시 무기를 수송하고 있었다는 것은 일본국헌법 제9조를 국가가 앞장서서 보란 듯이 위반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1946년에 공포되어 이듬해 시행된 일본국헌법 제9조 1항과 2항에는 '전쟁'과 '군대'를 포기한다는 사실이 명기돼 있다. 이는 일본국헌법이 줄곧 '평화헌법'이라 불리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일본이 미국의 병참기지가 돼 여러 군사작전을 수행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이 사실은 일본국헌법의 중심축을 흔들 수 있는 것임에도 한국과 일본 양쪽 모두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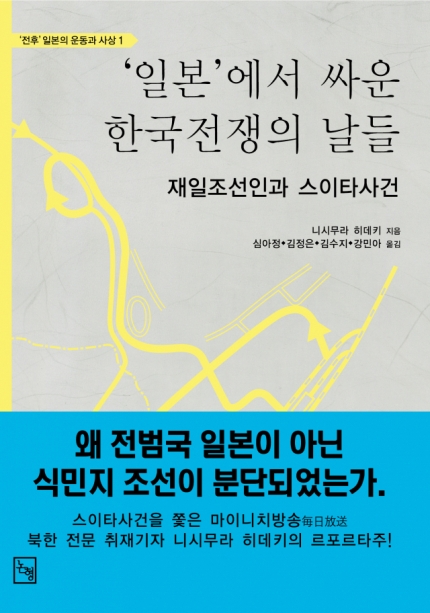 원본보기ⓒ논형출판사
원본보기ⓒ논형출판사저자는 방대한 사료와 인터뷰를 통해 일본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이 '전후'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그리고 왜 은폐돼 왔는지를 밝힌다. 그리고 이러한 취재의 여정에서 저자는 재일조선인들의 운동과 사상에 휘말려 들게 된다.
이 책에서 저자가 특히 주목하는 스이타(吹田) 사건은 1952년 6월 24일 밤, 오사카 스이타시(市)에서 한국전쟁 시기에 일본이 미군의 병참기지로써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등 전쟁에 협력하는 것에 항의하며 학생과 노동자, 조선인이 일으킨 반전(反戰) 투쟁이다. 김시종(金時鍾) 시인은 "한국전쟁에 보내지던 군수 열차를 10분간 멈추면, 1000명의 동포를 살릴 수 있다는 필사의 심정으로 참여했다"고 사건 당시의 경험을 전한다.
900여 명의 시위대가 1952년 6월 25일 오전 0시를 기해 행진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대와 충돌, 파출소와 미군 승용차에 화염병과 돌을 던지고 도주하고, 한큐 전철 측에 임시전철을 운행토록 해 이를 '인민전철'이라 부르며 승차했으며, 20분 동안 조차작업을 중단시킨 것을 이유로 111명이 소요죄 및 위력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체포·기소됐다.
소요죄 무죄판결을 받게 되는 1972년까지 재판에 걸린 기간만 해도 무려 19년에 이른다.
저자는 스이타 사건 그 자체를 쫓고 있기도 하지만, 관련자들이 살아간 사건 '이후'의 삶을 비춰낸다. 스이타 사건은 일본의 3대 소요 사건 중 하나로, 소요죄와 표현의 자유 사이를 왕복하며 갈등했던 헌법 판례로 다루어지면서 헌법 연구 분야에서는 잘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스이타 사건이 지닌 또 하나의 측면, 즉 제국 일본의 식민지배가 남긴 '얼룩'과도 같은 존재인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인들과 함께 벌인 한국전쟁 반대운동이었다는 점은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했다. 한국에서도 스이타 사건은 일본의 전후 운동사만큼이나 낯선 이름이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에 관한 신문 기사와 보도에서도 이들의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다.
주류의 거대서사에서 생략된 존재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이야기 속에서 출몰하고 그 이야기 속에 살아있다. 저자가 사건 관련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록함으로써 밝혀낸 것은 사건의 진상이나 전모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에 그들이 살아온 삶의 굴곡과 주름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펼쳐서 기록으로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사건 당사자가 아닌 니시무라들이 '공감적 청자'를 자처하며 스이타 사건 연구모임을 만들어 함께-듣는 장(場)을 만든 덕분이다.
한국전쟁은 저자의 표현처럼 '국제적 내전'의 성격을 지녔다. 이 책의 한국어판 제목은 ['일본'에서 싸운 한국전쟁의 날들- 재일조선인과 스이타 사건]인데, 여기서 '일본'은 영토로 구획된 국민국가로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민족과 국가 혹은 시민이라는 주어진 정체성의 토대가 '반전'이라는 공통의 지향으로 흔들림으로써 연결될 수 있었던 이들이 함께 싸워낸 시공간을 의미한다.
일례로 이 책에는 삐라를 뿌리고 경찰에 쫓기던 부덕수가 일면식도 없는 일본인 노동자들의 도움을 받아 도망친 에피소드가 소개돼 있는데, 그는 일본어가 어설펐던 자기에게 아무 것도 묻지 않고 도움을 준 일본인 노동자들을 상기하고 "한국전쟁에 반대하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마음이 서로 통했던 것"이라며 그런 마음이 지금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이 현재에 일어난다면 어떨지를 독자들에게 묻는다.
"대기업 경비원이 낯선 남자에게 과연 문을 열어 줄까. 그리고 공장 안의 노동자들은 삐라 살포를 하다가 도망쳐 온 그를 도와줄 것인가"
이 책 곳곳에는 조선, 조선반도, 조선전쟁 등 생경한 단어들이 등장한다. 지금 '조선'은 어디에도 없는 곳이다. 그러나 재일조선인들에게 '조선'은 식민화되기 이전의 박제된 과거 모습 그대로 회귀해 만날 수 있는 조국도 아니며, 인민이라는 수식어를 무색케 하는 북의 '공화국'을 지칭하는 말도 아니다.
제주에서 4·3의 피바람을 피해 소중한 이들을 남겨둔 채 작은 배로 밀항한 이들이 흘러들어와 살았던 동네 이카이노(猪飼野)에도 '조선'은 있었고, 한국전쟁에 사용될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는 열차를 저지하기 위해 서로의 몸을 묶고 누웠던 철로 위에도 '조선'은 있었으며, 한국전쟁 반대운동을 하며 인민전철에 올라탄 그 밤에도 일본인과 재일조선인 청년들의 마음에는 함께 꿈꾸던 '조선'이 있었다. 따라서 '조선'은 국민국가라는 정치체제를 넘어선 의미, 즉 하나의 '실체'라기보다는 어떤 공통의 '심정'의 장소에 가깝다.
이 책은 김시종이 크로포트킨의 말을 빌려 부덕수(夫德秀)에게 보낸 전언으로 끝을 맺는다.
"그걸로 됐다, 거기에는 나의 지순한 시절이 있었으니" 일본의 헌법학자 마에다 아키라(前田朗)는 이 문구를 마음속으로 되뇌며 "너무 상냥하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도 격렬한 이 말의 의미를 대부분의 일본인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연 한국인이라고 다를까. 이 책을 통해 한국전쟁 시기에 일본에서 겪어낸 참전과 반전의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독자들이 발 딛고 있는 세계, 즉 '조선'이라는 심정과 ‘일본’이라는 장소성이 생략된 한국전쟁의 일면적인 토대를 흔들며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
[김성수 기자(=전북)(starwater2@daum.net)]
이 책에서 저자가 특히 주목하는 스이타(吹田) 사건은 1952년 6월 24일 밤, 오사카 스이타시(市)에서 한국전쟁 시기에 일본이 미군의 병참기지로써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등 전쟁에 협력하는 것에 항의하며 학생과 노동자, 조선인이 일으킨 반전(反戰) 투쟁이다. 김시종(金時鍾) 시인은 "한국전쟁에 보내지던 군수 열차를 10분간 멈추면, 1000명의 동포를 살릴 수 있다는 필사의 심정으로 참여했다"고 사건 당시의 경험을 전한다.
900여 명의 시위대가 1952년 6월 25일 오전 0시를 기해 행진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대와 충돌, 파출소와 미군 승용차에 화염병과 돌을 던지고 도주하고, 한큐 전철 측에 임시전철을 운행토록 해 이를 '인민전철'이라 부르며 승차했으며, 20분 동안 조차작업을 중단시킨 것을 이유로 111명이 소요죄 및 위력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체포·기소됐다.
소요죄 무죄판결을 받게 되는 1972년까지 재판에 걸린 기간만 해도 무려 19년에 이른다.
저자는 스이타 사건 그 자체를 쫓고 있기도 하지만, 관련자들이 살아간 사건 '이후'의 삶을 비춰낸다. 스이타 사건은 일본의 3대 소요 사건 중 하나로, 소요죄와 표현의 자유 사이를 왕복하며 갈등했던 헌법 판례로 다루어지면서 헌법 연구 분야에서는 잘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스이타 사건이 지닌 또 하나의 측면, 즉 제국 일본의 식민지배가 남긴 '얼룩'과도 같은 존재인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인들과 함께 벌인 한국전쟁 반대운동이었다는 점은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했다. 한국에서도 스이타 사건은 일본의 전후 운동사만큼이나 낯선 이름이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에 관한 신문 기사와 보도에서도 이들의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다.
주류의 거대서사에서 생략된 존재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이야기 속에서 출몰하고 그 이야기 속에 살아있다. 저자가 사건 관련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록함으로써 밝혀낸 것은 사건의 진상이나 전모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에 그들이 살아온 삶의 굴곡과 주름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펼쳐서 기록으로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사건 당사자가 아닌 니시무라들이 '공감적 청자'를 자처하며 스이타 사건 연구모임을 만들어 함께-듣는 장(場)을 만든 덕분이다.
한국전쟁은 저자의 표현처럼 '국제적 내전'의 성격을 지녔다. 이 책의 한국어판 제목은 ['일본'에서 싸운 한국전쟁의 날들- 재일조선인과 스이타 사건]인데, 여기서 '일본'은 영토로 구획된 국민국가로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민족과 국가 혹은 시민이라는 주어진 정체성의 토대가 '반전'이라는 공통의 지향으로 흔들림으로써 연결될 수 있었던 이들이 함께 싸워낸 시공간을 의미한다.
일례로 이 책에는 삐라를 뿌리고 경찰에 쫓기던 부덕수가 일면식도 없는 일본인 노동자들의 도움을 받아 도망친 에피소드가 소개돼 있는데, 그는 일본어가 어설펐던 자기에게 아무 것도 묻지 않고 도움을 준 일본인 노동자들을 상기하고 "한국전쟁에 반대하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마음이 서로 통했던 것"이라며 그런 마음이 지금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이 현재에 일어난다면 어떨지를 독자들에게 묻는다.
"대기업 경비원이 낯선 남자에게 과연 문을 열어 줄까. 그리고 공장 안의 노동자들은 삐라 살포를 하다가 도망쳐 온 그를 도와줄 것인가"
이 책 곳곳에는 조선, 조선반도, 조선전쟁 등 생경한 단어들이 등장한다. 지금 '조선'은 어디에도 없는 곳이다. 그러나 재일조선인들에게 '조선'은 식민화되기 이전의 박제된 과거 모습 그대로 회귀해 만날 수 있는 조국도 아니며, 인민이라는 수식어를 무색케 하는 북의 '공화국'을 지칭하는 말도 아니다.
제주에서 4·3의 피바람을 피해 소중한 이들을 남겨둔 채 작은 배로 밀항한 이들이 흘러들어와 살았던 동네 이카이노(猪飼野)에도 '조선'은 있었고, 한국전쟁에 사용될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는 열차를 저지하기 위해 서로의 몸을 묶고 누웠던 철로 위에도 '조선'은 있었으며, 한국전쟁 반대운동을 하며 인민전철에 올라탄 그 밤에도 일본인과 재일조선인 청년들의 마음에는 함께 꿈꾸던 '조선'이 있었다. 따라서 '조선'은 국민국가라는 정치체제를 넘어선 의미, 즉 하나의 '실체'라기보다는 어떤 공통의 '심정'의 장소에 가깝다.
이 책은 김시종이 크로포트킨의 말을 빌려 부덕수(夫德秀)에게 보낸 전언으로 끝을 맺는다.
"그걸로 됐다, 거기에는 나의 지순한 시절이 있었으니" 일본의 헌법학자 마에다 아키라(前田朗)는 이 문구를 마음속으로 되뇌며 "너무 상냥하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도 격렬한 이 말의 의미를 대부분의 일본인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연 한국인이라고 다를까. 이 책을 통해 한국전쟁 시기에 일본에서 겪어낸 참전과 반전의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독자들이 발 딛고 있는 세계, 즉 '조선'이라는 심정과 ‘일본’이라는 장소성이 생략된 한국전쟁의 일면적인 토대를 흔들며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
[김성수 기자(=전북)(starwater2@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