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석 (북경대학 일어일문학 박사. 중국 화북전력대학 한국어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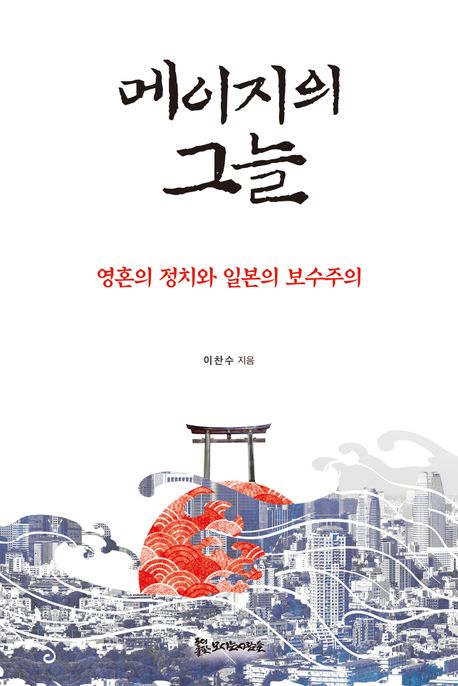
[일간투데이 양보현 기자]
한·일 갈등 뿌리는 서로 다른 의식 구조
日천황, 메이지유신 국가종교 시스템 정점
절대적·시원적 존재로서 무오류·무책임성
머나먼 화해의 길 첫걸음은 상호 이해로부터
“참을성이 있어야 해. 우선 내게서 좀 떨어져 앉아 줘. 저쪽 풀밭에 말이야. 그럼 내가 곁눈질로 살짝 널 볼 거야.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은 오해의 근원이거든. 그렇게 매일 조금씩 가까이 다가앉는 거야.”(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중에서)
어린 왕자에게 여우가 말했다. 그리고 둘은 친구가 되었다. 시간을 두고, 아주 서서히. 세상 모든 일이 그렇다. 단박에 되는 일은 잘 없다. 거리를 두고 말을 아끼며 때를 기다려야 한다. 여우가 했던 말들은 여전히 생생하다. 깊은 사막을 넘어 동아시아의 두 나라에서도 말이다. ‘메이지의 그늘’.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른 생각이었다.
이 책은 저자의 일본 연구가 집약되어 녹아 있다. 청년기의 지적 호기심에서 장년기를 거치며 원숙해진 실천적 관심까지. 수많은 논문에서 다져진 생각이 고스란히 농축되었다. 거기엔 신학과 불교학의 언어가, 통일과 평화학의 몸짓이, 레고 블록처럼 짜여있다. 작은 책이지만 결코 작거나 가볍지 않은 이유다.
책의 처음과 마지막 꼭지. ‘한국과 일본, 왜 꼬였나’. 그리고 이루어야 할 ‘다른 정서의 조화’. 양 끝에 배치된 두 개의 소제목이다. 이 책의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왜’ 갈등하나, 그래서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쉽지 않다. 난제(難題) 중의 난제다. 두 소제목 사이의 거리는 아득하다. 우주의 깊이만큼이나 멀어 보인다. 그 거대한 사이, 틈새마다 곡절이 가득하다. 그 지도리에 일본의 ‘천황제’와 ‘영혼의 정치’가 있다.
저자는 말한다. 메이지 시대부터 일본은 국가를 위해 죽은 이들을 제사지냈다고. 이른바 ‘호국영령’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사다. 그 제사의 정점에 ‘천황’(天皇)이 있다. 죽어서 신이 된 자들의 계보, 그 꼭대기에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이 놓인 것이다. 일본 국민이 올리는 모든 제사는 궁극적으로 천황에게 바치는 것이 된다. 종교적 국가 시스템. 메이지 유신이 만들어낸 일본이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빚어진다. 메이지 이후 일본인은 세상의 근원이며 절대적 존재인 천황을 넘어서는 가치를 상상하기 힘들다. 양심의 근거 혹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보편적 가치 관념이 약하다. 한국인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느냐!”라고 호통 칠 때의 그 ‘하늘’. 일본인에게는 그 ‘하늘’이 낯설다.
결국,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의 국토경계선. 거기까지가 일본인이 ‘공(公)’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범위가 된다. 그 토대는 물론 천황이다. 모순은 여기서 시작된다. 천황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지울 수 없다. 세계의 근원이자 존재의 원천이니 오류도 실수도 없다.
나쁜 일이 벌어졌다면 당시의 ‘공기’[구키, 空氣]가 만들어낸 결과다. 일시적으로 형성된 외부적 현상의 산물일 뿐이다. 누군가는 져야 할 ‘책임’은 그렇게 공기처럼 허공에 흩어진다. 이를 이해하면 일본의 많은 것이 보인다. 주변 국가를 침략한 것도, 과거사 반성에 소극적인 것도, 심지어 후쿠시마 오염수를 그렇게 방류하는 것까지도 말이다.
이 책은 쉽사리 ‘화해’를 말하지 않는다. ‘화해’는 괄호 속의 기호처럼 묶여 있다. 기의(記意)는 있으되 기표(記標)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화해는 너무 먼 길이다. 아득하다.
저자의 제안은 간결하다. “서로의 진심을 읽는 공동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화해의 첫 걸음은 이해다. 서로를 아는 데서 시작한다. 그들의 몫은 그들에게 두자. 우리는 다만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
다시, 사막의 한가운데다. 어린 왕자와 헤어질 무렵이었다. 여우는 말했다. ‘마음으로 보아야 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으로 읽기. 이 책은 그 시작으로 손색이 없다.
양보현 기자 report033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