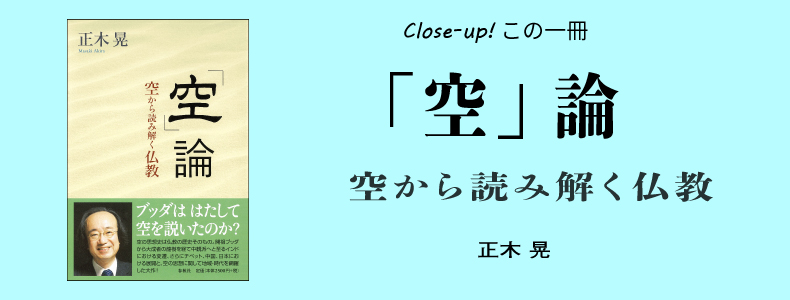言葉とは何か 1. - 奥の細道を求めて
단어는 무엇입니까 1.
2021/03/23 19:48
나는 불교의 본질이란 모든 생물에 공통인,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번뇌에 의해 가치가 있는 고정적 현실 세계, 세속(무명)에서 → 하늘(명)의 세계를 경유하여 → 자유로운 세계)로서의 현실을 사는 (행복한)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그 3층의 세계는 다르지 않다. 석가님이 남겨진 말 속에 있는 것처럼 그 3층의 세계는 동시에 체험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그것은 같은 코토바 그래서, 시선의 교차나 패션과 같은 모호한 커뮤니케이션도 포함하지만, 가능하면 일상 언어에 의해서 나는 말하고 싶다)에 의해 기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하늘과 무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무는 결코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화할 수 없는 반면 하늘은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언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도교의 전통이 깊은 중국 선에서는 무와 하늘을 동시에 주장하지만, 인도 불교에서는 <무>와 <하늘>은 분명히 나눠야 한다(석가님 당시의 인도에는 육파 외도라고 불리고 있었다 사상가 안에 얕은 허무주의자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허무주의자가 없었던 중국에서는 도교와 동화한 중국 선은 그런 코토바를 부정하지만 티베트 불교(중관파)는 그것을 탐구하고 있다.
오토리아의 철학자인 위트겐슈타인도 『논리철학 논고』 속에서 「논리적인 말의 의미의 한계」를 설정하지만, 하지만 코토바는 뭔가의 사용법에 의해 체험할 수 있는 세계의 모든 것을 기술할 수 있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위트겐슈탄 자신도 그것은 인정하고 있어, "철학적(논리적) 언어로는 그것을 말할 수 없지만, 시적 언어, 회화, 음악에서는 그것을 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과연 논리적 언어로는 말할 수 없는 것일까. <하늘>은 시적 언어, 예술로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탐구를 위해서는, 그 3단계의 층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토바의 본연의 방법은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세계와 그와 관련된 내가 어떻게 성립하고 있는가'를 철학적으로 묻기 위해서는 논리적 언어를 사용하는 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인도 불교 중관파인 너걸 주나, 바라몬교 언어 철학파인 발트리하리도 입장은 다르지만 이 점에 관해서는 공통적이다. 그 난문에 대한 단서로서 지금은 말의 문제를 나 나름대로 논해보고 싶다. 말이란 <나>와 <세계>와의 접점이기 때문에, 인기로서의 3층의 세계에 공통되는 코토바의 본연의 자세를 탐구하고 싶다.
말은 원래 프랑스의 언어학자 소슈르가 명시했듯이 혼돈한 <세계>를 분절하기 위한 도구/기호 밖에 없었을 것이다. 현실세계 속의 존재자(물)를 사람의 의식에 따라 차별화하고, 그들을 그룹화함으로써 사람이 가장 살기 쉬운 <세계/문화>를 구축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시도는 훌륭하게 성공했다. 나는 사람 이외의 동식물도 나름의 <세계>를 분절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완성된 하나의 <문화>를 구축한 것은 인간뿐이었다.
사람은 말에 의한 공통인식을 획득함으로써 사람이 생활하기 쉬운 <세계>를 다른 생물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일단 그런 <세계>를 만들어 버리면 사람의 <세계/문화>는 독자적으로 진화해 버리는 기구를 가지고 버리는 것 같다.
본래는 각 개인(생물)의 분절 밖에 없었던 <의미>가 고정화되어 사회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버린다. 원래는 자유로운 <의미>로밖에 없었던 것이 자국에서만 통용하는 화폐와 같은 고정된 <가치>를 가지고 버리는 것이다. 유동적이었던 의미가 고정화되어 버리면, 그것은 그 자체로 성립하고 있는 <실재/자성>이라는 개념으로 변화해 버린다. 불교는 유동적인 존재/의미(인기)는 인정하지만 고정해 버린 <실재/자성>은 부정한다. 그래서 말의 문제는 불교에서도 중심적인 주제 중 하나이다.
석가님의 초전 법륜 중에서도 이 문제는 '정어'로서 사상·팔정도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부끄럽지만, 내가 이 사기·팔정도의 중요성을 겨우 알아차린 것은 극히 최근이다. 내가 30년 정도 전에 처음 읽었을 때, 사포·팔정도는 모두 당연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버렸는데, 그 인식은 잘못되었던 것에 간신히 깨달았다. 그것은 내가 동남아시아 국가의 상좌부 불교의 나라를 걸은 것과 인도의 가난한 살기 어려운 카스트 밖의 사람들의 생활을 1년 이상이나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팔정도는 하나씩을 다루면 인도에서도 일본에서도 현실을 살기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거기에 사포를 관계 붙여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어렵다. 팔정도는 「정견・정사・정어・정업・정명・정정진・정념・정정」으로 분류되어 있다. 나는 아직 이 8개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지 않지만, 처음 3개와 마지막 2개는, 「정어」란 무엇인가, 를 탐구함으로써 통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 .
석가님의 초전법륜에서는 전정각산에서 함께 수행한 5명의 수행자에게 일주일에 걸쳐 설명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석가님이 기억을 열린 부다가야부터 초전법륜의 사루나트까지는 걸어서 일주일 걸렸다고 생각한다(나는 정비된 길을 챠리로 달려 4일 걸렸지만). 그동안 석가님은 자신의 기억을 어떻게 설명하니 이 진리를 함께 수행한 다섯 명의 히오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에 납득받을까, 필사적으로 생각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일주일에 걸쳐 설명한 것이다. 1주일째에 처음 한 사람이 기억을 열고, 그 후 또 며칠 후 마지막 다섯 번째도 똑같이 기억을 열었다. 석가님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셨을까. 나도 그 자리에 있다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추할 수밖에 없다.
말의 사용법의 예로서, 이전의 기사에서도 썼기 때문에 「사과」와 「달」이라는 말을 생각해 본다. 사과 달은 전혀 다른 것이지만 모양이 비슷할 수도 있으므로 사과가 하늘에 떠 있다고 봐도 좋고 달이 맛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그쪽이 자유롭고 재미있다. 하지만 피아제라는 프랑스 아동심리학자는 말을 '개인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피아제 '구조주의' 푸코의 정점). 말은 제일의적으로는 개인의 내부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넘은 사회공동체 내부의 규범으로서 성립하고 있다고(위트겐슈탄의 사적언어의 불가능 성). 비슷하다고 해도 달은 먹을 수 없고, 사과를 던져도 하늘에는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실제로 그런 것을 시도하는 것은 시간의 낭비이고, 뭔가 사고가 일어나면 공동체의 이익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세계의 옛 이야기에는 하늘을 날려고 한 남자의 이야기가 많다. 대부분은 사회의 귀찮은 것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그려지는데, 무언가의 계기로 정말로 하늘을 날아 버린다. 그것을 보고 처음으로 모두는 사람이 하늘을 날아간다는 이미지를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볼 때까지 그 사람들은 그 이미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즉, 사과는 어디까지나 나무에 열매를 맺은 음식으로, 달은 지구를 돌아다니는 바위 위성밖에 없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버리면, 그 말의 이미지는 고정해 버려 실재/자성으로 변화한다 버린다. 물건/언어의 유용성/유효성/가치를 제일의로 해석해 버리면, 세계가 고정되어 지루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미치모토가 말하는 <부드러운 마음/코토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다면 코토바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불교, 특히 선에서는 일상(유효) 언어를 부정한다. 그렇지만, 문헌을 조사해 보면 선종이 쓴 것이 가장 많은 것은 왜일까. 아마 일단, 일상(세속)의 말을 부정한 다음 거기에서 말의 가능성을 시라는 방향으로 탐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 중관파에서는 어떨까. 중관파는 말의 논리성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논리적 언어에 의해 승의 포기(하늘)를 탐구/기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논리란 <모노고토>간의 관계성일 뿐이기 때문에, 관계성만으로 이 다양한 현실의 세계를 탐구/기술하기 위해서는, 그 코토바의 사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다 의 것일까.
여기서 나는 이츠키 슌히코가 쓴 것을 인용하고 싶다. 이전 기사에서도 소개했듯이, 이통은 언어의 천재로 30여 개 국어를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확실히 프랑스의 유명 대학에서 그리스어, 라틴어, 아랍어를 구사하면서 종교학(이슬람교였을까)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무언가의 책에서 읽은 기억도 있다. 그의 전문은 이슬람이므로 '이슬람 철학의 원상'이라는 책 속의 이슬람 신비주의의 철학자 이븐 아라비를 소개한 부분을 인용한다.
우리는, 예를 들면 피어 있는 꽃을 보고, 「여기에 꽃이 있다」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븐 아라비에 말하자면, 이런 표현은 일의 진상을 매우 왜곡된 형태로 제시하는 것만으로, 사실은 꽃이 있는 것은 아니고, 존재가 있을 뿐입니다, 꽃이라는 한정을 받은 형태로. 그러나 이렇게 하면 존재가 무슨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존재적 에너지가 여기에서 꽃이라는 형태로 결정하여 자기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도 말해야 합니다. 즉 일의 진상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일상적 언어 외에, 혹은 그 위에, 일종의 철학적 메타언어, 고차언어라고 하는 것을 만들 필요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메타 언어로는 「꽃이 존재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일본어로서는 묘한 표현이 됩니다만, 「존재가 꽃한다」라든가, 「여기서 존재가 꽃하고 있다」라고 하는 형태가 아니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철학적 언어에서는 모든 경우에 존재가 존재하고 존재만이 주어가 되어야 한다. 다른 모든 것은 모두 술어입니다. 이와 같이 이해된 「존재」, 즉 절대 무한한 존재 그 자체를 정점에서, 그 자기 한정, 자기 분절의 형태로서 존재자의 세계가 전개한다. (굵은 글씨는 이통, 밑줄은 필자에 의한 강조)
이 문맥에서의 「존재」란 존재자(개별물)의 궁극의 본연의 방법(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에서는 유일하게 절대의 신)이다. 서양의 일신교와 일본이나 인도의 다신교, 그리고 불교와 같은 무신교는 결정적으로 다르지만, 하지만 나는 이츠키 슌히코에게 공감을 느낀다. 하나님도 하늘도, 어쩌면 어떤 관점에서 하면 같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므로 이 맥락에서의 존재(신)는 불교의 맥락에서 '하늘' 또는 '연기'로 바꿀 수 있다. 하늘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불교의 메타(통합적/초월적/형이상적) 언어에도 주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담이지만 “고대 일본어에 주어는 없었다”고 주장한 언어학자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고대 일본어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서행의 노래로,
하늘이되는 마음은 봄의 카스미에서 세상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문법적으로는 '마음'이 주어로 해석되는 것이지만, 이 맥락에서는 마음이 비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 노래에는 주어가 없다. 문법적으로 주어를 없애고 이 노래를 읽어보면,
하늘 마음 봄의 카스미라면 한결 살아 어려운 현실 세계를 버리고 (출가해) 버리자
라고 읽을 수도 있다.
『겐지 이야기』에서도 많은 경우에 주어가 없다. 이것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원래 일본어에는 주어가 없었는데, 그러면 문장의 의미가 통과하지 않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주어를 보충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주어가 없는 편이 일본어로는 단적으로 아름답게 느껴진다.
이 감각은 불교학자의 야마오리 테츠오가 '일본인의 심정'이라는 책 속에서 일본인 특유의 '유리혼 감각'이라고 부른 것이다. 살아있는 채로 영혼이 육체(울타리)를 떠나 놀다. 반면 서양 철학/신학에서는 정신은 항상 육체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며 거기에서의 해방/자유란 마지막 심판에서 순수한 정신이 '신의 나라'로 멸망하는 육체를 멀리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서양에서는 순수한 정신/신이라는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모노>가 실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해, 낡은 일본의 정신 문화에서는 영혼은 개인의 내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놀이 되는 <코토>라고 생각되고 있었다. 이런 종교관이 무종교라고 불리는 현재 일본인의 마음 속에도 잠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의 기본은 코토바의 본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에 있다는 것이다. 바르토리하리가 주장한 것처럼, 코토바의 본질은 고정적인 명사에는 없고, 문맥에 있다. 그리고 그 문맥을 근본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동사다. 그래서 어떤 언어에서도 동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다음으로, 정신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코토바를 보고 싶다. 정신분열증이라는 병에서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코토바를 말하는 '신어 창작'이라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같다. 이타바시 작미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의 「미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논문(가능하면 기무라 토시의 책으로부터 인용하고 싶었지만, 유감스럽지만 지금 수중에 없기 때문에)로부터 인용한다.
『이상한 언어와 논리』
[…] 불가해한 것으로 정신 분열증 환자의 언어와 논리가 있습니다. 정신 분열증을 언어 문제로 간주할지 논리 문제로 보는지는 정신병 학자에 의해 분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 미야모토 타다오는 그들의 언어로 눈을 돌린다. 미야모토는 정신분열증 중 하나인 망상에 대해 "언어 없이는 망상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리고 소슈르류의 구조언어학을 응용하여 정신분열증 환자의 망상적 언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용어는 a → b → c → d와 같이 통사 관계, 결합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a, b, c, d 각각은 b라면 b1, b2, b3, ...이라는 범주 관계, 연합 관계를 갖는다. 그런데 정신분열증 환자의 망상적 언론에서는 종종 a→b→b1→b2→b3→c→d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미야모토는 말한다. 〔…〕무시간적 동시적인 범열관계가, 언론 속에서 시간적 계기적인 통사관계로서 나타나 버리는 것이다.
또 하나, 미야모토가 말하는 것은, 언어 기호(시뉴)의 「의미 붙이려는 것」(시니피안)과 「의미 붙여진 것」(시니피에)의 분리, 괴리이다. 그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망상에서는 한 단어의 분리된 "뜻하는 것"이 다른 단어의 분리된 "의미되는 것"과 연결되어 망상적 언어 기호를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그 예로서, 어떤 망상 환자의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 환자는 “거리 위에서는 아무래도 매우 달랐다. 뭔가 일어났음에 틀림없었다. 곁을 지나친 한 남자는 매우 날카로운 눈을 하고 있었다. 아마 탐정이었다. […] 가는 도중에는 매우 사람이 많았다. 말했다. 미야모토는, 이 환자에서는, 「우산을 두드리게 한다」의 「의미하는 것」과, 「장구」의 「의미되는 것」이 결합하고 있다고 한다. […] 그 때문에 병자는 <망상의 말>로 한층 더 세상을 덮고 싶다”는 것이다.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의 모호한 기억이지만, 더욱 증상이 진행되면 「다다다의 다리가 청소하고 머리는 마이 마이지만 젓가락 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코토바를 사용하게 되는 일도 있다 같다. 왜 정신분열증자는 이런 코토바의 사용법을 하는 것일까. 아마도 그들의 첨예화된 세계와 우리의 만성화된 일상 세계 사이에 묻히지 않는 깊은 그루브가 태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그 그루브를 메우려고 해서 그들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나>와 <그 세계>를 통합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단순한 <망상의 말>이라고 말해 버려도 좋은 것일까. 나에게는, 그것은 결코 근거가 없는 단지 츠기하기의 <망상의 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것은 필요에 육박한 위에서의 필사적인, 일종의 시적 언어로의 표현이다. 그리고 실제로 시인이 사용하는 코토바도, 본질적으로는 이런 것이 아닐까.
언어
불교 철학
===
言葉とは何か 1.
2021/03/23 19:48
私は、仏教の本質とはすべての生き物に共通の、生き延びるために必要な煩悩によって価値付けられた固定的現実世界、世俗(無明)から → 空(明)の世界を経由して → 縁起(自由な世界)としての現実を生きる(幸せの)こと、ではないかと思っている。
その三層の世界は違うものではない。お釈迦さまが遺されたお言葉の中にあるようにその三層の世界は同時に体験されなくてはいけないものなので、それならそれは同じコトバ(この場合の言葉には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すべてを含ませたいのでカタカナ表記にする。なので視線の交差やファッションのような曖昧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も含むのだけど、できれば日常言語によって私は語りたい)によって記述できるはずだ、と私は思っている。
でも、ここで気をつけておかなくてはいけないのは、空と無の違いがどこにあるのかということだ。無は決して体験できないから言語化できないのに対し、空は体験している人がいるのだから言語化できるはずだ。でも道教の伝統が深い中国禅では無と空を同時に主張するけど、インド仏教では〈無〉と〈空〉はハッキリ分けなければいけない(お釈迦さまの当時のインドには六派外道と呼ばれていた思想家の中に、浅薄な虚無主義者もいたので)。そして虚無主義者がいなかった中国では、道教と同化した中国禅はそんなコトバを否定するけれど、 チベット仏教(中観派)はそれを探究している。
オートリアの哲学者であるウィトゲンシュタインも『論理哲学論考』の中で、「論理的な言葉の意味の限界」を設定するけど、でもコトバは何かしらの使い方によって、体験できる世界のすべてを記述できるものだと私は信じている。そしてウィトゲンシュタン自身もそれは認めていて、「哲学的(論理的)言語ではそれを語れないけど、詩的言語、絵画、音楽ではそれを語ることができる」と述べている。でもそれははたして、論理的言語では語り得ない事柄なのだろうか。〈空〉は詩的言語、芸術でしか語り得ないものなのだろうか。私はそうは思わない。
そしてその探究のためには、その三段階の層に共通して使えるようなコトバのあり方はどのようにして成立しうるのか、という問題を解明する必要がある。それは、「世界と、それに関係している私はどのようにして成立しているのか」を哲学的に問うためには、論理的言語を使うしか方法がないからだ。インド仏教中観派のナーガールジュナ、バラモン教言語哲学派のバルトリハリも立場は違うけど、この点に関しては共通している。その難問への手掛かりとして、今私は言葉の問題を私なりに論じてみたい。言葉とは〈私〉と〈世界〉との接点なのだから、縁起としての三層の世界に共通するようなコトバのあり方を探究したい。
言葉とはそもそも、フランスの言語学者ソシュールが明示したように、混沌とした〈世界〉を分節するための道具/記号でしかなかったはずだ。現実世界の中の存在者(物)を人の意識によって差異化し、それらをグループ化する事によって人が一番生きやすい〈世界/文化〉を構築したのだ。そしてその試みは見事に成功した。私は、人以外の動植物もそれなりの〈世界〉を分節していると思うけど、完成した一つの〈文化〉を構築したのは人間だけだった。
人は言葉による共通認識を獲得したことによって、人が生活しやすい〈世界〉を、他の生物とは別に、独自に作ってしまったのだ。一度そのような〈世界〉を作ってしまうと、人の〈世界/文化〉は独自に進化してしまう機構を持ってしまうものらしい。
本来は各個人(生物)の分節でしかなかった〈意味〉が固定化し、社会共通の〈価値〉を持ってしまう。元々は自由な〈意味〉でしかなかったものが、自国だけで通用する貨幣のような固定した〈価値〉を持ってしまうのだ。流動的だった意味が固定化してしまうと、それはそれ自身で成立している〈実在/自性〉という概念に変化してしまう。仏教は流動的な存在/意味(縁起)は認めるけど、固定してしまった〈実在/自性〉は否定する。なので、言葉の問題は仏教でも中心的なテーマの一つである。
お釈迦さまの初転法輪の中でもこの問題は「正語」として四諦・八正道の一つに取り上げられている。恥ずかしいのだけど、私がこの四諦・八正道の重要性にやっと気づいたのはごく最近だ。私が30年くらい前に最初読んだ時、四諦・八正道なんてみんな当たり前のことじゃないか、と思ってしまったのだけど、その認識は間違っていたことにようやく気がついた。それは私が東南アジア諸国の上座部仏教の国を歩いたのと、インドの貧しい生きにくいカースト外の人たちの暮らしを一年以上も見たせいかもしれない。
八正道は一つづつを取り上げれば、インドでも日本でも現実を生きるためには当たり前のことだけど、それに四諦を関係付けて複合的に考えるととても難しい。八正道は「正見・正思・正語・正業・正命・正精進・正念・正定」に分類されている。私はまだこの八つの相互関係を理解していないのだけど、最初の三つと最後の二つは、「正語」とは何か、を探究することによって統合できるんじゃないか、と考えている。
お釈迦さまの初転法輪では、前正覚山で共に修行した5人の修行者に一週間をかけて説明したと記録されている。お釈迦さまが覚りを開かれたブッダガヤーから初転法輪のサールナートまでは歩いて一週間かかったと思う(私は整備された道をチャリで走って4日かかったけど)。その間、お釈迦さまはご自身の覚りをどのように説明したらこの真理を、共に修行した五人の比丘(彼らはお釈迦さまが山を降りた時点で、彼は厳しい修行に耐えられくなって逃げてしまった、と思っていたのだから)に納得してもらるだろうか、と必死にお考えになったと思う。そしてその結果を一週間かけて説明したのだ。一週間目に最初の一人が覚りを開き、それからまた何日かして最後の五人目も同じように覚りを開いた。お釈迦さまはいったいどのようにご説明なさったのだろうか。私もその場に居られたらな、と思うけどそれは不可能なので、自分なりに類推するしかない。
言葉の使い方の例として、以前の記事でも書いたので「りんご」と「月」という言葉を考えてみる。りんごと月はまったく違うものだけど、形が似ていることもあるので、りんごが空に浮いていると見てもいいし、月が美味そうだと思ってもいいんじゃないだろうか。そっちの方が自由だし、面白い。でも、ピアジェというフランスの児童心理学者は言葉を「個人の外部にあるゆえに人間を支配するもの」と定義した(ピアジェ『構造主義』フーコーの定点)。言葉は、第一義的には、個人の内部に成立するものではなく、個人を超えた社会共同体の内部の規範として成立しているのだと(ウィトゲンシュタンの私的言語の不可能性)。似ているからと言っても月は食べられないし、りんごを放り投げても空には浮かばない。「そうなるかもしれない」と考えるのは自由だけど、実際にそんなことを試すのは時間の無駄だし、何か事故が起きたら共同体の利益にもならない。でも世界中の昔話には、空を飛ぼうとした男の話しが多くある。大抵は社会の厄介もので、役立たずとして描かれるのだけど、何かのきっかけでホントに空を飛んでしまう。それを見て初めてみんなは人が空を飛ぶというイメージを受け入れるのだけど、実際に見るまではその人達はそのイメージを受け入れられなかった。
つまり、りんごはあくまでも木に実った食べ物で、月は地球を回る岩の衛星でしかない、と常識的に考えてしまうと、その言葉のイメージは固定してしまって実在/自性に変化してしまう。物/言葉の有用性/有効性/価値を第一義に解釈してしまうと、世界が固定してつまらなくなってしまうのだ。道元が言うような〈やわらかい心/コトバ〉を使うためには、どうしたらいいのだろうか。
では、コトバとはどのように使うべきなのだろうか。仏教、特に禅では日常(有効)言語を否定する。でも、文献を調べてみると禅宗の書いた物が一番多いのは何故なのだろうか。おそらくいったん、日常(世俗)の言葉を否定した上でそこから言葉の可能性を詩という方向で探究したからだろうと思う。
では中観派ではどうだろうか。中観派は言葉の論理性を信頼しているので、あくまでも論理的言語によって勝義諦(空)を探究/記述できるはずだ、と考える。でも論理とは〈モノゴト〉の間の関係性のことでしかないのだから、関係性だけでこの多様な現実の世界を探究/記述するためには、そのコトバの使い方を具体的にどうしたらいいのだろうか。
ここで私は井筒俊彦が書いたものを引用したい。以前の記事でも紹介したように、井筒は言語の天才で30数ヶ国語を自由に操ることができたらしい。たしかフランスの有名大学でギリシャ語、ラテン語、アラビア語を駆使しながら宗教学(イスラム教だったかな)の講義を担当していた、ということを何かの本で読んだ記憶もある。彼の専門はイスラームなので『イスラーム哲学の原像』という本の中の、イスラーム神秘主義の哲学者、イブン・アラビーを紹介した箇所を引用する。
われわれは、たとえば咲いている花を見て、「ここに花がある」などといいます。〔…〕しかし、イブン・アラビーにいわせますと、こういう表現は事の真相を非常に歪んだ形で呈示するだけのものでありまして、本当は花があるのではありません、存在があるだけです、花という限定を受けた形で。しかしこういうと、存在がものになってしまいますので、もう少し正確に表現して、存在的エネルギーがここで花という形に結晶して自己を現しているとでも言うべきなのです。つまり事の真相を叙述するためには、普通の日常的言語のほかに、あるいはその上に、一種の哲学的なメタ言語、高次言語というものをつくる必要が出てくるのであります。このメタ言語では「花が存在する」と申しませんで、日本語としては妙な表現になりますが、「存在が花する」とか、「ここで存在が花している」とかいう形で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ります。とにかく、この哲学的言語では、あらゆる場合に存在が、そして存在だけが主語になるべきであります。他のあらゆるものはすべて述語です。このように理解された「存在」、つまり絶対無限定な存在そのものを頂点において、その自己限定、自己分節の形として存在者の世界が展開する。(太字は井筒、下線は筆者による強調)
この文脈での「存在」とは存在者(個別の物)の究極の在り方のこと(ユダヤ教、キリスト教、イスラームでは唯一絶対の神)だ。西洋の一神教と日本やインドの多神教、そして仏教のような無神教は決定的に違うものだけど、でも私は井筒俊彦に共感を覚える。神も空も、もしかしたら、ある見方からすれば、同じなのかもしれないと。なので、この文脈での存在(神)は、仏教の文脈では「空」あるいは「縁起」と言い換えることができる。空とは(ある意味では)何も無いことだから、仏教のメタ(統合的/超越的/形而上的)言語においても主語は存在しない。
余談だけど「古代日本語に主語はなかった」と主張した言語学者もいたと思う。古代日本語はわからないけど、たとえば西行の歌で、
空になる心は春の霞にて世にあらじとも思い立つかな
文法的には「心」が主語であると解釈されるのだろうけど、この文脈では心が空だと言っているのだから、この歌には主語がない。文法的に主語を無くしてこの歌を読み換えてみるなら、
空 心 春の霞 ならいっそこの生きにくい現実世界を捨てて(出家して)しまおう
と読むこともできる。
『源氏物語』でも多くの場合に主語がない。これは主語が省略されていると考えるよりも、もともと日本語には主語がなかったのに、それでは文章の意味が通らない場合に仕方なく主語を補った、と考える方が良いと思う。主語がない方が日本語としては端的に美しく感じられる。
この感覚は仏教学者の山折哲雄が『日本人の心情』という本の中で、日本人特有の「遊離魂感覚」と呼んだものだ。生きたまま魂が肉体(垣根)を離れて遊ぶ。それに対して西洋哲学/神学では、精神は常に肉体に囚えられている、と考え、そこからの解放/自由とは、最後の審判において純粋な精神が「神の国」に、滅びる肉体を離れて永遠の命として生まれ変わる、と考えられている。西洋では純粋な精神/神という固定的で絶対的な〈モノ〉が実在している、と考えるのに対し、古い日本の精神文化では魂は個人の内部に留まるものではなく、自由に遊び廻れる〈コト〉だと考えられていた。このような宗教観が無宗教と言われている現在の日本人の心の中にも潜在している、と私は思っている。この考え方の基本はコトバの本質は名詞ではなく動詞にある、ということだ。バルトリハリが主張したように、コトバの本質は固定的な名詞にはなく、文脈にある。そしてその文脈を根本で構成しているのが動詞だ。なのでどの言語においても動詞を理解することが一番難しい。
次に、精神に異常があると考えられている人たちのコトバを見てみたい。統合失調症という病いでは、意味が理解できないコトバを喋る「新語創作」という症状が現れる事があるらしい。板橋作美という精神科医の『迷信の〈心〉』という論文(できれば木村敏の本から引用したかったのだけど、残念ながら今手元にないので)から引用する。
『異常の言語と論理』
〔…〕不可解とされるものに、統合失調症患者の言語と論理がある。統合失調症を言語の問題とみるか、論理の問題とみるかは、精神病学者によって分かれるようであるが、たとえば宮本忠雄は、彼らの言語に目を向ける。宮本は統合失調症のひとつのあらわれである妄想について、「言語なしには妄想は可能ではない」と言う。そして、 ソシュール流の構造言語学を応用して、統合失調症患者の妄想的言語を次のように説明する。
言表は、a→b→c→dというように統辞関係、結合関係をもっている。また、a,b,c,d それぞれは、bならb1、b2、b3、・・・という範列関係、連合関係をもっている。ところが、統合失調症患者の妄想的言表では、しばしば、a→b→b1→b2→b3→c→dというようなかたちをとっていると宮本は言う 。〔…〕無時間的同時的な範列関係が、言表のなかで時間的継起的な統辞関係としてあらわれてしまうのである。
もうひとつ、宮本が言うのは、言語記号(シーニュ)の「意味付けしようとするもの」(シニフィアン) と「意味付けされたもの」(シニフィエ)の分離、乖離である。彼は、統合失調症患者の妄想では、 ある言葉の分離した「意味するもの」が、別の言葉の分離した「意味されるもの」と結びついて、妄想的言語記号を作っていると言う。その一例として、ある妄想患者の話を使っている。その患者は「街の上ではなにもかも非常に違っていた。なにかが起ったにちがいなかった。 そばを通りすぎた一人の男はたいへん鋭い眼をしていた。たぶん探偵だった。〔…〕行く途中にはたいへん人だかりがしていた。彼にたいして何かが企まれているのだ。だれもが傘をばたばたさせたが、まるでなにか仕掛けがそのなかにあるようだった…」と語った。宮本は、この患者では、「傘をばたばたさせる」の「意味するもの」と、「仕掛け」の「意味されるもの」が 結合しているのだとする。〔…〕そのため病者は〈妄想の言葉〉でさらに世界を覆いつくそうとする」のである。
今、資料がないので私の曖昧な記憶だけど、さらに症状が進むと「ダダダの橋が掃除して頭はマイマイだけど箸い水」といったようなまったく理解不能なコトバを使うようになる事もあるらしい。なぜ統合失調症者はこのようなコトバの使い方をするのだろうか。おそらく、彼らの先鋭化された世界と私たちの慢性化された日常世界との間に埋められない深い溝が生まれてしまったからだ。その溝を埋めようとして、彼らは彼らなりの方法で〈私〉と〈その世界〉を統合しようとしているのだと思う。それを単純な〈妄想の言葉〉と言ってしまっていいのだろうか。私には、それは決して根拠のないただのツギハギの〈妄想の言葉〉だとは思えない。それは必要に迫られた上での必死な、一種の詩的言語での表現だ。そして実際に詩人が使うコトバも、本質的にはこのようなものではないのだろうか。
言語
仏教哲学
2021/03/23 19:48
寒烏
id:kan-u
nice ! 1
===
단어 란 무엇입니까? 2.
2021/03/23 19:53
다음으로 유식파의 언어관에 대해 생각하고 싶다.
유식파에서는 “식의 본질은 현상을 그만두는 것에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나도 의식의 본질은 시시각각 변하는 현상을 머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식이란 코토바를 말한다.
유식파에서는 「식」의 구조를 아다나식(분별의식), 마나식(자의식), 아라야식(무의식)의 3층으로 나눈다. 그리고 세계의 구조를 「삼성설」로 「편계소 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의 3가지로 나누고 그 식의 구조를 세계의 삼성의 본연의 상과 대비한다. 최초의 아다나식은 비교적 알기 쉽게 편계소 집성의 일이며, 「편(분)」이라고 헤아려(분별해) 이해된 곳(세계)에 집착해 버리는 마음( 번뇌) 이다.
그에 대해, 의타 기성과 마나식, 원성실성과 아라야식과의 관계는 어렵다.
의타 기성은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라는 것으로 해석되어 있어 시간 속에서 원인과 결과가 상관된다는 인과관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 해석은 상좌부 불교에서의 것이므로, 중관파에서는 이것을 시간적인 전후 관계라고는 파악하지 않고, 동시에 성립하고 있는 상호 의존관계로서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이라는 말은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이다, 라고 하는 해석은 상좌부적인 것이고, 중관파에서는 그러한 시간(인과) 관계보다, 부모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부모이므로 예, 아이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아이라고 불리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연속적인 인과 관계가 아니라, 무시간적인 상호 의존 관계로서 파악하고 있다. 이것은 유식파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왜 유식파는 그것을 연기라고는 부르지 않고 의타 기성이라고 부른 것일까. 이것은 어려운 문제로, 하물며 의타 기성과 마나식과의 관계는 더욱 어렵다.
그래서 먼저 엔성실성과 아라야식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싶다. 엔성실성이란 바라몬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며, 불교로 말해지는 <도둑>이다. 그렇다면 엔성실성과 해탈과 열반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아래에 말하는 것은 내 감상이다.
<해탈>이나 <제도>가 죽음의 냄새가 나는데 반해 유식파가 말하는 <원성실성>에는 그 냄새가 없다. 그것은 엔성실성이 길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힌두교라도 불교라도 부정을 싫어하고, 정(清潔)을 요구한다. (쓰레기 투성이의 인도의 정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제쳐두고) 에 있기 때문에), 본래는 귀찮은 것이다. 그 근본의 번짐이 어떻게 원성실성으로 전화하는 것일까. 유식파의 무착(아상가)은 『정대승론』 속에서 그런 섬뜩한 아라야식이기 때문에(밑줄은 필자에 의한 강조), 그것을 자각했을 때 전화한다고 한다. 이것이 대승불교에 특유의, 류수가 보여준 '번뇌 즉석'이라는 말의 해설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친무가 말하는 '승려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다'도 이와 같은 의미다).
이 말은 결코 번뇌가 그대로 열반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거기에는 넘을 수 없는 깊은 강저가 있다. 그 그루브를 넘었을 때 처음으로 「 번뇌 즉석 槅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나식과 의타 기성과의 관계다. 이것은 매우 어렵고, 지금의 나에게는, 우선 이것은 <나>가 <너>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나>와 <너>와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어디에도 없고 동시에 항상 어디에나 있다. 이원론으로 말하자면, 유일하거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논리적 언어에서는 모순되지만, 무시간/상호 의존적인 마음의 언어(중관파와 유식파를 통합한 코토바?)에서는 모순되지 않는다. 위트겐슈탄(나는 아직 『논리철학논고』를 전부 읽지 않았지만)의 근본 주장은 엄밀한 논리적 언어로는 <지금 살아 있는 시간> )를 기술할 수 없다, 라고 한 점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만, 살아 있는 시간을 논리학내에 정위하는 것(나는 그 시도의 하나가 헤겔의 변증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불가능한 것일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수학을 모델로 하고 생각하고 싶다(그렇다고는 물론 나는 수학에 자세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하에 말하는 것은 아마추어의 생각이 들고, 비유일 뿐이지만).
수학과 논리학과의 차이는 <존재>를 인정할지 여부에 있지 않을까.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기호는 어디까지나 대체 가능한 차이로서의 기호(혹은 논리식, 연산 기호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는 어렵지만)에 밖에 없는 것에 대해, 수학의 0, 1, π, √-1 등 의 수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거기에 성립하고 있는 <존재>로서 포착되고 있다. 허수√-1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수이지만, 수학내에서는 성립/존재하고 있는 수이다. 그런 수로 구성된 허수공간이 불교에서의 인기세계/하늘이라는 것은 아닐까. 수학의 실수 공간이 불교에서의 세속인 것에 비해, 실수와 허수를 통합한 공간이 연기(승의 포기와 세속 포기의 통합)라는 세계인 것은 아닐까.
허수 공간은 복소수로서 일반적으로 A+Bi 라는 형식으로 표현된다. i가 √-1이라는 숫자의 기호로, A와 B는 구체적인 수의 대체물로서의 기호(실수)이다. A는 구체적인 존재이며, 거기에 B라는 존재가 i화되어 추가된다. 일상 언어로 말하면, 예를 들면 「달」이라고 하는 현실 존재에 허수화된 「사과/바위」가 덧붙여 연기로서의 현실은 성립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다. 즉, 복소수란 존재 <모노>와 하늘 <코토>의 복합체라고. 그리고 그것이 연기라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전 기사에서 소개한 '피레네의 성'이라는 그림도 또 하나의 현실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것으로 내가 실제로 코토바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최초의 문제는 아직 사파리 해명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그 실마리는 발견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끝없이 먼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시행착오를 반복해 가면 어느 쪽이든 도달할 수 있을까.
언어
불교 철학
===
言葉とは何か 2.
2021/03/23 19:53
次に唯識派の言語観について考えてみたい。
唯識派では「識の本質は現象をとどめることにある」と考えられている(私も意識の本質は刻々に移り変わる現象を留めるものだと考えている)。そして識とはコトバのことだ。
唯識派では「識」の構造をアーダナ識(分別意識)、マナ識(自意識)、アーラヤ識(無意識)の三層に分ける。そして世界の構造を「三性説」として「遍計所執性」「依他起性」「円成実性」の三つに分け、そしてその識の構造を世界の三性の在り方の相と対比する。最初のアーダナ識は比較的に分かりやすく遍計所執性の事であり、「偏(かたよ)って計って(分別して)理解された所(世界)に執着してしまうこころ(煩悩)」のことである。
それに対し、依他起性とマナ識、円成実性とアーラヤ識との関係は難しい。
依他起性は一般に仏教で言われる「縁起」のことであると解釈されていて、時間の中で原因と結果が相伴う、という因果関係のことでもある。でもこの解釈は上座部仏教でのものなので、中観派ではこれを時間的な前後関係とは捉えず、同時に成立している相互依存関係として解釈している。例えば、「親子」という言葉は親から生まれたから子である、という解釈は上座部的なものであり、中観派ではそのような時間(因果)関係よりも、親は子がいるから親なのであり、子は親がいるから子と呼ばれる、といったように、原因と結果の間の連続的な因果関係ではなく、無時間的な相互依存関係として捉えている。これは唯識派でも同じだ。ではなぜ唯識派はそれを縁起とは呼ばずに依他起性と呼んだのだろうか。これは難しい問題で、まして依他起性とマナ識との関係はさらに難しい。
なので先に円成実性とアーラヤ識との関係について考えたい。円成実性とはバラモン教で言われる〈解脱〉であり、仏教で言われる〈涅槃〉である。では円成実性と解脱と涅槃の違いはどこにあるのだろうか。以下に述べるのは私の感想だ。
〈解脱〉や〈涅槃〉が死の匂いがするのに対し、唯識派の言う〈円成実性〉にはその匂いがない。それは円成実性が縁起であるからだ。一般にヒンドゥー教でも仏教でも不浄を嫌い、浄(清らかさ)を求める。(ゴミだらけのインドの浄とは何かという問題はさておいて)アーラヤ識とは無始劫来の善悪の業(行い/言葉)の結果の集積所なので(そして今現在私たちは無明の中にいるのだから)、本来は穢れているものだ。その根本の穢れがどのようにして円成実性に転化するのだろうか。唯識派の無着(アサンガ)は『聚大乗論』の中で、そのような穢れたアーラヤ識だからこそ(下線は筆者による強調)、それを自覚した時に転化する、と述べている。これが大乗仏教に特有の、龍樹が示した「煩悩即涅槃」という言葉の解説だと私は思っている(親鸞の言う「僧でもあり俗でもある」もこれと同じ意味だ)。
この言葉は決して、煩悩がそのまま涅槃である、という意味ではない。そこには越えられない深い溝がある。その溝を越えた時に初めて「煩悩即涅槃」と言えるのだと思う。
そしてマナ識と依他起性との関係だ。これはとても難しくて、今の私には、とりあえずこれは〈私〉が〈あなた〉で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と解釈している。〈私〉と〈あなた〉との違いはどこにあるのだろうか。それはどこにもなく、同時に常にどこにでもある。二元論で言えば、有でもあり無でもある。これは論理的言語では矛盾しているけど、無時間/相互依存的なこころの言語(中観派と唯識派を統合したコトバ?)では矛盾していない。ウィトゲンシュタン(私はまだ『論理哲学論考』を全部読んでいないけど)の根本の主張は、厳密な論理的言語では〈今生きられている時間〉(ミンコフスキーやベルグソンやニーチェの主張する時間)を記述できない、とした点にあるのじゃないだろうか。でも、生きられている時間を論理学内に定位すること(私はその試みの一つがヘーゲルの弁証法だと思っているけど)は不可能なのだろうか。
さてでは最後に、数学をモデルにして考えてみたい(とは言ってももちろん私は数学に詳しくはないので、以下に述べるのは素人の思いつきで、比喩でしかないのだけど)。
数学と論理学との違いは〈存在〉を認めるか否かにあるんじゃないだろうか。論理学で使う記号はあくまでも代替可能な差異としての記号(あるいは論理式、演算記号をどう解釈したらいいのかは難しいけど)でしかないのに対し、数学の 0, 1, π, √-1 などの数は、認めなくてはいけないそこに成立している〈存在〉として捉えられている。虚数√-1 は現実には存在しない数だけど、数学内では成立/存在している数だ。そのような数で構成されている虚数空間が、仏教での縁起世界/空ということではないのだろうか。数学の実数空間が仏教での世俗であるのに対し、実数と虚数を統合した空間が縁起(勝義諦と世俗諦との統合)という世界なのではないのだろうか。
虚数空間は複素数として、一般に A+Bi という形式で表現される。i が√-1という数の記号で、AとBは具体的な数の代替物としての記号(実数)だ。Aとは具体的な存在であり、そこにBという存在が i 化されて付け加わる。日常言語で言うと、たとえば「月」という現実存在に虚数化された「りんご/岩」が付け加わって縁起としての現実は成立している、と考えてみる。つまり、複素数とは存在〈モノ〉と空〈コト〉との複合体だと。そしてそれが縁起ということじゃないだろうか。
そう考えれば、以前の記事で紹介した『ピレネーの城』という絵も、もう一つの現実であると理解できる。
とはいえ、これで私が実際にコトバをどう使ったらいいのか、という最初の問題はまだサッパリ解明されていない。でも、その糸口は見つけたような気がする。果てしなく遠い道程だと思うけど、試行錯誤を繰り返して行けば、いずれ到達できるのだろう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