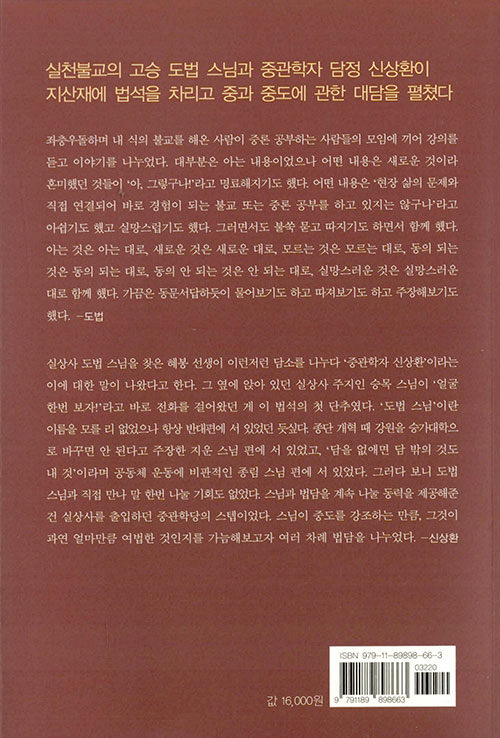[프로그램 리뷰] 제237차 월례포럼 <'민중' 효과> 리뷰(김현주)
프로그램 리뷰
by 제3시대 2021. 2. 18. 11:42
제237차 월례포럼 <'민중' 효과> 리뷰

김현주(대전보건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우선 코로나 덕분에 지방에서도 비대면으로 포럼에 참석할 수 있어 감사했다. 민중신학과 거리가 먼 나로서는 긴 시간 유학한 황용연 박사의 모습을 괄목상대하고픈 마음이 컸다. 강의는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나와 같은 문외한도 이해할 만큼 쉬웠으며, 강의를 마친 후 다른 논문을 들여다보니 전과 달리 뜻이 들여다보일 만큼 눈을 띄우는 힘이 있었다. 강의를 들은 후 이전과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으니 상당한 배움이 있었던 것 같다. 논문에 담긴 복잡한 논의를 연구자의 정리된 언어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민중’이 누구냐는 질문을 학생운동권 시절에 자주 물었지만 뾰족한 답은 아무도 하지 못했다. 대개 ‘그들’이라는 대상으로 여기면서도 민중이라는 말을 놓지는 못했으니, 현실 역사의 주체가 민중이 아니라는 괴리에 주목한 연구자의 문제의식에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었다. 연구자는 이 괴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박권일의 ‘표준시민’이라는 개념을 가져왔다. 표준시민은 수도권에서 나타나는 중산층 지향 대중 현상을 가리킨다. 표준시민은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인정투쟁을 수행한다. 이때 무능력자와 무자격자가 마땅하고 상식적이며 폭력적인 방식으로 배제되고 마는데, 바로 여기에 민중이라는 용어를 호출하자는 것이다. 1970년 전태일 사건으로 사람들이 눈을 뜨고 민중에 주목하였던 것처럼, 무능력자와 무자격자가 무자비하게 배제되는 사건을 지금 증언하기 위하여 민중이라는 안경을 쓰자는 것이다.
우선 코로나 덕분에 지방에서도 비대면으로 포럼에 참석할 수 있어 감사했다. 민중신학과 거리가 먼 나로서는 긴 시간 유학한 황용연 박사의 모습을 괄목상대하고픈 마음이 컸다. 강의는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나와 같은 문외한도 이해할 만큼 쉬웠으며, 강의를 마친 후 다른 논문을 들여다보니 전과 달리 뜻이 들여다보일 만큼 눈을 띄우는 힘이 있었다. 강의를 들은 후 이전과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으니 상당한 배움이 있었던 것 같다. 논문에 담긴 복잡한 논의를 연구자의 정리된 언어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민중’이 누구냐는 질문을 학생운동권 시절에 자주 물었지만 뾰족한 답은 아무도 하지 못했다. 대개 ‘그들’이라는 대상으로 여기면서도 민중이라는 말을 놓지는 못했으니, 현실 역사의 주체가 민중이 아니라는 괴리에 주목한 연구자의 문제의식에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었다. 연구자는 이 괴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박권일의 ‘표준시민’이라는 개념을 가져왔다. 표준시민은 수도권에서 나타나는 중산층 지향 대중 현상을 가리킨다. 표준시민은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인정투쟁을 수행한다. 이때 무능력자와 무자격자가 마땅하고 상식적이며 폭력적인 방식으로 배제되고 마는데, 바로 여기에 민중이라는 용어를 호출하자는 것이다. 1970년 전태일 사건으로 사람들이 눈을 뜨고 민중에 주목하였던 것처럼, 무능력자와 무자격자가 무자비하게 배제되는 사건을 지금 증언하기 위하여 민중이라는 안경을 쓰자는 것이다.
제 눈에 안경이 같은 사건을 보여주지도 않을뿐더러 같은 증언을 요청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이주노동자, 난민, 여성, 성 소수자, 하층 노동자만 아니라, 범죄자, 채용시험 탈락자, 대학의 제2캠퍼스 재학생조차 이 무능력자 또는 무자격자로 배제될 수 있다고 말한다. 배제하는 칼금은 우리들 사이 어디에나 있다.
여기서 바울의 칭의론이 비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투쟁담론이라는 김창락의 민중신학적 해석이 흥미롭게 등장한다. 로마 식민지 도시의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근거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배제하고자 했다. 이 긴장관계를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표준시민과 무자격자로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바울은 교회의 경계를 율법에서 믿음으로 옮김으로써, 무자격자인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때 바울이 가졌던 남다른 눈이 바로 민중이라는 용어 작용과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연구자는 안경을 쓰라고 하지 않고 안경 씌움을 당하라고 말한다. 나는 그가 바디우 식의 사건을 대망하고 있다고 느꼈다. 시각이 바뀌면 시야가 달라진다. 민중이라는 안경은 경계 밖에 있는 사람과 경계 안에 있는 사람 모두가 경계를 바라보게 할 것이다. 나-남을 알아보는 시력이 배제의 도구가 되어서는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사회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 우리의 증언은 우리들 사이를 가르는 경계를 인식하고 해석하고 정의하여 마침내 경계를 옮기고 허무는 일이 될 것이다.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몸은 경계를 옮기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성벽이라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담을 허물고 지성소 안에서 사람과 신을 가르던 휘장을 찢었다. 우리들도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조각내는 헝클어진 경계를 쳐다보고 경계 너머에 있는 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이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몸을 증언할 수 있다.
강의 후 질의에 답하며 연구자는 ‘경계를 허무는 사건의 양면성’을 생각하는 민중신학자의 조심스러움을 덧붙였다. 문득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생각했다. 성이 다른 방향으로 무너졌다면 성을 돌던 백성들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현실에서는 경계를 움직이고자 하는 힘의 의도대로 결과가 펼쳐지지 않을 때도 많다. 이제 와서 우리가 촛불을 후회하겠는가? 사건은 영원으로부터 현실로 온다. 학자의 정교한 시각과 신중한 계산, 신학자다운 초월적 관점을 느끼며 이제는 다음 연구 결과물을 기다리겠다.
황용연 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기획위원장은 배제된 사람들이 자기식의 언어를 갖게 하자는 목적으로 글쓰기 강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다. 글쓰기는 두려운 일이다. 생각과 마음을 박제하는 결과물이 무겁고 의도와 다르게 적힌 내 글은 낯설기도 하다. 그러나 어려운 논문을 쉽게 설명하는 황용연 박사라면 때로는 표준시민인 듯싶다가 졸지에 무자격자 또는 무능력자로 전락하고 마는 우리들이 무겁거나 낯설지 않은 내 목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도 좋겠다.
ⓒ 웹진 <제3시대>
출처: https://minjungtheology.tistory.com/1297 [웹진 <제3시대>]
[#180, 비평연습 특집] 그의 이름은(창세기 2:4-3:24) :
여기서 바울의 칭의론이 비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투쟁담론이라는 김창락의 민중신학적 해석이 흥미롭게 등장한다. 로마 식민지 도시의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근거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배제하고자 했다. 이 긴장관계를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표준시민과 무자격자로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바울은 교회의 경계를 율법에서 믿음으로 옮김으로써, 무자격자인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때 바울이 가졌던 남다른 눈이 바로 민중이라는 용어 작용과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연구자는 안경을 쓰라고 하지 않고 안경 씌움을 당하라고 말한다. 나는 그가 바디우 식의 사건을 대망하고 있다고 느꼈다. 시각이 바뀌면 시야가 달라진다. 민중이라는 안경은 경계 밖에 있는 사람과 경계 안에 있는 사람 모두가 경계를 바라보게 할 것이다. 나-남을 알아보는 시력이 배제의 도구가 되어서는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사회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 우리의 증언은 우리들 사이를 가르는 경계를 인식하고 해석하고 정의하여 마침내 경계를 옮기고 허무는 일이 될 것이다.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몸은 경계를 옮기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성벽이라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담을 허물고 지성소 안에서 사람과 신을 가르던 휘장을 찢었다. 우리들도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조각내는 헝클어진 경계를 쳐다보고 경계 너머에 있는 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이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몸을 증언할 수 있다.
강의 후 질의에 답하며 연구자는 ‘경계를 허무는 사건의 양면성’을 생각하는 민중신학자의 조심스러움을 덧붙였다. 문득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생각했다. 성이 다른 방향으로 무너졌다면 성을 돌던 백성들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현실에서는 경계를 움직이고자 하는 힘의 의도대로 결과가 펼쳐지지 않을 때도 많다. 이제 와서 우리가 촛불을 후회하겠는가? 사건은 영원으로부터 현실로 온다. 학자의 정교한 시각과 신중한 계산, 신학자다운 초월적 관점을 느끼며 이제는 다음 연구 결과물을 기다리겠다.
황용연 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기획위원장은 배제된 사람들이 자기식의 언어를 갖게 하자는 목적으로 글쓰기 강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다. 글쓰기는 두려운 일이다. 생각과 마음을 박제하는 결과물이 무겁고 의도와 다르게 적힌 내 글은 낯설기도 하다. 그러나 어려운 논문을 쉽게 설명하는 황용연 박사라면 때로는 표준시민인 듯싶다가 졸지에 무자격자 또는 무능력자로 전락하고 마는 우리들이 무겁거나 낯설지 않은 내 목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도 좋겠다.
ⓒ 웹진 <제3시대>
출처: https://minjungtheology.tistory.com/1297 [웹진 <제3시대>]
[#180, 비평연습 특집] 그의 이름은(창세기 2:4-3:24) :
비평연습 1회차 글쓰기
웹진 제3시대
2021-11-07
조회수 166
그의 이름은 (창세기 2:4-3:24) : 비평연습 1회차 글쓰기
김현주(대전보건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첫 사람의 이름은 사람일까, 아담일까, 남자일까? 그대와 함께 사는 강아지의 이름은 개인가, 댕댕이인가? 시츄일수도 있고 푸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가 애완하는 강아지를 개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 아이는 여느 강아지와 다른 내 아이이며 내가 이름을 부를 때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 안기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청소노동자들의 몸짓을 춤으로 담은 과정을 영상으로 보았다. 동대입구역에서 야간노동을 하는 그분의 이름은 배남이였다. “내가 배남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이제껏 누가 볼까 창피하던 청소하는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아름다움을 발견당하는 경험을 그분은 눈물로 감격했다.
성경의 첫 사람은 아담이다. 창조설화에는 개체의 이름과 종의 이름이 섞여 있다. 그래서 이 첫 사람을 좀 알아보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야 한다. 한글 성경에서는 아담을 사람이라고도 번역했고 남자라고도 번역했다. 어느 쪽이든 사람의 이름은 아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첫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첫 사람은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다. 아무도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지어 불러줄 이가 아무도 없는 아담에게서 절대 고독의 무게가 느껴진다.
흥미롭게도, 이름이 없던 첫 사람의 직업은 작명가였다. 그는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하며 살았다. 짐승을 보고 그가 이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 허나 그가 지어준 이름은 상대와 관계를 구성하는 애칭이 아니라 공식적인 명칭이었다. 아담은 여러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으나 무엇과도 벗 삼지는 않은 것 같다(창 2:18-20). 첫 사람이 하나님이 데려온 강아지에게 ‘개’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 아니면 ‘댕댕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 전자였다. 만일 후자였다면 하나님이 추가로 여자를 만들 필요가 없었을 테다. 사람이 혼자라서 좋지 않으니 짝을 지어 주자던 하나님의 첫 시도는 뜻을 이루지 못하여 다음 장면으로 넘어간다.
여기서 창조자가 첫 사람의 이름을 지어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나는 하나님이 첫 사람의 짝(돕는 베필)이 되어줄 수는 없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마치 첫 사람이 어떤 짐승도 짝으로 삼을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의 짝으로는 맞지 않았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였다. 이 편지는 성경에 새겨져 기독교 세계에서 가부장을 지지하는 메시지로 기능해 왔다. 성인지 감수성이 좀 생기고 나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에서 아내의 복종은 수월하고 남성의 사랑은 엄청 힘들다는 식으로 양보하기도 하지만 그런 시각으로 남편과 아내의 위계를 해체하지는 못한다. 비록 바울이 윤리적인 설교의 형식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이 비유를 부부관계의 첫 모형인 창조 설화의 첫 남자와 아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바울의 비유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동등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예수는 생전에 딱 한 번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미래형으로 말한 것 외에 교회라는 것을 시도한 적이 없다. 베드로와 긴장 관계에서 정통성이 간절했던 바울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관리하면서 자신이 세운 교회의 권위를 그리스도와 동등한 수준으로 주장하고 싶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그 동등함은 동일함이 아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다르고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처럼 존재는 구별이 되지만 남자와 여자는 그런 구별이 없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여도 교회의 위상은 상당히 올라간다.
이 동등한 여자와 남자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나님은 첫 사람의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만들어 데려왔다. 이제 첫 사람 아담은 더 이상 아담이 아니다. 계산을 해 보면, 갈빗대를 잃은 아담은 당연히 원래 아담보다 모자란다.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다. 아담에게서 떼어낸 갈빗대는 여자가 되었기 때문이다(창 2:23). 여기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표현에 NASB는 fashion이라는 동사를 썼다. 상당히 모양을 낸 것 같은 느낌이다. 들짐승도 날짐승도 움직이지 못한 아담의 굳은 마음을 흔들어보겠다는 창조자의 의지겠다. 갈빗대를 잃어 아담보다 조금 모자라게 된 (첫 사람이 아닌) 첫 남자는 이제 여자에게서 자신의 모자람을 채워 줄 무언가를 발견했는지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른다(창 2:24). 합본 편집된 성경에서 가장 앞자락에 기록된 노래다.
사람이라는 보통명사로 불리던 이름 없고 외로운 작명가에게 이제 재미라는 것이 생겨났다. 그동안은 갈빗대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갈빗대를 잃고 부족함이 생기자 관계에 대한 갈망도 생긴 것이 우연일까? 처음 만들어진 완벽했던 첫 사람은 여러 짐승과 심지어 창조주에게도 무심했다. 세상에는 동식물이 가득하고 성부, 성자, 성령이 역동하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그가 ‘홀로’라서 좋지 않다고 하였다. 복잡한 놀이공원에서 홀로인 사람을 상상해 보자.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거나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는 것이다. 창조자가 그의 벗이 되어주는 대신 그에게 벗을 만들어 준 이유는 아무래도 그에게 부족했던 것이 바로 ‘부족함’ 그 자체였기 때문일 것 같다. 갈빗대라는 것이 신체 기관인지 마음의 조각인지 영혼의 부스러기인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빠져 나간 ‘빈자리’가 없는 첫 사람은 완벽하지만 무언가 모자랐던 것이다. 이름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던 그에게 결핍이 없어서 부족했다는 역설이 흥미롭다.
이어서 선악과를 먹는 장면에서 우리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낀다. 분명히 첫 사람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다는데, 여자의 말에서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고, 어기면 우리가 죽을 것이라고 하셨다.’고 묘하게 달라져 있다. 남자가 들은 말을 여자에게 정확히 전달했다면 여자가 열매를 가져와도 바로 먹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마디는 했겠지. 사실 남자도 헷갈렸을까? 여자가 열매를 먹었다는데 죽지 않고 와서 열매를 주니까 아마 괜찮은가보다 믿었을지도 모른다. 이 중요한 장면에서 아담은 망설이지를 않는다. 하나님의 명령은 막연하지만 그걸 어기고도 생존한 아내가 와서 하는 말은 구체적이다. 그래 너만 먹을 순 없지. 나도 먹어보자.
그런데 여자만 열매를 먹어서는 나타나지 않던 열매의 효과가 남편도 먹고 나서야 나타난다. 그들은 눈이 밝아졌다. 이름이나 짓던 한량이 노동으로 옷을 지어 벗은 몸을 가린다. 벗은 몸이 부끄러울 수 있는 여건은 누군가가 쳐다볼 때다. 길고양이는 옷을 입는 법이 없다. 그래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 고양이는 인간의 몸을 쳐다보지 않는다. 관심이 없으므로. 마치 백인 여성이 흑인 남성 노예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옷을 갈아입었다던 상황처럼 상대의 시선이 나에게 의미가 없다가, 눈이 밝아지고 나서야 비로소 상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효과는 일차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타났다. 만일 첫 사람이 홀로일 때 선악과를 먹었다면 도대체 무엇이 부끄러웠을까? 여자가 뱀을 만나 열매를 따 먹은 후 남편 것도 따서 가져올 때 옷을 입었을 리가 없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상대를 바라보는 눈이 밝아져서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것은 창조된 동산의 파국이자 인간이 만드는 새로운 관계, 사회의 시작이었다.
우라사와 나오키의 만화 ‘몬스터’의 몬스터는 괴롭힐 대상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모두 찾아서 죽임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세상을 외롭게 살아가게 한다. 이 만화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존재도 없는 것이라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성경은 끝내 가인과 아벨과 셋의 아버지인 첫 남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마치 절대적인 존재인 양 내내 아담이었다. 그러나 첫 여자의 이름은 ‘생명’이었다. 하와라는 이 이름은 창조된 동산을 떠나 인간의 사회로 가면서 죽음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아내에게 선물처럼 남편이 지어준다. 첫 남자가 죽을 때까지 아내를 ‘생명’이라고 불렀다니, 애절하지 않은가! 그는 죽을 운명이었지만 그의 입으로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말했을 것이다. ‘생명’이라고 불리는 그의 아내는 세 아들을 낳았고 가인과 셋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창 4:1, 15). 아벨의 이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이 ‘부족함’이 완벽함이 지닌 모자람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 말했다.
첫 사람이자 첫 남자인 이름 없는 사나이는 바울이 로마 신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장차 오실 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언급된다(롬 5:14). 죄를 지은 첫 사람이라는 멸칭을 장차 오실 분의 모형으로 역전시키는 바울의 논리가 흥미롭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담은 갈빗대를 지녔던 첫 사람일까, 아니면 갈빗대를 잃고 여자의 짝이 된 첫 남자일까? 다시 묻자. 예수는 남자였을까? 요셉의 정자 없이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으로 발생되었다면 일단 Y 염색체를 인간에게서 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굳이 남성일 필요가 없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성이든 굳이 공개할 필요도 없었다. 분명히 예수는 남성이 아니라 인간으로 성육신하였고 인간으로 살았고 인간으로 부활하였다. 예수는 혼인하지 않았고 자녀를 낳지 않았다. 남성으로서 생식능력을 확인한 바 없으니 남성이었다고 주장할 생물학적 근거도 없다. 그러니 예수의 모형으로 언급되는 아담은 갈빗대를 지닌 첫 사람이라고 하자. 그 사람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고 그들의 관계도 들어있었다. 선악과를 먹고 죽음을 맛본 이는 개별적인 여자, 남자가 아니라 그 남자와 그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된 인간(人間)이었다. 이 비밀을 자기 몸에 간직한 아담은 누군가의 남편이기 전에 온전한 원형적 인간이어야 했다. 그래서 그는 누가 지어 준 이름으로 불리며 개인적인 관계 속에 머물 수가 없었다. 그는 모든 인간의 대표가 되어야 했고 모든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초주체(hypersubject)여야 했으니까. 그리고 신이면서 인간인 예수는 아담의 이름으로 인류와 만났다. 첫 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자 비로소 모든 관계를 왜곡시킨 초주체로 이름을 얻는다. 이것은 공자가 논어에서 답한 세상을 바로 세우는 정명(正名)이다. 이제 나는 초주체라는 괴물이 해소된 새로운 세상에서는 hyposubjects가 이름을 얻을 수 있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
웹진 제3시대
2021-11-07
조회수 166
그의 이름은 (창세기 2:4-3:24) : 비평연습 1회차 글쓰기
김현주(대전보건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첫 사람의 이름은 사람일까, 아담일까, 남자일까? 그대와 함께 사는 강아지의 이름은 개인가, 댕댕이인가? 시츄일수도 있고 푸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가 애완하는 강아지를 개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 아이는 여느 강아지와 다른 내 아이이며 내가 이름을 부를 때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 안기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청소노동자들의 몸짓을 춤으로 담은 과정을 영상으로 보았다. 동대입구역에서 야간노동을 하는 그분의 이름은 배남이였다. “내가 배남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이제껏 누가 볼까 창피하던 청소하는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아름다움을 발견당하는 경험을 그분은 눈물로 감격했다.
성경의 첫 사람은 아담이다. 창조설화에는 개체의 이름과 종의 이름이 섞여 있다. 그래서 이 첫 사람을 좀 알아보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야 한다. 한글 성경에서는 아담을 사람이라고도 번역했고 남자라고도 번역했다. 어느 쪽이든 사람의 이름은 아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첫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첫 사람은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다. 아무도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지어 불러줄 이가 아무도 없는 아담에게서 절대 고독의 무게가 느껴진다.
흥미롭게도, 이름이 없던 첫 사람의 직업은 작명가였다. 그는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하며 살았다. 짐승을 보고 그가 이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 허나 그가 지어준 이름은 상대와 관계를 구성하는 애칭이 아니라 공식적인 명칭이었다. 아담은 여러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으나 무엇과도 벗 삼지는 않은 것 같다(창 2:18-20). 첫 사람이 하나님이 데려온 강아지에게 ‘개’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 아니면 ‘댕댕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 전자였다. 만일 후자였다면 하나님이 추가로 여자를 만들 필요가 없었을 테다. 사람이 혼자라서 좋지 않으니 짝을 지어 주자던 하나님의 첫 시도는 뜻을 이루지 못하여 다음 장면으로 넘어간다.
여기서 창조자가 첫 사람의 이름을 지어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나는 하나님이 첫 사람의 짝(돕는 베필)이 되어줄 수는 없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마치 첫 사람이 어떤 짐승도 짝으로 삼을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의 짝으로는 맞지 않았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였다. 이 편지는 성경에 새겨져 기독교 세계에서 가부장을 지지하는 메시지로 기능해 왔다. 성인지 감수성이 좀 생기고 나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에서 아내의 복종은 수월하고 남성의 사랑은 엄청 힘들다는 식으로 양보하기도 하지만 그런 시각으로 남편과 아내의 위계를 해체하지는 못한다. 비록 바울이 윤리적인 설교의 형식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이 비유를 부부관계의 첫 모형인 창조 설화의 첫 남자와 아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바울의 비유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동등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예수는 생전에 딱 한 번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미래형으로 말한 것 외에 교회라는 것을 시도한 적이 없다. 베드로와 긴장 관계에서 정통성이 간절했던 바울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관리하면서 자신이 세운 교회의 권위를 그리스도와 동등한 수준으로 주장하고 싶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그 동등함은 동일함이 아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다르고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처럼 존재는 구별이 되지만 남자와 여자는 그런 구별이 없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여도 교회의 위상은 상당히 올라간다.
이 동등한 여자와 남자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나님은 첫 사람의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만들어 데려왔다. 이제 첫 사람 아담은 더 이상 아담이 아니다. 계산을 해 보면, 갈빗대를 잃은 아담은 당연히 원래 아담보다 모자란다.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다. 아담에게서 떼어낸 갈빗대는 여자가 되었기 때문이다(창 2:23). 여기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표현에 NASB는 fashion이라는 동사를 썼다. 상당히 모양을 낸 것 같은 느낌이다. 들짐승도 날짐승도 움직이지 못한 아담의 굳은 마음을 흔들어보겠다는 창조자의 의지겠다. 갈빗대를 잃어 아담보다 조금 모자라게 된 (첫 사람이 아닌) 첫 남자는 이제 여자에게서 자신의 모자람을 채워 줄 무언가를 발견했는지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른다(창 2:24). 합본 편집된 성경에서 가장 앞자락에 기록된 노래다.
사람이라는 보통명사로 불리던 이름 없고 외로운 작명가에게 이제 재미라는 것이 생겨났다. 그동안은 갈빗대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갈빗대를 잃고 부족함이 생기자 관계에 대한 갈망도 생긴 것이 우연일까? 처음 만들어진 완벽했던 첫 사람은 여러 짐승과 심지어 창조주에게도 무심했다. 세상에는 동식물이 가득하고 성부, 성자, 성령이 역동하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그가 ‘홀로’라서 좋지 않다고 하였다. 복잡한 놀이공원에서 홀로인 사람을 상상해 보자.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거나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는 것이다. 창조자가 그의 벗이 되어주는 대신 그에게 벗을 만들어 준 이유는 아무래도 그에게 부족했던 것이 바로 ‘부족함’ 그 자체였기 때문일 것 같다. 갈빗대라는 것이 신체 기관인지 마음의 조각인지 영혼의 부스러기인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빠져 나간 ‘빈자리’가 없는 첫 사람은 완벽하지만 무언가 모자랐던 것이다. 이름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던 그에게 결핍이 없어서 부족했다는 역설이 흥미롭다.
이어서 선악과를 먹는 장면에서 우리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낀다. 분명히 첫 사람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다는데, 여자의 말에서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고, 어기면 우리가 죽을 것이라고 하셨다.’고 묘하게 달라져 있다. 남자가 들은 말을 여자에게 정확히 전달했다면 여자가 열매를 가져와도 바로 먹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마디는 했겠지. 사실 남자도 헷갈렸을까? 여자가 열매를 먹었다는데 죽지 않고 와서 열매를 주니까 아마 괜찮은가보다 믿었을지도 모른다. 이 중요한 장면에서 아담은 망설이지를 않는다. 하나님의 명령은 막연하지만 그걸 어기고도 생존한 아내가 와서 하는 말은 구체적이다. 그래 너만 먹을 순 없지. 나도 먹어보자.
그런데 여자만 열매를 먹어서는 나타나지 않던 열매의 효과가 남편도 먹고 나서야 나타난다. 그들은 눈이 밝아졌다. 이름이나 짓던 한량이 노동으로 옷을 지어 벗은 몸을 가린다. 벗은 몸이 부끄러울 수 있는 여건은 누군가가 쳐다볼 때다. 길고양이는 옷을 입는 법이 없다. 그래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 고양이는 인간의 몸을 쳐다보지 않는다. 관심이 없으므로. 마치 백인 여성이 흑인 남성 노예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옷을 갈아입었다던 상황처럼 상대의 시선이 나에게 의미가 없다가, 눈이 밝아지고 나서야 비로소 상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효과는 일차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타났다. 만일 첫 사람이 홀로일 때 선악과를 먹었다면 도대체 무엇이 부끄러웠을까? 여자가 뱀을 만나 열매를 따 먹은 후 남편 것도 따서 가져올 때 옷을 입었을 리가 없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상대를 바라보는 눈이 밝아져서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것은 창조된 동산의 파국이자 인간이 만드는 새로운 관계, 사회의 시작이었다.
우라사와 나오키의 만화 ‘몬스터’의 몬스터는 괴롭힐 대상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모두 찾아서 죽임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세상을 외롭게 살아가게 한다. 이 만화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존재도 없는 것이라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성경은 끝내 가인과 아벨과 셋의 아버지인 첫 남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마치 절대적인 존재인 양 내내 아담이었다. 그러나 첫 여자의 이름은 ‘생명’이었다. 하와라는 이 이름은 창조된 동산을 떠나 인간의 사회로 가면서 죽음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아내에게 선물처럼 남편이 지어준다. 첫 남자가 죽을 때까지 아내를 ‘생명’이라고 불렀다니, 애절하지 않은가! 그는 죽을 운명이었지만 그의 입으로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말했을 것이다. ‘생명’이라고 불리는 그의 아내는 세 아들을 낳았고 가인과 셋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창 4:1, 15). 아벨의 이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이 ‘부족함’이 완벽함이 지닌 모자람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 말했다.
첫 사람이자 첫 남자인 이름 없는 사나이는 바울이 로마 신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장차 오실 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언급된다(롬 5:14). 죄를 지은 첫 사람이라는 멸칭을 장차 오실 분의 모형으로 역전시키는 바울의 논리가 흥미롭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담은 갈빗대를 지녔던 첫 사람일까, 아니면 갈빗대를 잃고 여자의 짝이 된 첫 남자일까? 다시 묻자. 예수는 남자였을까? 요셉의 정자 없이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으로 발생되었다면 일단 Y 염색체를 인간에게서 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굳이 남성일 필요가 없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성이든 굳이 공개할 필요도 없었다. 분명히 예수는 남성이 아니라 인간으로 성육신하였고 인간으로 살았고 인간으로 부활하였다. 예수는 혼인하지 않았고 자녀를 낳지 않았다. 남성으로서 생식능력을 확인한 바 없으니 남성이었다고 주장할 생물학적 근거도 없다. 그러니 예수의 모형으로 언급되는 아담은 갈빗대를 지닌 첫 사람이라고 하자. 그 사람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고 그들의 관계도 들어있었다. 선악과를 먹고 죽음을 맛본 이는 개별적인 여자, 남자가 아니라 그 남자와 그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된 인간(人間)이었다. 이 비밀을 자기 몸에 간직한 아담은 누군가의 남편이기 전에 온전한 원형적 인간이어야 했다. 그래서 그는 누가 지어 준 이름으로 불리며 개인적인 관계 속에 머물 수가 없었다. 그는 모든 인간의 대표가 되어야 했고 모든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초주체(hypersubject)여야 했으니까. 그리고 신이면서 인간인 예수는 아담의 이름으로 인류와 만났다. 첫 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자 비로소 모든 관계를 왜곡시킨 초주체로 이름을 얻는다. 이것은 공자가 논어에서 답한 세상을 바로 세우는 정명(正名)이다. 이제 나는 초주체라는 괴물이 해소된 새로운 세상에서는 hyposubjects가 이름을 얻을 수 있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
(Hyposubjects are necessarily feminist, colorful, queer, ecological, transhuman, and intrahuman. Hyposubjects make revolutions where technomodern radar can’t glimpse them. They patiently ignore expert advice that they do not or cannot exist. They are skeptical of efforts to summarize them, including everything we have just said. Timothy Morton)
ⓒ 웹진 <제3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