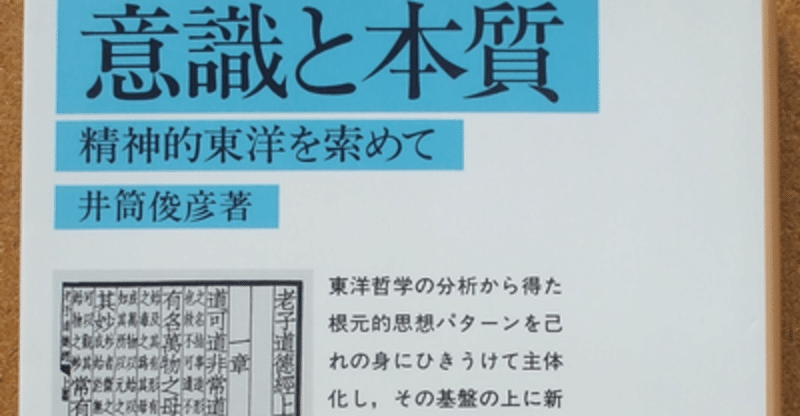
의식과 본질로가는 길
井通俊彦 「의식과 본질」은 자신에게 청춘의 책이다. 또 평생 동안 계속 도전해 읽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만남은 나니 시대였다. 동대의 과거문이라는 형태로 갑자기 그 텍스트는 눈앞에 뛰어들어왔다. 의식이란 외부의 대상을 향해 가는 것이며, 그 외부의 대상을 그것과 의식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본질이 파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전혀 의미를 모른다. 하지만 어딘가 재미있다. 잘 모르는 흥미를 잡아, 계속 인상에 남아 있었다. 후일, 고혼야에서 문득 손에 넣은 것이 이와나미의 원저로, 그 문장은 서문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알았다.
그 서문이 이것 또한 충격적이었다. 저자의 목적은 노자나 반청경전과 같은 인도 중국의 익숙한 고전 세계뿐만 아니라 선이나 일본적 철학은 물론 이슬람 세계의 철학을 포함하여 동양 전체의 철학 체계와 근대 서양 철학 모두를 스코프에 넣고, 전 인류의 철학의 총괄해, 「공시적 구조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무슨 야심. 그런 일, 보통 생각할까? 하나의 대비 보물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소년 해적의 마음 속기다.
당연히, 참조해야 할 문헌이나 자료는 극히 다방면에 걸쳐 방대하기 때문에, 이 책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의 서문과 같은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쓰고 있는 이 서문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의 전체상으로부터 하면, 「서문의 서문」에 해당한다고, 이런 것이었다.
자신이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문장은 그 '서문의 서문'의 최초반에 해당하는 도입 부분이었던 것이다. 그것조차도 난해했던 것이고, 실제로 동대의 입시 문제로 다루어질 정도의 문장이다. 이 사람의 지적영위의 「서문의 서문의 도입」조차도, 자신에게 있어서는 설치할 섬도 없는 안벽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장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자체에, 단지 오로지에 경외감 을 안았다.
그 책은, 처음에 옛 서점에서 손에 넣은 이래, 몇번이나 이사를 했지만, 결코 손 놓는 것은 아니고, 5년에 1회 정도, 읽어 왔다. 그리고 어젯밤 또 성 징조도 없이 '서문의 서문 도입'을 되돌아보며, 최근 얻은 여러가지 주의 덕분인지 이전보다 읽고 있는 자신을 깨달은 것이었다.
문제의식은 「실존」→「본질」→「이름」→「의식」이라는 흐름에 있다. 본래,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물리적 세계에는 이름 등 붙어 있지 않다. 마음대로 인간이, 저것은 산, 이것은 꽃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후지산이지만 타카오산이지만, 「산」이라고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는, 「산」이라고 정의되기 위한 본질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전적인 불교 철학의 세계에서 이러한 본질은 '허망'으로 철저하게 그 허구성을 논한다.
확실히 그것은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인간이 무언가를 '수치'라고 느낀다. 그러나 도대체 무엇이 '수치'인가. 그것을 지지하는 객관적 실존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마음속에 흔들리는 어쩐지 밖에 없고, 그 이름을 주지 않으면, 지각조차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감각이나 감정 같은 형태가 없는 것만이 아니다. 구체적인 물건, 예를 들면, 후지산이라도 좋다. 후지산이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후지산인가. 산 정상에서 중복, 밑단으로 내려간 앞에는 관동 평야까지 당연히 지속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평야도 후지산의 일부이며, 후지산도 평야의 일부라는 신기한 일 일어나 버린다. 생물학에 있어서의 「종」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 교배 가능한 것끼리를 같은 종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박물관적인 분류와 이것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면 현대적인 감성을 가진 인간은 상당히 동요한다. 발밑이 흔들리는 느낌을 기억한다.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인식 세계가 사실 픽션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안할 일은 없다. 선자란, 세계를 의식적 인식론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언어화되어 객관적인 사물로서 개념화되기 전의 단계, 무의식적 인식에 의해 세계를 본다. 그러한 훈련을 쌓는 것으로, 세계의 붕괴는 면하면, 뭐, 그러한 이야기가 도입 부분에서 전개된다.
오랜만에 읽고 생각한 것이, 「정의」나 「본질」이 화상에 만능인 전제 너무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인간의 인식의 기초는 정말로 「본질」에 있는 것일까. 인간의 인식의 기초가, 「본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류키가 말하는 곳의, 이것은 산이 아니고, 산이 아닌 것도, 산이든 산이 아닌가 하는 것도 아니다. 되어 버린다. 나쁜 것은 반드시 '본질'에 대한 신뢰인 것이다.
「프로토타입과의 거리」라고 하는 최근의 인지 과학에 있어서의 「비・정의적」인 인지 시스템을 전제로 하여 논리 체계를 조립하는 것으로, 전혀 다른 철학 세계가 개척하는 것은 아닐까. 「정의」나 「본질」의 만능성을 의심한다고 하는 발상이, 이, 알았던 것 같은 모르는 것 같은 신기한 이굴에 바람을 뚫는 것에 연결되는 것은 아닐까.
부담없이 크리에이터의 지원과 기사의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