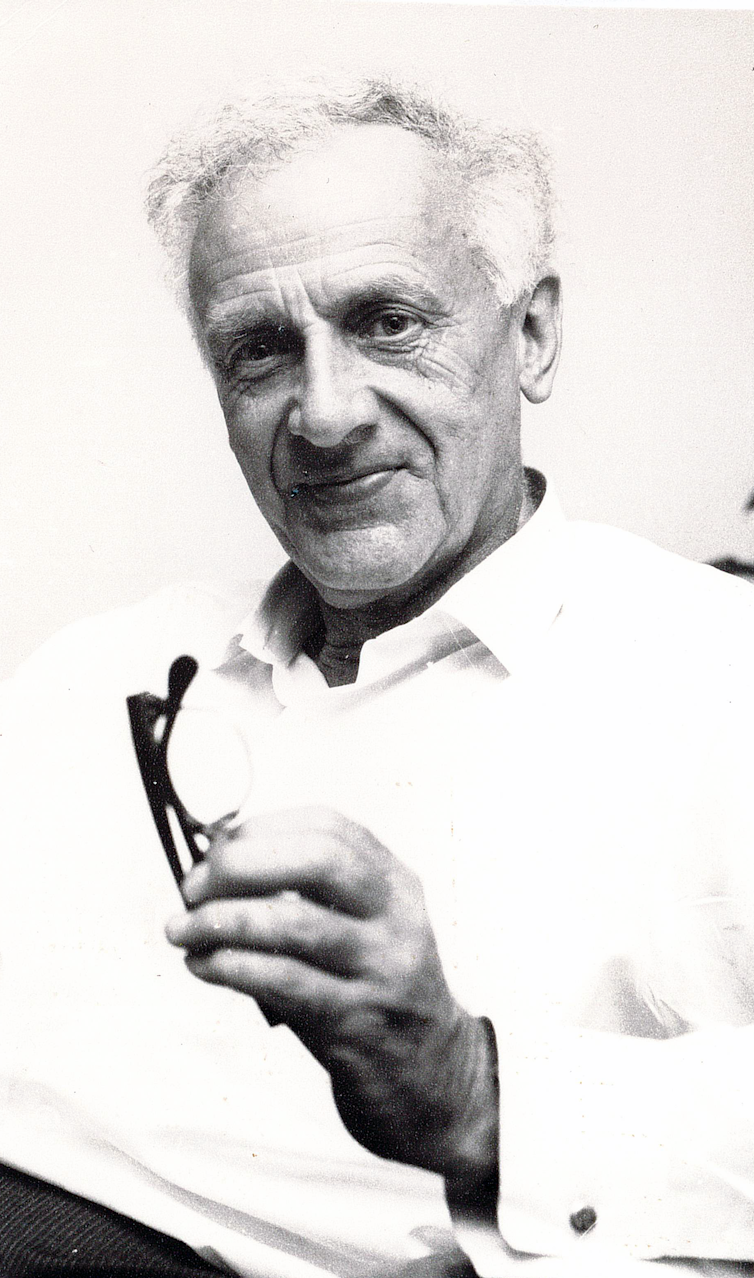서평 - <The Japanese Colonial Legacy in Korea 1910-1945: A New Perspective> Part 1
서평 - <The Japanese Colonial Legacy in Korea 1910-1945: A New Perspective> Part 1
29 April 2015 at 18:00
중국계 미국인 학자 에이미 추아는 <제국의 미래>라는 책에서 제국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 하나는 피정복 집단을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약탈하며 철저히 출신으로 위계를 짓고 본국과 식민지를 막론한 제국 내에서 소수자를 배제하는 '닫힌 제국'이다. 다른 하나는 그와는 달리 피정복 민족이나 소수자를 최대한 제국 질서 내로 포섭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열린 제국'이다.
에이미 추아에 따르면, '닫힌 제국'의 대표적인 예는 에스파냐 제국이다.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원주민을 대량으로 학살하고 혹독한 강제 노동을 시켰으며 카톨릭으로의 개종을 강요했다. 원주민의 문화도 싹 무시하고 에스파냐의 문화적 표준을 일방적으로 이식하려 했다. 흑인들을 들여와 노예로 부렸고 백인이라 해도 식민지 태생이라면 에스파냐 본국 출신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았다. 라틴아메리카 독립전쟁을 이끈 시몬 볼리바르도 '크리요'라 불리는 식민지 태생의 백인 대지주였다. 본국에서 파견된 관료들은 식민지인들을 철저히 푸대접하여 인종을 초월한 불만이 싹트게끔 만들었다. 또한 본국에서는 유대인, 무슬림, 개신교도 등의 종교적 소수자를 배척하고 카톨릭이라는 한 가지 가치만을 강조했다. '돈키호테'로 대표되는 무관귀족의 덕은 칭송되었지만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제조업자, 상인은 천대받았다.
반면 '열린 제국' - 에이미 추아에 의하면 더 성공적이었던 제국들이 지녔던 형태 - 으로는 대표적으로 로마,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실시하기 전까지의 중국,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오늘날의 미국을 들수 있다. 이 제국들의 특징들로는 상업과 무역 활동에 대한 장려, 현지의 문화와 관습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식민 정책(이 점은 영국 제국에는 해당되지 않는 편에 가깝다), 식민지 및 주변부 출신들에게도 상당부분 주어지는 교육, 공직임용, 경제활동의 기회, 최소한 어느 정도의 근대성을 갖춘 법체계 등을 들수 있다. 그리고 바로, 내가 읽었던 이 책이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일본 제국(1868~1945) 역시도 이런 제국이었다.
이 책은 금년 들어 출간된 신간으로, 아직 한국어 번역판은 나와 있지 않다. George Akita라는 일본계 2세 미국인과 Brandon Palmer가 공동으로 저술했다. Akita는 태평양 전쟁 기간에 군 복무를 한적이 있으며 전후에 주일 미군으로 도쿄에 배치되기도 했다. 제대 후 공부를 다시 시작해 하버드대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일본을 자주 드나들며 일본의 근현대사를 연구했다. Palmer는 현재 코스털 캐롤라이나 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아시아 역사를 가르치는데, 한국 역사로 하와이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주된 관심 분야는 1937~1945년 기간 동안 조선의 징병제 확립과 미국의 한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연구다.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일본 제국을 에스파냐 식의 '닫힌 제국'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한 인식이 심어진 이유는 일제 시대를 매우 고통스러웠던 것으로만 기억하는 사람들의 서사가 역사 서술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 제국에게 가혹한 국가폭력을 경험했던 조선인들이(그들이 소수냐 다수냐, 또 35년 내내 그랬냐는 잠시 차치하더라도) 존재했던 건 사실이다. 또한 일본 제국이 반드시 악의적인 의도를 갖지 않았던 몇몇 정책들도 다른 여러 이유들에 의해 조선인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혹함의 기억이 식민지 조선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단정할수 있는가, 정말 조선인들의 절대다수가 그러한 식으로 실존했는가는 좀 따져봐야할 문제다. 이 책은 그 문제를 정면으로 대하고 있다.
우선 일본 제국의 주변부 및 식민지 지배 전략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일본의 본국은 물론 제국의 주변부에까지도 모더니티의 원칙을 적용하려 노력했던 정치가들과 행정가들을 언급한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야마가타 아리토모, 오쿠마 시게노부, 하라 케이, 하세가와 요시미치, 이노우에 가오루, 이토 히로부미 등이다. 먼저, 일본은 에도 시대까지만 해도 쇼군의 지배권이나 일본의 문화권에 들어가지 않았던 오키나와와 홋카이도에서 식민통치의 경험을 쌓는다. 그곳에서 일본은 본토와 똑같은 기준의 교육, 행정, 조세 제도를 입안하기에는 여건이 마땅치 않다고 판단한다. 문맹률도 일본 내지보다 훨씬 높았고, 근대 제도에 대한 문화적 저항도 있었다. 그래서 일본은, 예를 들자면 오키나와의 전통적인 세금 징수 시스템을 한동안 보존하기로 결정한다. 이른바 점진주의(gradualism) 내지는 개량주의의 원칙을 택한 것이다. 청일 전쟁 승전 후에는 타이완과 중국 동남부 지방 일대를 통치하면서 이전의 경험을 살린다. 조선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 원칙을 적용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이, 일본인들이 보기에 조선은 오랜 기간동안 견고하게 형성, 유지되었던 국가 시스템이나 문화적 전통이 있어서 일본식 모더니티를 빠른 시간 안에 쉽사리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였기 때문이다.
조선의 초대 총독은, 한국인들에게는 악명 높은 데라우치 마사사케였다. 그러나 저자들에 의하면, 한국인들이 데라우치 총독에게 갖는 고정관념은 의문의 소지가 적잖다. 그동안 수많은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그의 치세(1910년대의 이른바 '무단통치' 시대)를 '암흑의 시대'로 규정해 왔지만, 저자들은 정말로 1910년대의 조선이 조선 말기에 비해 일반 민중의 입장에서 살기 나쁜 시대였는지 독자들에게 반문한다. 조선 말기에는 지방 관리들과 토호들의 수탈이 극심했고 엄격한 성리학 윤리가 생활의 구석구석을 숨통이 조일 정도로 지배했지만, 조선총독부는 오히려 세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면해주었고 성리학의 속박으로부터 조선인들을 해방시켜주었음을 말한다. 일제 시대에 이루어진 일들 중에는 이처럼 긍정적인 일들도 있었는데 한국의 민족주의 사관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부정적인 일들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는 혐의를 제기한다.
또한, 민족주의 사관은 조선총독부의 정책이라면 언제나 불순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을 거라고 전제하고 연구를 한다. 그러나 그렇게만 볼수 없는 정책들이 실제로 적지 않았음을 이 책은 말한다. 우선, 조선총독부는 초등, 중등교육의 보급을 위해 애썼다. 그래서 조선 시대까지는 거의 교육을 받지 못했던 일반 농민이나 천민 출신의 자녀들이 기초적인 교육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일제 말기가 되면 3분의 1 정도의 학령기 어린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닐수 있게 되고, 그 중 4분의 1 가량이 여자아이들이었다. 이걸 근거로 계산을 해보면 당시 남자아이들의 4분의 1과 여자아이들의 12분의 1 정도가 초등학교를 다닐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것은 조선 말기에 비해서 절대적인 증가임은 물론, 동시대의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들(저자들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 벨기에령 콩고, 프랑스령 서아프리카, 영국령 케냐 등의 수치를 제시한다)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물론 더욱 큰 틀에서의 사회 구조를 본다면 이러한 근대 교육의 보급도 결국 제국 체제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노동력을 양성하고 제국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하기 위함임을 유추할수 있다. 그러나 그런 특징은 현대의 독립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갖는다. 어쨌든 일제 시기 조선에서는 초등교육뿐만 아니라, 농촌의 저수지 건설 및 관개 사업, 보건의료 정책, 1930년대의 '농촌진흥사업' - 협동조합을 통해 자영농에게 저리 대출을 알선하고 새로운 농업 기술을 보급 -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생활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적어도 조선시대의 형편없는 수준에 비해서는 말이다.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는 결코 일본인과 조선인을 차별대우하려 하지 않았다. 물론 학교나 직장과 같은 곳에서 일본인들 사이에 조선인에 대한 비공식적인 차별의 관행은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총독부가 그러한 관행을 방치하거나 조장했다는 그동안의 역사인식은 사실이 아니다.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는 차별적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 상당히 애를 썼다. 기본적으로 그들의 방침은 일본인이건 조선인이건 출신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경쟁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또한 두 집단이 문화적인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공존할수 있는 동화(assimilation)가 그들의 정책 목표였다. 그러나 때로 이런 정책들은 오히려 조선인들에 의해 거부되는 경우가 있었다. 책에서는 일본의 한 대학교가 일본인과 조선인이 기숙사에 함께 살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조선인 학생들이 반발하며 일본인과 조선인 기숙사의 분리(segregation)를 요구했던 사례를 소개한다. 식민지 조선의 급속히 성장하는 초등교육을 맡을 교사 충원에 있어서도 일본인과 조선인 간에는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었다. 다만, 일본인 교사에게는 조선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약간의 보너스가 지급되었다.
또한 조선총독부의 정책들은, 때때로 좀 강압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가능한 법치주의의 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지켜가며 수행되었다. 저자들은 일본 제국의 법치주의적 성격과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을 설명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오츠 사건(1891년 일본을 방문한 러시아의 황태자가 호위를 맡았던 일본 경찰관의 칼에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일본 사회와 일본 정치권, 각료들 내의 논쟁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는데, 당시 일본의 일반적인 여론과 법무 장관의 의견은 이 사건에 "군주나 왕족에 대한 살해 시도"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조항에 해당되는 범죄자는 사형을 언도받을수 있었다. 타국의 차기 왕위 계승자를 살해하려 한 일에 대해 엄격히 처벌해야만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피할수 있고, 일본의 국제적인 신임을 유지할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토 히로부미와 이노우에 가오루를 비롯한 핵심 각료들은 시각이 달랐다. 그들은 법 해석에 대해 여론이나 정권이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고, 오직 사법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만 해결되어야할 일이라고 보았다. 그들이나 사법부의 많은 법관들이 보기에, "군주나 왕족에 대한 살해 시도"를 처벌하는 법률에 이 사건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었다. 아직 일본에 외국 군주나 왕족에 대한 살인이나 살인 미수를 처벌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이토 히로부미는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이야말로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신임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일본의 법관들은 용의자에 대해 "군주나 왕족에 대한 살해 시도" 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살인 미수죄를 적용했다. 결국 범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을 하다 한 달만에 사망했다. 러시아 측에서 강한 항의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 근대 일본은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에 각별히 신경을 쓴 사회였다. 이것은 1930년대와 1940년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조선과 타이완이라고 해서 원칙이 꺾이지는 않았다. 물론 몇몇 일탈적 사례들이 있었다. 1911년의 105인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의 용의자들은 자신들을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갖지 못했으며 고문을 받았다. 이것은 저자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같은 경우가 일제시대 내내 적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자들의 일관된 견해이다. 개별 경찰관들이나 관료들이 조선인들에게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상당하긴 했지만 그것이 결코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의 일반적인 방침은 아니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일본 정계의 일각에서 조선과 타이완 사람들에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하여 자신들의 대표를 의회에 보낼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1920년대 초반 하라 케이와 하세가와 요시미치는 사타케 요시노리 남작으로부터 질의를 받아 조선인과 타이완인의 선거권 부여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논의했다. 일본 정가에서 그 주장은 오랜 논의 끝에 결국 받아들여져 1945년 4월에는 차기 총선을 조선과 타이완에서도 실시한다는 법령이 통과된다. (물론 그 해 8월의 패망으로 인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이미 1920년대에 일본 본토에 거주하는 조선인이나 타이완인 남성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투표를 할수 있었고 후보자로 출마할수도 있었다. 심지어 조선인 유권자들은, 오늘날 미국에서 소수민족들이 영어가 아닌 언어로 투표할수 있듯이, 한글로 된 투표용지를 신청할수도 있었다. 1930년대와 1940년대를 통틀어 조선인과 타이완인 수십명이 실제로 일본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 그 중 조선인 박춘금 씨가 1932년과 1937년에 당선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과 타이완에 대한 자치권 부여(영국식 자치령제) 및 심지어 독립에 대한 논의까지도 있었다. 놀랍게도 일제 식민 치하의 조선에서 1936년에 독립 혹은 자치에 대한 조선인의 의향을 물어보았던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 (심지어 이 설문조사는 민족주의 사학자인 동원모(Wonmo Dong)에 의해 인용되었다.)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8.1%의 사람들만이 즉시 독립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11.0%는 적절한 시기에 독립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32.6%는 독립에 대한 의향이 없다고 답했으며 48.3%는 독립이 되건 안 되건 상관없다고 밝혔다. 물론, 저자들은 이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배경을 잘 알수없다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설문조사에서 즉시 독립을 지지한다("always thought of independence")라는 문항이 나온 자체만으로도 일본의 정책기조가 상당히 전향적인 방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다고 본다. 한편 또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한 국정 만족도를 물었는데, 11.1%는 불만, 14.9%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37.7%는 만족, 36.1%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리고 두 설문조사 모두에서, 지식인층과 학생, 종교지도자 그룹의 즉시 독립 지지와 일본 정부에 대한 불만족의 정도가 전체 응답 및 일반인 그룹에 비해 높았다. (한국의 민족주의 사관이 일반 농민이나 도시민보다는 엘리트 독립운동가들의 서사라는 점을 암시하는 결과인데, 이 주제에 대해 2부에서 자세히 논하겠다.)
이 책에는 한국인들이 알아야 할 식민시대의 실상들이 너무도 많다. 물론 이 책이 많은 부분 취하고 있는 식민지근대화론은 그 나름대로의 한계를 갖고 있는 이론이며 일본이 아무리 관용적이고 온건한 정책을 펼쳤다 해도 제국은 제국이었다는 사실 역시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책은 주로 윤해동, 이영훈, 신기욱, Carter Eckert 같은 학자들의 연구를 인용한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는 충격적이고 불편한 일제시대의 진실이 많은 책이라, 도저히 서평을 한 번에 끝낼수가 없다. 2부에서 남은 이야기를 계속하겠다.
LikeShare
34You, Park Yuha, 李宇衍 and 31 others
10 shares
14 comments
Comments

Suktae Oh 서평 잘 읽었습니다. 일본 식민 지배 체제가 조선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초등교육의 확대라는 얘기는 차명수의 '기아와 기적의 기원'이라는 책에 잘 나와 있더군요. (정확히 말하면 처음 절반은 일본 식민통치, 나중 절반은 해방 후 미국 군정 덕이었습니다.) 해방 직전 일본이 조선에서 제국의회 의원을 선출할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지만 박춘금이라는 조선인 의원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위키백과를 찾아보니 '정치깡패'라고 되어 있네요.)
5Manage
3y

Bruce DK Lee 서평 잘 읽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는 민감해서 ... 험!험!) 저는 이만 줄행랑을 ...
1Manage
3y

정재웅 흥미로운 분석이군요... 작년 가을에 있었던 전국역사학대회 한국금융공학회 세션에서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송수영 교수님께서도 일제 식민시대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을 말씀해주셨는데... 한 번 읽어보고 싶은 책이네요.
1Manage
3y · Edited

Lorgar Bae 번역이 나온다면 꼭 보고싶네요.Manage
3y

정승원 Andrew Jinwoo Kim 서평, 잘 읽었어요. 제가 보기에, '조선인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백그라운드는 일제 식민지 지배 체제의 성격이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와 많이 다르고, '조선인 위안부' 모집 과정도 이런 체제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어요. 책이 괜찮으면, 정종주 대표 출판사를 통해 번역을 추진해봐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서평 기대하겠요.
1Manage
3y

정승원 한일합방을 양반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은 우리와 아는 것과 다르게 반응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조선 말기가 철저한 억압체제였기 때문이죠.
2Manage
3y

서윤 음... 잘 읽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어긋난 곳이 있군요. 책의 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 예컨대 교육의 보급에 힘을 썼다는 부분에서 사실관계가 약간 정교하지 못하다거나(물론 진우씨가 정리해서 쓴 거라 그럴지 모르지만, 진우씨의 정돈능력을 믿기에 책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인과 내지인의 차별 문제라든가 하는 점들에 관해서는 총독부와 제국의회의 입장이 상충하는 가운데 표류한 일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책이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 서평 기대합니다.
 :)
:)5Manage
3y · Edited

최이영 제국의 위안부 (책) 사서 읽어보고 싶네요Manage
3y

Andrew Jinwoo Kim Jong-joo Jeong Park Yuha
1Manage
3y

Leonard Choo 아 이 책 정책자료실에서 봤어. 식민지화 덕에 산업발전을 이루었다라는게 좀 정당화하는.느낌으로 써있길래 안 읽었는데ㅋㅋ. 형 서평은 믿고 고맙게 읽겠음Manage
3y · Edited

Andrew Jinwoo Kim Leonard Choo 사실 내가 빌려감 ㅋㅋ
1Manage
3y

Park Yuha 잘 읽었어요.대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다만 차별에 관해서는 좀 다른 생각. 일선동조론이니 내선일체론이니 말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애쓴 건 분명하지만
제도적 /심리적인 차별은 끝까지 존재했지요. 또 동화가 안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징병도 늦게 한 것인데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군사훈련을시키면서 일본인 학생 한테는 진짜총, 조선인 학생한테는 가짜총을 주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검이 달린 총을 든 조선 남학생들을 일본학생들은 ...See more
12Manage
3y

Andrew Jinwoo Kim Sangil Baek 일본이 조선에 법적으로 '내지연장주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역사학자들 간에 이견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들의 경우 "조선의 현실을 고려한 점진주의 원칙 때문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Manage
2y

Haeman Hong-Shin 잘 읽고 갑니다~!
1Manage
2y
---------------
서평 - <The Japanese Colonial Legacy in Korea 1910-1945: A New Perspective> Part 2
3 May 2015 at 17:46
(이번 서평의 앞 부분 절반은,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데 충실하기보다는 책의 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배경 지식을 소개하고 그를 토대로 이 책을 해설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제강점기의 한국 역사를 주로 '민족'의 관점으로만 파악해 왔다. 민족의 관점은 일제강점기에 존재했던 미시적 영역에서의 진보와 개선을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한다. 또한 식민지 하에서도 근대인으로 실존했거나 그런 선택을 할 기회가 있었던 조선인들의 이야기(개인의 관점)가 반영되지 못하며, 계급과 여성과 소수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보는 작업 역시 묻혀 버린다. 정말로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볼 땐 반드시 '민족'의 관점을 다른 모든 관점들보다 우선해야 하고 우위에 두어야 하는 걸까? 계급의 관점, 여성의 관점, 소수자의 관점, 개인의 관점은 민족의 관점에 비하면 하위로 취급되는 것이 마땅할 만큼 중요하지 않은 걸까?
그렇다면 잠시 한국의 흔한 민족주의 사관에서 말하는 일제강점기의 서사를 살펴보자. 민족주의 사관에 따르면, 일제는 조선에 근대적 인프라스트럭쳐를 일부 구축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철저히 조선의 물자를 빼앗아 일본으로 수송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그러면서 조선인들의 복지에는 냉담했고 조선인들을 교육과 취업에서 철저히 차별했다. 총독부와 경찰은 걸핏하면 얼토당토 않은 트집을 잡아 조선인들을 잡아 가두거나 괴롭혔고, 많은 수가 날조된 혐의로 공정한 재판 없이 처벌을 받고 고문을 당했다. 민족 운동과 독립 운동은 이러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반발로서 일어난 것이며 일제 자본주의 하에서 착취받던 농민과 노동자 등 기층민중은 철저히 이 운동에 동조했다. 조선인들은 모두가 일제의 (직접적인) 피해자였으며, 계급과 젠더를 초월하여 반제 투쟁에 같은 뜻을 가졌다.
그러나 민족주의 사관의 이 서사 - 해방 이후 한국인들이 학교에서 교육 받은 역사 - 는 상당 부분 거짓이며 일부의 사례를 부풀려 말한 것이라 할수 있다. 먼저, 적어도 일제 초기의 민족주의 운동은 철저히 엘리트 지식인들의 전유물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민족 운동은(적어도 최초 기원으로만 보면) 절대로 일제의 탄압이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반발로서 등장한 자연발생적인 투쟁이 아니었다. 이미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기 전부터도 이런 식의 엘리트 반일 운동은 많이 존재했다. 흔히 의병이라 부르는 무장투쟁이 최초로 발생한 건 을미사변 직후인 1895년의 '을미의병'이다. '국모' 명성황후가 일본 측 자객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한 꼴을 보고 분노한 양반들과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일 무장투쟁으로서, 철저히 엘리트 중심적이었고 조선 국가와 조선 왕실에 대한 충성심에 기반하여 일어난 무장운동이었다. 이들의 정신적 지주는 흥선 대원군이었으며 척사파-소중화주의 사상을 기저로 둔 반동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후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1907)에 이은 '정미의병'과 '서울 진공 작전'과 같은 민족주의 무장투쟁들도 일반 서민들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망해 가는 구체제 엘리트들의 자존심에 기반한 면이 컸다. 1910년대까지도 양반이 아닌 출신의 의병장은 신돌석 정도가 유일했고, 상민이나 천민 출신은 의병 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지 못했다.
조선의 일반 농민들은 자신들을 실컷 쥐어짜다가 무능으로 망해 가는 나라를 구하는 일에 냉담했다. 개항 이후 국제 무역의 확대와 갑오경장 이후의 근대적 제도 정비에 힘입어 새로운 시대의 승자가 되어 가던 상인들과 지주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혈통 때문에 구체제 엘리트들에게 괄시받으며 살았던 이들에게는 오히려 일본 같은 근대 국가가 자신들의 삶의 기회를 넓혀주는 존재였다. 조선의 과거 시험은 명목상 실력주의적인 제도였지만,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일반 농민들이나 상인들이 이 시험을 준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 근대 자본주의의 도입은 여전히 좁은 문이긴 했지만 상민, 천민 출신들에게도 출세의 기회가 주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조선총독부가 조선인들에게 아무 원칙도 없이 마구 횡포를 부리는 전제(despotism)를 실시했던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은 이미 1부에서 이야기했던 바 있다. 1부에서도 말했듯이 개별 관료와 경찰관의 권한 남용인 경우를 제외하고 식민 체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평범한 조선인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다만,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은 철저한 탄압의 대상이었다. 반체제 혐의자들의 경우엔 고문을 얼마든지 할수 있었고 처벌도 일반 범죄자들에 비해 가혹했던 게 사실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아나키즘, 생디칼리즘 등의 급진적 운동이 가혹한 탄압을 받았던 건 일본 본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나는 이러한 탄압을 받은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고초가 가볍다거나, 그러한 이들이 일본과 조선의 대다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본 제국 체제가 정당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서사가 그 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인 양 비춰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급진적 반체제 운동이나 독립 운동에 투신했거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사람들의 비율이 조선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낮고, 또 그러한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의 절대다수가 양반이나 유생 출신, 종교 지도자,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과 같은 이른바 식자층이었다. 계급적으로 봐도 자본가, 지주, 상인, 화이트칼라 출신들이 많다. (물론 이 계층의 사람들 중 결코 적지 않은 수가 체제 친화적이었고 일제 말기에 이르러서는 적극적인 체제 홍보 및 찬양 활동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책에서는 일본 정가의 거물 하라 케이가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응을 세 계층으로 나누어 파악했던 바를 보여준다. 하라 케이가 보기에 조선의 상층부는 식민통치에 대해 격렬한 반감을 표하면서도 내심 일본 사회와의 동화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고, 하층 사람들은 일본의 정책들에 만족했다. 소수의 중간층 그룹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탓에 불만이 컸다고 평했다.
한편 이 책은 조선의 민족주의 운동이 종교계와 결부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한다. 민족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종교는 크게 넷이다. 우선 망한 조선에 대한 충성심과 복고주의로 정신무장한 유교가 있다. 그리고 민족주의를 통해 성장을 도모한 천도교(동학의 후신)가 있다. 또 애초부터 교리 자체가 단군을 신으로 모시는 민족적 종교(ethnic religion)인 대종교가 있다. 대종교는 마치 유대교와 비슷한 선민의식을 중요한 축으로 삼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방 이후 민족주의 서사를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개신교가 있다.
네 가지 종교 중 개신교를 제외한 셋은 반근대주의적인 면모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일본 제국이 제공하는 어떠한 근대문명의 이기도 조선인들의 이익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실제로 오늘날 한국의 극렬 민족주의자 그룹에서는 이들 종교와 이들에게서 파생된 계열 종교의 영향력이 상당하다. 이들은 해방 이후 자신들의 틀로 인식한 일제강점기의 서사를 사회 일반에 보급하고 대한민국의 교과서에 집어넣는데 애썼다.
개신교의 경우는 데라우치 총독 시절부터 집중적인 탄압을 받았고 이후에도 제암리 교회 학살 같은 여러 수난사를 겪는 등 조선인들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이고 정도가 심한 일본 제국 체제의 피해자 집단이었다. (물론 개신교는 서양인들과의 연계가 있었기 때문에 단 한 건이라도 조선총독부의 탄압이 있으면 타 종교에 비해 곧바로 해외로 알려져 뉴스화될수 있었다는 면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 내지에서 다양한 교파의 개신교가 그럭저럭 용인되다가 1930년대 후반 이후에 관제화되는 정도였던 것과는 대조적인데, 아쉽게도 이 책에 그 이유까지는 나와 있지 않다.
또한 책에서는 민족주의 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이 받았던 극심한 탄압과는 대조적으로, 형평 운동이나 여성 운동과 같은 다른 사회 운동이 일제 하에서 충분히 용인되었다는 점을 언급한다. 이 부분에서는 자유주의 운동, 평화 운동, (비사회주의적) 노동 운동 등이 얼마든지 허용되었던 일본 본토의 기준이 조선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형평 운동에 대해 총독부는 철저히 중립을 지켰고 백정 출신을 차별하는 관습의 문제를 철저히 조선인들의 여론에 맡겼다. (책에 직접 서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 추측으로 백정 출신을 서류상에 특수한 표시를 함으로서 차별을 했던 제도는 아마도 조선의 관습을 어느 정도 존중하자는 점진주의 기조에서 나온 정책인것 같다.)
그리고 일제 시기 농민 쟁의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 신기욱의 논문을 인용하여, 조선총독부가 철저히 지주들의 이익만을 대변했다는 그동안의 통념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신기욱의 논문 <Peasant Protest and Social Change in Colonial Korea>(1996) 에 따르면, 총독부는 이미 1920년대부터 농촌 지역민들의 생활 악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고, 1932년에는 '소작중재령'을 공포하여 소작농들의 처우를 개선코자 한다. 또 1934년에는 '농지령'을 공포한다. 신기욱에 따르면, 소작농들은 그전까지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던 정식 계약서 작성권을 확고히 보장받았고 소작료의 인하를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조선에서 지주들의 수는 점차 줄어들어 종전 직전에는 거의 없다시피한 수준이 되었고 이들은 산업 자본에 투자하게 될 동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 신기욱의 해석이다. 다만 토지세를 올리는 등의 일부 조치들은 자영농에게도 타격을 주었다.
한편 저자들에 따르면, 한국의 민족주의 사관에 힘을 실어주는 다른 요인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일본의 마르크스주의 사학계다. 일본의 마르크스주의 사관은 1930년에서 1945년까지의 일본 사회를 파시즘으로 정의하고, 군부에 의해 법치주의가 훼손된 참담한 시기로 묘사한다. 그러나 저자들은 이것 역시 반박하면서 반례로 1930년대 일본 농촌에서 일어난 일들의 경과를 소개한다. 사실 일본의 농촌도 그리 사정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는데, 군부가 일본 정치의 실권을 쥐었던 1930년대에 조선에서와 같이 농촌 진흥 사업이 벌어진다. 그때까지 일본의 농촌에서는 촌로를 비롯한 마을 세력가들의 힘이 막강했는데, 일본 정부는 그들을 견제하고 자영농과 소작농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간 규모의 자영농 및 소작농들의 조직과 긴밀히 협력했다. (책에서는 이들을 "whole-village group"으로 칭한다.) 일본 정부가 사가 평원에서 관개 사업을 시행했을 때, 관료들은 현지 농민들과의 협업에 많은 공을 들였다. 관료와 연구자, 농민 단체들 사이의 힘의 균형을 중시했고 이 세 집단은 농업 기술의 발달에 도움이 될만한 각자의 노하우를 서로에게 조언하고 전수함으로서 중농과 소농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촌의 근대화를 이루어 냈다. (이상의 내용은 Penelope Francks의 <Technology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in Pre-War Japan>에서 저자들이 인용)
지금까지 나는 이 책이 주장하는 일본 제국의 모더니티가 조선에 가져온 긍정적인 면들에 대해 썼다. 다음 번 서평에서는 내가 본 이 책의 한계들에 대해 쓸 예정이다. 그럼 기다리시라~~!
LikeShare
22You, Park Yuha, 서윤 and 19 others
6 shares
21 comments
Comments
View 2 more comments

Andrew Jinwoo Kim Park Yuha 서윤Manage
3y

Park Yuha 대체적으로 동의. 특히 개신교와 좌파가 해방이후 저항담론의 주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관순 이야기도 해벙이후 세번이나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보급되었는데 이화가 개신교학교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겠습니다.
요는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반체제파가(좌파)가장 억압당한 사람들이었고 그런 억압은 한반도에 살던 일본인도 똑같이 받았구요. 그러다 보니 좌파에겐 저항의 기억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오늘의 반일담론을 진보가 맡고 있는 것도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지요.
문제는 좌파였어야 할 노비계급에서 신분을 벗어나고자 창씨개명을 해서 먼저 친일파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모순을 같이 봐야겠죠.
4Manage
3y · Edited

서윤 잘 읽어봤습니다. 하라 케이가 여기서도 인용되는 모양입니다. 일본이 통감정치기(1890년대-1910년)에 조선병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조선이 대만과는 달리 상당한 정도의 국가체제와 문화적 특수성, 그리고 집단 정체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그리고 조선의 지배층과 재지양반층, 기층민줄이 느끼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온도차를 감안했다는 증거가 많습니다.
위에 박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그렇게 고민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See more
1Manage
3y

Andrew Jinwoo Kim 희수 아, 이 부분에선 '체제'라고 표현하기보다, '행정당국'이라고 표현했어야 했던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일본제국은 적어도 명목상으로나마 법치주의에 근거하여 통치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이 책을 비롯해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의 연구는 일제의 수탈이 결코 조선시대보다 심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Manage
3y

김대기 희수
이게 참......See more
2Manage
3y

김대기 역사수정주의에 대해 좀더 이야기하면
홀로코스트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만...See more
2Manage
3y

Supura Doyoda 나누는 말씀들을 보고 있으니 이런 생각도 듭니다. 5.16이후의 극단적 반공교육이 파산한 결정적 증거로 80년대 학생운동권의 주도권을 차지하다시피한 '주사파'를 들 수 있겠습니다. 유신체제하, 70년대 초중고 교육을 받은 이들은 빨갱이는 모두 뿔달린 악마라는 식의 극히 비현실적이고 유치한 반공교육에만 물들어 있다가 대학입학과 동시에 갑자기 다양한 관련 '팩트'들에 노출 됩니다. 여기서 일종의 착시가 일어날 수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최악의 지옥에서...See more
3Manage
3y

김대기 Supura Doyoda
전문용어로
빠가 까를 만든다.
혹은
까가 빠를 만든다.
라고 할수 있지요.
번증법이 합으로 이른다는 것은
이상적 모델일 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3Manage
3y · Edited

Supura Doyoda 급동의 합니다! 언제나 직관에 빛나는 표현력을 보여주시네요. ^^ 그런 좋은 예로 떠오르는 인물은 통신시절부터 떠들썩했던 김완섭씨같은 분을 들 수 있겠습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A%B9%80%EC%99%84%EC%84%ADManage
김완섭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KO.WIKIPEDIA.ORG
1
3y

김대기 논리나 이성같은걸 싹 접어치우고 본능만으로 말하자면요,
가장 열성적인 신자는 개종한 자들이며...See more
1Manage
3y

Supura Doyoda "가장 열성적인 신자는 개종한 자들이며 한번 배신한 사람은 두번도 배신한다."
아. 생각해보니 테무진 역시 님과 생각을 공유했던 옛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상관을 배신한 적장의 부하를 참수하죠. ^^;
1Manage
3y · Edited

Andrew Jinwoo Kim 저는 두번이나 전향했으니 모두에게 죽일놈이겠군요 ㅋㅋ
1Manage
3y

Supura Doyoda 차마 '좋아요'는 못 누르겠습니다. 웃자고 하시는 말씀에 과도하게 진지한 댓글을 달게 됩니다. 수많은 사상가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일편단심 하나의 '이념'에만 일관되게 열광한 사람들은 단언컨대 단 한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유주의, 아나키즘, 맑시즘 등등의 여러 이념의 숲을 헤매고 때때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것만으로도는 '배신'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생산적인 방황과 극단적인 해악의 경계는 뜻밖에 흐릿하지만, 중심을 잡고 있는 마음새가 아집보다 진리추구 쪽에만 있다면 더더군다나 '배신'이랄 수 없는 것이죠.
2Manage
3y

김대기 Andrew Jinwoo Kim
테무진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테무진은...See more
2Manage
3y

김대기 Supura Doyoda
옳은 말씀이십니다만...See more
2Manage
3y

Supura Doyoda 다소 과격한 주장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헤겔이 자신의 시대를 관통하는 여러 역사적 사태에 대하여 보인 반응들이나 이광수가 독립운동과 친일협력을 오갔던 것 등등은 각각의 옹호자나 반대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됩니다. (이광수의 경우 스스로 부끄러워했으니 옹호자들을 머쓱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역사적 격랑 속에서 어차피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말씀하...See more
2Manage
3y

김대기 개인적인 생각이고 조금은 맥락이 다른 이야기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지식인'이라는 부류에 대해 너무 관대해요....See more
2Manage
3y

Andrew Jinwoo Kim 때때로 진리탐구자는 외로운 처지를 감당하는 것을 진리탐구자가 되는 댓가로 여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윤님과 미선씨 앞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서부를 떠돌아다니는 외로운 총잡이 같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어려움에 처한 마을을 악당들로부터 지켜주고 도와주지만 박수받을 때가 되면 미련없이 떠나야 한다는 거... 더 머무르면 마을 사람들이 쫒아내므로... ㅋㅋ
3Manage
3y

Andrew Jinwoo Kim Sangil Baek 혹시 못보셨으면...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 의견 부탁드립니
----------------
Facebook
 Sejin
Sejin
Home
Friend requests
Messages
1Notifications
Account Settings
서평 - <The Japanese Colonial Legacy in Korea 1910-1945: A New Perspective> Part 3
5 May 2015 at 18:35
이 책은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일제시기의 여러 실상들에 대해 밝히고 있지만, 이 책에서 미처 못 다루는 점들도 있다. 또, 종종 주장을 펴는 도중의 빈틈이 보인다. 이 책은 약 20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얇은 책이지만, 다루는 주제는 매우 광범위하다. 그러다 보니 한 주제에 대해 세밀하게 파고들지 못한 채 결론을 지어버리는 경우가 발견된다. 특정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지나친 비약이 보이는 부분도 조금 있다.
우선 저자들은 일본의 조선 통치가 온건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흔히 가혹했던 시기로 알려진 1910년대의 '무단통치' 시기나 1930~1945년 시기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3.1운동 이후의 더욱 온건해진 '문화통치' 시기의 업적을 조명하는 등 약간 앞뒤가 안맞는 구석을 보인다. 1910년대나 1930년대의 통치가 충분히 온건했다면, 왜 굳이 문화통치를 또 끌어와 일제의 온건성을 강조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었다. 일제의 온건성을 강조하기 위해 유리한 사실들과 논거들을 집중적으로 수집해 이용한다는 의심을 살 위험조차 있어 보인다.
그리고 1910년대의 일제의 통치가 민족주의 사관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온건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온건성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 사이에 불만이 적지 않았다는 점과 그 불만이 3.1운동 같은 대규모 봉기로 이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이 충분치가 않다. 물론 학교 교사가 칼을 차고 수업을 했던 일이나 집집마다 총독부 관료가 방문하여 위생검역을 실시한 게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간섭으로 받아들여져서 조선인들의 반감을 샀던 점과 같은 몇몇 사례들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조선인들 사이의 그 불만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미흡한 느낌이다. 분명 조선의 기층민중이 일본이라는 새로운 통치자에게 걸었던 일말의 기대감이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으로 바뀌었던 다른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은 민족의식보다는 일제당국의 무능함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또한 저자들은 식민지 모더니티와 현대 한국의 산업화 및 민주화 사이의 '연속성'을 주장한다. 그 과정이야 어쨌든, 식민지에 보급되었던 모더니티가 결과적으로 훗날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 이 주장은 너무 나간 것으로 보이며, 책에서 그 '연속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들도 매우 부실하게 제시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식민지 모더니티의 유산은 해방 후의 혼란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 단절되었다고 본다. 저자들은 내 생각을 반박할 만한 논리를 거의 내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일본제국의 법치주의와 한국, 타이완의 민주화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무리수까지 둔다. 그걸 뒷받침한답시고 저자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더 가관이다. 오늘날 중국의 사례를 갑자기 가져와서는 일본제국의 법치에 근거한 통치를 경험해 본적이 없는 중국의 정치가 얼마나 후지고 권위주의적인지를 보라고 주장한다. 정작 한국과 타이완에 일본제국의 법치주의, 자유주의 정신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도 서술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저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식민지근대화론이 갖는 한계들에 대해 알아보자.
식민지근대화론 자체의 이론적 한계도 있고, 식민지근대화론이 사용하는 연구 방법론들의 한계도 있다. 연구 방법론의 문제점들을 먼저 보겠다.
첫째, 통계 중심주의가 갖는 한계다. 이 책의 저자들을 비롯하여, 이 책에서 인용한 많은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의 연구는 통계 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그러나 통계가 그 사회의 실상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통계를 산출하는 방식이 현실에 안 맞는 경우도 있을수 있고(예를 들어 오늘날 한국 정부가 공식적인 실업률을 산출하는 방식처럼) 표면적, 1차원적 설명을 뛰어넘는 입체적 분석이 어려운 경우(예를 들면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규모 투자를 하느라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지만, 그것을 메울만한 세수가 부족했던 게 조선의 경제가 불황이어서였는지 감세 정책이나 탈세 때문이었는지를 알수가 없다)도 있다.
게다가, 일제시대의 통계 자료들은 대부분 macro 차원에서의 수치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서 micro 차원의 분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경제 성장률 자체는 꽤 높게 나와도 늘어난 부가 어디로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알수가 없어서 실제 사람들의 생활형편이 어땠는지 알수 없는 경우와 같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동안 총독부의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매년 상당한 폭(5~10%)으로 증가했지만, 그 돈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보건.의료 인프라가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집중된 것은 아닌지와 같은 의문점들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또, 조선총독부는 철도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는데 그 철도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나 사업체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수 있었는지, 철도가 들어선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알 수 없다. 초등 교육이 많이 보급되었다지만 실제 학생들에 대한 처우나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교과서나 학용품, 기자재 등의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부담되었는지도 더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인 기업가, 자본가들이 늘어났다지만 사업 관행에서 비공식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는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
둘째, 공문서 중심주의가 갖는 한계다. 물론 공문서의 사료적 가치를 사문서나 구술, 비문서 사료에 비해 높게 평가하는 것은 역사학 연구의 일반적인 원칙이므로 이것 자체를 비난할수는 없다. 그러나 공문서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것을 작성한 해당 기관, 그리고 기관 내에서도 상위직에 있는 이들의 이해를 반영할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다. 예를 들어 한 백년 뒤쯤 우리의 후손들이 2015년의 한국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공문서를 중심으로 연구한다고 치자. 박근혜 정부의 시각이 담긴 공문서만으로 2015년 한국의 전체 정세를 판단하는 건 말도 안 되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조선총독부나 일본 정부가 문서에 내세우는 온건한 정책기조가 혹시나 '말로만'에 그쳤던 것은 아닌지, 하위 실무자들에게 충분히 그 취지가 전달이 안되서 조선인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던 것인지 등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가 하면 식민지근대화론이 담고 있는 전제 자체도 비판을 받을수 있다. 일단 이 이론은 근대화와 모더니티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론이다. 모더니티가 전근대에 비해 생산력의 증가,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 형벌의 세련화, 일상생활의 편리함, 위생 조건의 개선과 같은 긍정적인 것들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모더니티의 특징들은 서구의 맥락에서 나온 것인데 비서구 사회가 만일 서구의 침략을 받지 않아서 모더니티를 이루지 못했다 한들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사회를 변화(evolution)시켜 나갈수 있었을 것이다. 또 모더니티가 가져온 새로운 형태의 폭력들이 일으킨 해악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첨언하자면, 과학지상주의와 자유주의에 바탕한 단선적(linear) 세계관으로 역사를 설명하는 식민지근대화론의 함정은 역시 단선적 사관을 갖는 마르크스주의 사관으로는 극복할수 없다.
이 책을 통해 나는 일제강점기가 그동안 한국인들이 흔히 배워왔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실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러나 모더니티의 혜택이 과연 조선인들의 대다수가 그것을 체감할수 있을 만큼 널리 퍼졌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또한 물질적 이기와 편리함이 각각의 사람들과 한 사회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말할수도 없기에, 이제부터의 역사 연구는 각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과 인권이 얼마나 중시되었는가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교훈을 새삼스레 다시 새긴다. 2부에서 밝혔듯이 계급, 여성, 소수자, 개인의 관점으로 보는 역사관이 민족주의 사관과 식민지근대화론 모두를 극복할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 본다. 이것으로 본 서평을 종료한다.
LikeShare
22You, 서윤, Okjin Park and 19 others
5 shares
9 comments
Comments
View 1 more comment

서윤 잘 읽었습니다. 좋은 서평이네요. 특히 이 글에서의 비판이 정말 좋습니다. 비판의 정석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의도를 함부로 남겨 짚으며 비난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점은 정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무단통치기와 문화통치기 사이에서 연속성을 온건함으로 찾으려 했다면... 좀 터무니없군요. 그 연속성은 제 생각엔 오직 "모순"뿐이거든요. 무단통치 이전부터 조선의 특수성을 대만과는 분리해 생각했으면서도 실제로는 법 적...See more
5Manage
3y

김대기 서평과 직접 관련도 없고
사실 가정이란건 무의미한 이야기긴 하지만
한가지 금기를 털어봅시다....See more
1Manage
3y

Andrew Jinwoo Kim Park Yuha 정승원 이우연Manage
3y

Min Pin 이마무라씨 소환은 아직입니까?Manage
3y

Andrew Jinwoo Kim 김대기 식민지근대화론이 내심 그 명제를 거짓으로 보는거 아닌가요? 18세기부터 조선의 하부구조가 상당히 변한 것은 맞지만, 후진 상부구조가 그걸 따라가지 못해 19세기의 실패로 이어진듯 한데... 조선의 완고한 국가주의 체제와 양반, 선비들에게 뼛속까지 주입된 성리학 이데올로기 때문에 막혔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천주교와 동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아래로부터의 변화의 시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내 체제 내에 수용되지도, 체제를 뒤엎지도 못했죠.
1Manage
3y · Edited

최이영 서평 잘 읽었습니다Manage
3y

정승원 잘 읽었습니다. 역사인식론의 문제 부분이라서 따로 나중에 코멘트 한번 하겠습니다.Manage
3y

Andrew Jinwoo Kim Sangil Baek 요게 마지막.Manage
2y
서평 - <The Japanese Colonial Legacy in Korea 1910-1945: A New Perspective> Part 2
3 May 2015 at 17:46
(이번 서평의 앞 부분 절반은,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데 충실하기보다는 책의 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배경 지식을 소개하고 그를 토대로 이 책을 해설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제강점기의 한국 역사를 주로 '민족'의 관점으로만 파악해 왔다. 민족의 관점은 일제강점기에 존재했던 미시적 영역에서의 진보와 개선을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한다. 또한 식민지 하에서도 근대인으로 실존했거나 그런 선택을 할 기회가 있었던 조선인들의 이야기(개인의 관점)가 반영되지 못하며, 계급과 여성과 소수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보는 작업 역시 묻혀 버린다. 정말로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볼 땐 반드시 '민족'의 관점을 다른 모든 관점들보다 우선해야 하고 우위에 두어야 하는 걸까? 계급의 관점, 여성의 관점, 소수자의 관점, 개인의 관점은 민족의 관점에 비하면 하위로 취급되는 것이 마땅할 만큼 중요하지 않은 걸까?
그렇다면 잠시 한국의 흔한 민족주의 사관에서 말하는 일제강점기의 서사를 살펴보자. 민족주의 사관에 따르면, 일제는 조선에 근대적 인프라스트럭쳐를 일부 구축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철저히 조선의 물자를 빼앗아 일본으로 수송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그러면서 조선인들의 복지에는 냉담했고 조선인들을 교육과 취업에서 철저히 차별했다. 총독부와 경찰은 걸핏하면 얼토당토 않은 트집을 잡아 조선인들을 잡아 가두거나 괴롭혔고, 많은 수가 날조된 혐의로 공정한 재판 없이 처벌을 받고 고문을 당했다. 민족 운동과 독립 운동은 이러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반발로서 일어난 것이며 일제 자본주의 하에서 착취받던 농민과 노동자 등 기층민중은 철저히 이 운동에 동조했다. 조선인들은 모두가 일제의 (직접적인) 피해자였으며, 계급과 젠더를 초월하여 반제 투쟁에 같은 뜻을 가졌다.
그러나 민족주의 사관의 이 서사 - 해방 이후 한국인들이 학교에서 교육 받은 역사 - 는 상당 부분 거짓이며 일부의 사례를 부풀려 말한 것이라 할수 있다. 먼저, 적어도 일제 초기의 민족주의 운동은 철저히 엘리트 지식인들의 전유물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민족 운동은(적어도 최초 기원으로만 보면) 절대로 일제의 탄압이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반발로서 등장한 자연발생적인 투쟁이 아니었다. 이미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기 전부터도 이런 식의 엘리트 반일 운동은 많이 존재했다. 흔히 의병이라 부르는 무장투쟁이 최초로 발생한 건 을미사변 직후인 1895년의 '을미의병'이다. '국모' 명성황후가 일본 측 자객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한 꼴을 보고 분노한 양반들과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일 무장투쟁으로서, 철저히 엘리트 중심적이었고 조선 국가와 조선 왕실에 대한 충성심에 기반하여 일어난 무장운동이었다. 이들의 정신적 지주는 흥선 대원군이었으며 척사파-소중화주의 사상을 기저로 둔 반동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후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1907)에 이은 '정미의병'과 '서울 진공 작전'과 같은 민족주의 무장투쟁들도 일반 서민들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망해 가는 구체제 엘리트들의 자존심에 기반한 면이 컸다. 1910년대까지도 양반이 아닌 출신의 의병장은 신돌석 정도가 유일했고, 상민이나 천민 출신은 의병 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지 못했다.
조선의 일반 농민들은 자신들을 실컷 쥐어짜다가 무능으로 망해 가는 나라를 구하는 일에 냉담했다. 개항 이후 국제 무역의 확대와 갑오경장 이후의 근대적 제도 정비에 힘입어 새로운 시대의 승자가 되어 가던 상인들과 지주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혈통 때문에 구체제 엘리트들에게 괄시받으며 살았던 이들에게는 오히려 일본 같은 근대 국가가 자신들의 삶의 기회를 넓혀주는 존재였다. 조선의 과거 시험은 명목상 실력주의적인 제도였지만,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일반 농민들이나 상인들이 이 시험을 준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 근대 자본주의의 도입은 여전히 좁은 문이긴 했지만 상민, 천민 출신들에게도 출세의 기회가 주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조선총독부가 조선인들에게 아무 원칙도 없이 마구 횡포를 부리는 전제(despotism)를 실시했던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은 이미 1부에서 이야기했던 바 있다. 1부에서도 말했듯이 개별 관료와 경찰관의 권한 남용인 경우를 제외하고 식민 체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평범한 조선인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다만,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은 철저한 탄압의 대상이었다. 반체제 혐의자들의 경우엔 고문을 얼마든지 할수 있었고 처벌도 일반 범죄자들에 비해 가혹했던 게 사실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아나키즘, 생디칼리즘 등의 급진적 운동이 가혹한 탄압을 받았던 건 일본 본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나는 이러한 탄압을 받은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고초가 가볍다거나, 그러한 이들이 일본과 조선의 대다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본 제국 체제가 정당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서사가 그 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인 양 비춰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급진적 반체제 운동이나 독립 운동에 투신했거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사람들의 비율이 조선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낮고, 또 그러한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의 절대다수가 양반이나 유생 출신, 종교 지도자,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과 같은 이른바 식자층이었다. 계급적으로 봐도 자본가, 지주, 상인, 화이트칼라 출신들이 많다. (물론 이 계층의 사람들 중 결코 적지 않은 수가 체제 친화적이었고 일제 말기에 이르러서는 적극적인 체제 홍보 및 찬양 활동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책에서는 일본 정가의 거물 하라 케이가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응을 세 계층으로 나누어 파악했던 바를 보여준다. 하라 케이가 보기에 조선의 상층부는 식민통치에 대해 격렬한 반감을 표하면서도 내심 일본 사회와의 동화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고, 하층 사람들은 일본의 정책들에 만족했다. 소수의 중간층 그룹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탓에 불만이 컸다고 평했다.
한편 이 책은 조선의 민족주의 운동이 종교계와 결부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한다. 민족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종교는 크게 넷이다. 우선 망한 조선에 대한 충성심과 복고주의로 정신무장한 유교가 있다. 그리고 민족주의를 통해 성장을 도모한 천도교(동학의 후신)가 있다. 또 애초부터 교리 자체가 단군을 신으로 모시는 민족적 종교(ethnic religion)인 대종교가 있다. 대종교는 마치 유대교와 비슷한 선민의식을 중요한 축으로 삼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방 이후 민족주의 서사를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개신교가 있다.
네 가지 종교 중 개신교를 제외한 셋은 반근대주의적인 면모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일본 제국이 제공하는 어떠한 근대문명의 이기도 조선인들의 이익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실제로 오늘날 한국의 극렬 민족주의자 그룹에서는 이들 종교와 이들에게서 파생된 계열 종교의 영향력이 상당하다. 이들은 해방 이후 자신들의 틀로 인식한 일제강점기의 서사를 사회 일반에 보급하고 대한민국의 교과서에 집어넣는데 애썼다.
개신교의 경우는 데라우치 총독 시절부터 집중적인 탄압을 받았고 이후에도 제암리 교회 학살 같은 여러 수난사를 겪는 등 조선인들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이고 정도가 심한 일본 제국 체제의 피해자 집단이었다. (물론 개신교는 서양인들과의 연계가 있었기 때문에 단 한 건이라도 조선총독부의 탄압이 있으면 타 종교에 비해 곧바로 해외로 알려져 뉴스화될수 있었다는 면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 내지에서 다양한 교파의 개신교가 그럭저럭 용인되다가 1930년대 후반 이후에 관제화되는 정도였던 것과는 대조적인데, 아쉽게도 이 책에 그 이유까지는 나와 있지 않다.
또한 책에서는 민족주의 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이 받았던 극심한 탄압과는 대조적으로, 형평 운동이나 여성 운동과 같은 다른 사회 운동이 일제 하에서 충분히 용인되었다는 점을 언급한다. 이 부분에서는 자유주의 운동, 평화 운동, (비사회주의적) 노동 운동 등이 얼마든지 허용되었던 일본 본토의 기준이 조선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형평 운동에 대해 총독부는 철저히 중립을 지켰고 백정 출신을 차별하는 관습의 문제를 철저히 조선인들의 여론에 맡겼다. (책에 직접 서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 추측으로 백정 출신을 서류상에 특수한 표시를 함으로서 차별을 했던 제도는 아마도 조선의 관습을 어느 정도 존중하자는 점진주의 기조에서 나온 정책인것 같다.)
그리고 일제 시기 농민 쟁의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 신기욱의 논문을 인용하여, 조선총독부가 철저히 지주들의 이익만을 대변했다는 그동안의 통념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신기욱의 논문 <Peasant Protest and Social Change in Colonial Korea>(1996) 에 따르면, 총독부는 이미 1920년대부터 농촌 지역민들의 생활 악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고, 1932년에는 '소작중재령'을 공포하여 소작농들의 처우를 개선코자 한다. 또 1934년에는 '농지령'을 공포한다. 신기욱에 따르면, 소작농들은 그전까지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던 정식 계약서 작성권을 확고히 보장받았고 소작료의 인하를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조선에서 지주들의 수는 점차 줄어들어 종전 직전에는 거의 없다시피한 수준이 되었고 이들은 산업 자본에 투자하게 될 동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 신기욱의 해석이다. 다만 토지세를 올리는 등의 일부 조치들은 자영농에게도 타격을 주었다.
한편 저자들에 따르면, 한국의 민족주의 사관에 힘을 실어주는 다른 요인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일본의 마르크스주의 사학계다. 일본의 마르크스주의 사관은 1930년에서 1945년까지의 일본 사회를 파시즘으로 정의하고, 군부에 의해 법치주의가 훼손된 참담한 시기로 묘사한다. 그러나 저자들은 이것 역시 반박하면서 반례로 1930년대 일본 농촌에서 일어난 일들의 경과를 소개한다. 사실 일본의 농촌도 그리 사정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는데, 군부가 일본 정치의 실권을 쥐었던 1930년대에 조선에서와 같이 농촌 진흥 사업이 벌어진다. 그때까지 일본의 농촌에서는 촌로를 비롯한 마을 세력가들의 힘이 막강했는데, 일본 정부는 그들을 견제하고 자영농과 소작농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간 규모의 자영농 및 소작농들의 조직과 긴밀히 협력했다. (책에서는 이들을 "whole-village group"으로 칭한다.) 일본 정부가 사가 평원에서 관개 사업을 시행했을 때, 관료들은 현지 농민들과의 협업에 많은 공을 들였다. 관료와 연구자, 농민 단체들 사이의 힘의 균형을 중시했고 이 세 집단은 농업 기술의 발달에 도움이 될만한 각자의 노하우를 서로에게 조언하고 전수함으로서 중농과 소농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촌의 근대화를 이루어 냈다. (이상의 내용은 Penelope Francks의 <Technology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in Pre-War Japan>에서 저자들이 인용)
지금까지 나는 이 책이 주장하는 일본 제국의 모더니티가 조선에 가져온 긍정적인 면들에 대해 썼다. 다음 번 서평에서는 내가 본 이 책의 한계들에 대해 쓸 예정이다. 그럼 기다리시라~~!
LikeShare
22You, Park Yuha, 서윤 and 19 others
6 shares
21 comments
Comments
View 2 more comments

Andrew Jinwoo Kim Park Yuha 서윤Manage
3y

Park Yuha 대체적으로 동의. 특히 개신교와 좌파가 해방이후 저항담론의 주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관순 이야기도 해벙이후 세번이나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보급되었는데 이화가 개신교학교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겠습니다.
요는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반체제파가(좌파)가장 억압당한 사람들이었고 그런 억압은 한반도에 살던 일본인도 똑같이 받았구요. 그러다 보니 좌파에겐 저항의 기억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오늘의 반일담론을 진보가 맡고 있는 것도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지요.
문제는 좌파였어야 할 노비계급에서 신분을 벗어나고자 창씨개명을 해서 먼저 친일파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모순을 같이 봐야겠죠.
4Manage
3y · Edited

서윤 잘 읽어봤습니다. 하라 케이가 여기서도 인용되는 모양입니다. 일본이 통감정치기(1890년대-1910년)에 조선병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조선이 대만과는 달리 상당한 정도의 국가체제와 문화적 특수성, 그리고 집단 정체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그리고 조선의 지배층과 재지양반층, 기층민줄이 느끼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온도차를 감안했다는 증거가 많습니다.
위에 박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그렇게 고민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See more
1Manage
3y

Andrew Jinwoo Kim 희수 아, 이 부분에선 '체제'라고 표현하기보다, '행정당국'이라고 표현했어야 했던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일본제국은 적어도 명목상으로나마 법치주의에 근거하여 통치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이 책을 비롯해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의 연구는 일제의 수탈이 결코 조선시대보다 심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Manage
3y

김대기 희수
이게 참......See more
2Manage
3y

김대기 역사수정주의에 대해 좀더 이야기하면
홀로코스트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만...See more
2Manage
3y

Supura Doyoda 나누는 말씀들을 보고 있으니 이런 생각도 듭니다. 5.16이후의 극단적 반공교육이 파산한 결정적 증거로 80년대 학생운동권의 주도권을 차지하다시피한 '주사파'를 들 수 있겠습니다. 유신체제하, 70년대 초중고 교육을 받은 이들은 빨갱이는 모두 뿔달린 악마라는 식의 극히 비현실적이고 유치한 반공교육에만 물들어 있다가 대학입학과 동시에 갑자기 다양한 관련 '팩트'들에 노출 됩니다. 여기서 일종의 착시가 일어날 수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최악의 지옥에서...See more
3Manage
3y

김대기 Supura Doyoda
전문용어로
빠가 까를 만든다.
혹은
까가 빠를 만든다.
라고 할수 있지요.
번증법이 합으로 이른다는 것은
이상적 모델일 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3Manage
3y · Edited

Supura Doyoda 급동의 합니다! 언제나 직관에 빛나는 표현력을 보여주시네요. ^^ 그런 좋은 예로 떠오르는 인물은 통신시절부터 떠들썩했던 김완섭씨같은 분을 들 수 있겠습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A%B9%80%EC%99%84%EC%84%ADManage
김완섭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KO.WIKIPEDIA.ORG
1
3y

김대기 논리나 이성같은걸 싹 접어치우고 본능만으로 말하자면요,
가장 열성적인 신자는 개종한 자들이며...See more
1Manage
3y

Supura Doyoda "가장 열성적인 신자는 개종한 자들이며 한번 배신한 사람은 두번도 배신한다."
아. 생각해보니 테무진 역시 님과 생각을 공유했던 옛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상관을 배신한 적장의 부하를 참수하죠. ^^;
1Manage
3y · Edited

Andrew Jinwoo Kim 저는 두번이나 전향했으니 모두에게 죽일놈이겠군요 ㅋㅋ
1Manage
3y

Supura Doyoda 차마 '좋아요'는 못 누르겠습니다. 웃자고 하시는 말씀에 과도하게 진지한 댓글을 달게 됩니다. 수많은 사상가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일편단심 하나의 '이념'에만 일관되게 열광한 사람들은 단언컨대 단 한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유주의, 아나키즘, 맑시즘 등등의 여러 이념의 숲을 헤매고 때때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것만으로도는 '배신'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생산적인 방황과 극단적인 해악의 경계는 뜻밖에 흐릿하지만, 중심을 잡고 있는 마음새가 아집보다 진리추구 쪽에만 있다면 더더군다나 '배신'이랄 수 없는 것이죠.
2Manage
3y

김대기 Andrew Jinwoo Kim
테무진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테무진은...See more
2Manage
3y

김대기 Supura Doyoda
옳은 말씀이십니다만...See more
2Manage
3y

Supura Doyoda 다소 과격한 주장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헤겔이 자신의 시대를 관통하는 여러 역사적 사태에 대하여 보인 반응들이나 이광수가 독립운동과 친일협력을 오갔던 것 등등은 각각의 옹호자나 반대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됩니다. (이광수의 경우 스스로 부끄러워했으니 옹호자들을 머쓱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역사적 격랑 속에서 어차피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말씀하...See more
2Manage
3y

김대기 개인적인 생각이고 조금은 맥락이 다른 이야기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지식인'이라는 부류에 대해 너무 관대해요....See more
2Manage
3y

Andrew Jinwoo Kim 때때로 진리탐구자는 외로운 처지를 감당하는 것을 진리탐구자가 되는 댓가로 여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윤님과 미선씨 앞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서부를 떠돌아다니는 외로운 총잡이 같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어려움에 처한 마을을 악당들로부터 지켜주고 도와주지만 박수받을 때가 되면 미련없이 떠나야 한다는 거... 더 머무르면 마을 사람들이 쫒아내므로... ㅋㅋ
3Manage
3y

Andrew Jinwoo Kim Sangil Baek 혹시 못보셨으면...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 의견 부탁드립니
----------------
 Sejin
SejinHome
Friend requests
Messages
1Notifications
Account Settings
서평 - <The Japanese Colonial Legacy in Korea 1910-1945: A New Perspective> Part 3
5 May 2015 at 18:35
이 책은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일제시기의 여러 실상들에 대해 밝히고 있지만, 이 책에서 미처 못 다루는 점들도 있다. 또, 종종 주장을 펴는 도중의 빈틈이 보인다. 이 책은 약 20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얇은 책이지만, 다루는 주제는 매우 광범위하다. 그러다 보니 한 주제에 대해 세밀하게 파고들지 못한 채 결론을 지어버리는 경우가 발견된다. 특정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지나친 비약이 보이는 부분도 조금 있다.
우선 저자들은 일본의 조선 통치가 온건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흔히 가혹했던 시기로 알려진 1910년대의 '무단통치' 시기나 1930~1945년 시기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3.1운동 이후의 더욱 온건해진 '문화통치' 시기의 업적을 조명하는 등 약간 앞뒤가 안맞는 구석을 보인다. 1910년대나 1930년대의 통치가 충분히 온건했다면, 왜 굳이 문화통치를 또 끌어와 일제의 온건성을 강조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었다. 일제의 온건성을 강조하기 위해 유리한 사실들과 논거들을 집중적으로 수집해 이용한다는 의심을 살 위험조차 있어 보인다.
그리고 1910년대의 일제의 통치가 민족주의 사관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온건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온건성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 사이에 불만이 적지 않았다는 점과 그 불만이 3.1운동 같은 대규모 봉기로 이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이 충분치가 않다. 물론 학교 교사가 칼을 차고 수업을 했던 일이나 집집마다 총독부 관료가 방문하여 위생검역을 실시한 게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간섭으로 받아들여져서 조선인들의 반감을 샀던 점과 같은 몇몇 사례들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조선인들 사이의 그 불만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미흡한 느낌이다. 분명 조선의 기층민중이 일본이라는 새로운 통치자에게 걸었던 일말의 기대감이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으로 바뀌었던 다른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은 민족의식보다는 일제당국의 무능함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또한 저자들은 식민지 모더니티와 현대 한국의 산업화 및 민주화 사이의 '연속성'을 주장한다. 그 과정이야 어쨌든, 식민지에 보급되었던 모더니티가 결과적으로 훗날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 이 주장은 너무 나간 것으로 보이며, 책에서 그 '연속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들도 매우 부실하게 제시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식민지 모더니티의 유산은 해방 후의 혼란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 단절되었다고 본다. 저자들은 내 생각을 반박할 만한 논리를 거의 내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일본제국의 법치주의와 한국, 타이완의 민주화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무리수까지 둔다. 그걸 뒷받침한답시고 저자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더 가관이다. 오늘날 중국의 사례를 갑자기 가져와서는 일본제국의 법치에 근거한 통치를 경험해 본적이 없는 중국의 정치가 얼마나 후지고 권위주의적인지를 보라고 주장한다. 정작 한국과 타이완에 일본제국의 법치주의, 자유주의 정신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도 서술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저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식민지근대화론이 갖는 한계들에 대해 알아보자.
식민지근대화론 자체의 이론적 한계도 있고, 식민지근대화론이 사용하는 연구 방법론들의 한계도 있다. 연구 방법론의 문제점들을 먼저 보겠다.
첫째, 통계 중심주의가 갖는 한계다. 이 책의 저자들을 비롯하여, 이 책에서 인용한 많은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의 연구는 통계 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그러나 통계가 그 사회의 실상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통계를 산출하는 방식이 현실에 안 맞는 경우도 있을수 있고(예를 들어 오늘날 한국 정부가 공식적인 실업률을 산출하는 방식처럼) 표면적, 1차원적 설명을 뛰어넘는 입체적 분석이 어려운 경우(예를 들면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규모 투자를 하느라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지만, 그것을 메울만한 세수가 부족했던 게 조선의 경제가 불황이어서였는지 감세 정책이나 탈세 때문이었는지를 알수가 없다)도 있다.
게다가, 일제시대의 통계 자료들은 대부분 macro 차원에서의 수치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서 micro 차원의 분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경제 성장률 자체는 꽤 높게 나와도 늘어난 부가 어디로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알수가 없어서 실제 사람들의 생활형편이 어땠는지 알수 없는 경우와 같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동안 총독부의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매년 상당한 폭(5~10%)으로 증가했지만, 그 돈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보건.의료 인프라가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집중된 것은 아닌지와 같은 의문점들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또, 조선총독부는 철도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는데 그 철도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나 사업체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수 있었는지, 철도가 들어선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알 수 없다. 초등 교육이 많이 보급되었다지만 실제 학생들에 대한 처우나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교과서나 학용품, 기자재 등의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부담되었는지도 더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인 기업가, 자본가들이 늘어났다지만 사업 관행에서 비공식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는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
둘째, 공문서 중심주의가 갖는 한계다. 물론 공문서의 사료적 가치를 사문서나 구술, 비문서 사료에 비해 높게 평가하는 것은 역사학 연구의 일반적인 원칙이므로 이것 자체를 비난할수는 없다. 그러나 공문서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것을 작성한 해당 기관, 그리고 기관 내에서도 상위직에 있는 이들의 이해를 반영할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다. 예를 들어 한 백년 뒤쯤 우리의 후손들이 2015년의 한국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공문서를 중심으로 연구한다고 치자. 박근혜 정부의 시각이 담긴 공문서만으로 2015년 한국의 전체 정세를 판단하는 건 말도 안 되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조선총독부나 일본 정부가 문서에 내세우는 온건한 정책기조가 혹시나 '말로만'에 그쳤던 것은 아닌지, 하위 실무자들에게 충분히 그 취지가 전달이 안되서 조선인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던 것인지 등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가 하면 식민지근대화론이 담고 있는 전제 자체도 비판을 받을수 있다. 일단 이 이론은 근대화와 모더니티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론이다. 모더니티가 전근대에 비해 생산력의 증가,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 형벌의 세련화, 일상생활의 편리함, 위생 조건의 개선과 같은 긍정적인 것들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모더니티의 특징들은 서구의 맥락에서 나온 것인데 비서구 사회가 만일 서구의 침략을 받지 않아서 모더니티를 이루지 못했다 한들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사회를 변화(evolution)시켜 나갈수 있었을 것이다. 또 모더니티가 가져온 새로운 형태의 폭력들이 일으킨 해악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첨언하자면, 과학지상주의와 자유주의에 바탕한 단선적(linear) 세계관으로 역사를 설명하는 식민지근대화론의 함정은 역시 단선적 사관을 갖는 마르크스주의 사관으로는 극복할수 없다.
이 책을 통해 나는 일제강점기가 그동안 한국인들이 흔히 배워왔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실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러나 모더니티의 혜택이 과연 조선인들의 대다수가 그것을 체감할수 있을 만큼 널리 퍼졌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또한 물질적 이기와 편리함이 각각의 사람들과 한 사회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말할수도 없기에, 이제부터의 역사 연구는 각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과 인권이 얼마나 중시되었는가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교훈을 새삼스레 다시 새긴다. 2부에서 밝혔듯이 계급, 여성, 소수자, 개인의 관점으로 보는 역사관이 민족주의 사관과 식민지근대화론 모두를 극복할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 본다. 이것으로 본 서평을 종료한다.
LikeShare
22You, 서윤, Okjin Park and 19 others
5 shares
9 comments
Comments
View 1 more comment

서윤 잘 읽었습니다. 좋은 서평이네요. 특히 이 글에서의 비판이 정말 좋습니다. 비판의 정석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의도를 함부로 남겨 짚으며 비난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점은 정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무단통치기와 문화통치기 사이에서 연속성을 온건함으로 찾으려 했다면... 좀 터무니없군요. 그 연속성은 제 생각엔 오직 "모순"뿐이거든요. 무단통치 이전부터 조선의 특수성을 대만과는 분리해 생각했으면서도 실제로는 법 적...See more
5Manage
3y

김대기 서평과 직접 관련도 없고
사실 가정이란건 무의미한 이야기긴 하지만
한가지 금기를 털어봅시다....See more
1Manage
3y

Andrew Jinwoo Kim Park Yuha 정승원 이우연Manage
3y

Min Pin 이마무라씨 소환은 아직입니까?Manage
3y

Andrew Jinwoo Kim 김대기 식민지근대화론이 내심 그 명제를 거짓으로 보는거 아닌가요? 18세기부터 조선의 하부구조가 상당히 변한 것은 맞지만, 후진 상부구조가 그걸 따라가지 못해 19세기의 실패로 이어진듯 한데... 조선의 완고한 국가주의 체제와 양반, 선비들에게 뼛속까지 주입된 성리학 이데올로기 때문에 막혔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천주교와 동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아래로부터의 변화의 시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내 체제 내에 수용되지도, 체제를 뒤엎지도 못했죠.
1Manage
3y · Edited

최이영 서평 잘 읽었습니다Manage
3y

정승원 잘 읽었습니다. 역사인식론의 문제 부분이라서 따로 나중에 코멘트 한번 하겠습니다.Manage
3y

Andrew Jinwoo Kim Sangil Baek 요게 마지막.Manage
2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