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은중경
| 불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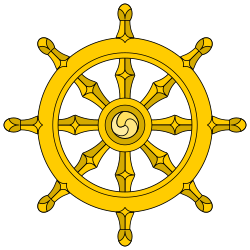 |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 T.2887) 또는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은 부모의 은혜의 높고 넓음을 가르치고, 이에 보답할 것을 가르치는 대승불교 불경이다.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으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중국을 거쳐 전래되면서 유교적 효를 배척하지 않고, 불교적인 효도를 설한 경전이다. 한국, 중국, 일본에 널리 퍼져 있으며 한국에서는 유교가 성행하던 조선 시대에 널리 읽혀졌으며, 삽화를 곁들인 언해본 출판도 성행했다.
성립 시기가 확실하지 않고, 유교의 사상을 강조하기 때문에 위경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이미 기원후 2세기 안세고가 번역한 불설부모은난보경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1]
내용
[편집]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무더기의 뼈를 보고 절을 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어,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하는 10개월 동안의 태아의 상태를 생태학적으로 설명하고, 부모의 10대 은혜, 은혜를 저버리는 불효한 행동, 부모님의 은혜 갚기의 어려움, 불효한 자의 과보, 은혜를 갚는 길을 설명하고 있다. 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 유교의 효경은 효도를 강조하지만, 부모은중경은 은혜를 강조한다.
===
“부모은중경 위경 아니다”
인터뷰 입력 2004.08.10
문헌정보학자 송일기 교수 주장
효에 관한 대표적인 경전인 《부모은중경》(이하 은중경)이 위경(僞經)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송일기 교수〈사진〉는 최근 《한국서지학》 제19집에 발표한 ‘한국본 《부모은중경:한문》의 판본에 관한 연구’란 논문을 통해 “은중경은 인도불교가 중국화하기 위해 전통사상인 유교·도교와 타협한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
송 교수가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완성한 이 논문은 총 77종(30여 종은 새로 발굴)의 판본 가운데 한문본 41종을 분석한 결과 “인도에서 찬술된 여러 경전에서 ‘부모에 대한 보은’ 사상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때 은중경의 그 성립도 인도에서 비롯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교수에 따르면 즉 초기 경전인 《선생경(善生經)》을 비롯해 《부모은난보경(父母恩難報經)》, 《우란분경》, 《효자경》, 《목련경》, 《부모은중태골경》, 《열반경》 등에서 보은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러한 현상이 《은중경》의 성립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또한 영국이 최근 공개한 돈황 발견 사본인 《덕은십모자보경(德恩十母子報經)》에 은중경의 핵심인 ‘부모십은(父母十恩)’에 해당하는 유사한 내용이 수록돼 있어 은중경의 모태는 지극히 인도적이라고 밝혔다.
===
仏説父母恩重難報経
(ぶっせつ ぶも おんじゅう なんほう きょう 佛說父母恩重難報經、一般に『父母恩重経』または『父母恩重難報経』ともいう)とは、ひたすらに父母の恩に報いるべきという、儒教的な人倫の教えを説く偽経である。
流布
この経の初見は、経録の「武周録」(『大周刊定衆経目録』)である。また、智昇は丁蘭や郭巨らの孝子の故事を引用した本があったことを記録している(「開元録」)。一方、円仁の「請来目録」によれば、西明寺の体清という僧に『父母恩重経疏』の著書があったことが知られる。敦煌文献中にも数種のテキストが見られ、講経文や讃文もある。日本には奈良時代請来とされるものが、正倉院の聖語蔵中の経典として収蔵されており、古くから日本にも伝わっていたことが知られる。
『大正新脩大蔵経』には、巻16の「経集部3」に後漢安息国の安世高訳『佛説父母恩難報經』が収録されているが、現在流通している『父母恩重経』と比較すると、それは極めて短いテキストである。この安世高訳の初出は道宣の『大唐内典録』である。また、鳩摩羅什訳『佛説父母恩重難報經』とされるテキストもあり、こちらは、流通しているテキストとほぼ同じであるが、安世高訳本と同様、後世の仮託と考えられる。このように、本経が記録上に現われるのは、全て唐代の事であり、現在のところ、六朝代の記録には見ることが出来ない。
しかし、中国では宋代の大足石刻中に、父母恩重経の変相図を表現した造像が残っている。また、日本でも江戸時代に父母恩重経の内容を分かりやすく解説した対俗教化のための書物が盛んに出版されており、日中にかかわらず広く受容され、仏教の一般への教化啓蒙の一翼を担っていたことが知られる。その後、近代の文献学の発展とともに、その成立史的な面からも儒教色を濃厚に帯びた内容的な面からも、中国撰述の偽経であると認められるようになった。
===
불설부모은중난보경
불설 부모 은중난 보경 (부세츠부모 온쥬 난호 쿄 불환부모 온중난보경, 일반적으로 『부모 은중경』 또는 『부모 은중난 보경』이라고도 함)이란 오로지 부모의 은에 보답 해야 한다는 유교 적인 설 .
유포
[ 편집 ]이 경의 첫견은, 경록 의 「 무주록」(「 대주간정중경목록 」 ) 이다 . 중경 희 의 저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 다이쇼 신겨 대장경 '에는 권 16의 '경집부 3'에 후한 안식 국 의 안세 고역 '불설 부모 은난 보석'이 수록되어 있지만 현재 유통되고 있다 『부모은 중경』 과 비교 하면, 그것은 매우 짧은 텍스트이다 . 『불설부모은중난보석』이라고 하는 텍스트도 있어, 이쪽은, 유통하고 있는 텍스트와 거의 같지만, 안세 고역책과 같이, 후세의 가탁 이라고 생각 된다 .
그러나 중국에서는 송대 의 대족석각 중에 부모은중경의 변상도를 표현한 조상이 남아 있다. 또, 일본에서도 에도 시대 에 부모은중경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한 대속교화를 위한 책이 활발히 출판되고 있어, 낮에도 불구하고 널리 받아들여져, 불교의 일반에의 교화 계몽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던 것이 알려져 있다. 그 후 근대 문헌학의 발전과 함께 그 성립사적인 면에서도 유교색을 농후하게 띤 내용적인 면에서도 중국 철술의 위경이라고 인정 받게 되었다.
도교의 『부모은중경』
[ 편집 ]어머니에 의한 탁아 출산과 유포양육의 은을 상세히 설명하고, 효양의 실천을 설하는 것으로 알려진 '부모은중경'은 불교와 도교 각각 과 유사한 내용의 경전이 존재 한다 .
- 『태상로 군설보 부모 온중경』
- 『현천상제설 보부모은 중경』 보은의 사상적 의의를 전하는 것, 명대 전후에 성립
- 『다이치 신이치보 부모 온중경』 효행의 방법이나 설재(재계를 수리하는 것)・비경 등을 구체적으로 설 명하는, 명대 전후에 성립
개요
[ 편집 ]부모의 대은을 다음과 같이 십종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그 은에 보답하기 위해 불법 의 실천을 촉구한다.
- 회태 수호의 은혜
- 임생신고의 은혜
- 이코 망우의 은혜
- 유포양육의 은혜
- 환건 취습의 은혜
- 세정 부정의 은혜
- 삼키는 달콤한 은혜
- 위조 악업의 은혜
- 원행 추념의 은혜
- 궁수 憐愍의 은혜
본문은 일반적인 경의 형식을 취하고, 부처가 라자그리하의 근처, “독수리의 봉우리”라고 불리는 야마나카(霊鷲山)에 있을 때 많은 출가 , 재가의 불제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말했다고 한다.
아버지에게는 자비의 은혜가 있고, 어머니에게는 슬픔의 은혜 가 있다 . 몸을 어머니의 태내에 맡기는 것이다. 이 인연을 갖기 때문에 비모의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세간에 비하는 것은 없고, 그 은은 아직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앞에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설명한다면, 다음의 십종의 은덕이 있다.
- 회태 수호의 은혜
- 처음으로 아이를 체내에 받고 나서 10개월 동안, 고뇌의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원하는 마음도 태어나지 않고, 단지 일심에 안산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뿐이다.
- 임생 수고(린쇼쥬쿠)의 은혜
- 출산 시에는 진통 으로 인한 고통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 생코망우(쇼시보유)의 은혜
- 출산 후에는 부모의 기쁨은 한정되지 않는다. 그때까지의 고통을 잊고, 어머니는, 아이가 소리를 내며 울었을 때, 자신도 처음으로 태어난 것 같은 기쁨에 물든 것이다.
- 젖 포양육(뉴호요이쿠)의 은혜
- 꽃같은 안색이었던 어머니가, 아이에게 우유를 하고, 키우는 가운데 몇 년간에 참석해 버린다.
- 환건 취습(카이칸지츠시츠)의 은혜
- 물 같은 서리의 밤도, 얼음 같은 눈의 새벽에도 마른 곳에 아이를 잠들게 하고, 젖은 곳에 스스로 잠을 든다.
- 세관 부정(센칸후조)의 은혜
아이가 후처나 의복에 뇨도, 스스로의 손으로 씻어 헹구고, 냄새를 가리지 않는다.
- 嚥苦吐甘 (혜택 캔)의 은혜
- 부모는 맛없는 것을 먹고, 맛있는 것은 아이에게 먹이게 한다.
- 위조 악업 (이조 아쿠고)의 은혜
- 아이를 위해서는 멈출 수 없고 악업을 하고 나쁜 곳으로 떨어지는 것도 달콤하다.
- 원행 추념 (온조 오쿠넨)의 은혜
- 아이가 멀리 가면, 돌아올 때까지 46시 중심 배치한다.
- 竟竟愍 (갓끈 영) 은혜
-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 고통을 일신에 맡기려고 하고, 사후에도 아이를 지키고 싶다.
이 부모의 은혜의 무거운 일은 하늘에 극단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성장해 타가의 여성과 결혼하면 자신들의 방에서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즐기며 점차 부모를 어지럽게 떠난다.
굳이 부탁을 하면, '늙어서 언제까지나 살아 있는 것보다는 빨리 죽는 편이 낫겠지'라고 화내고 매달린다.
부모는 이것을 듣고, 원한, 혹, 슬픔의 너무 '아, 너는 누구에게 길러졌을 것이다, 내가 없었다면 누구에게 자랐을 것이다, 그것인데 지금이 되어서는 이런 눈에 맞춰야 한다. 너를 낳았지만, 차라리 너 등 없었던 편이 좋았다」라고 외치는 것이다.
만약 아이로 하여 부모에게 이런 말을 발하게 했다면, 신불의 힘에 매달릴 수도 없고, 아이는 그 말과 함께 지옥, 아귀, 축생 속으로 타락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찬양을 섞어 말하게 한다 .
구도자의 보은
[ 편집 ]효양을 한다는 것은, 출가 , 재가 를 묻지 않는다. 만약 밖에 나와 계절에 있던 맛있는 과일 등을 얻었다면, 가지고 돌아가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다. 빨리 먹는 것은 참을 수 없고, 우선 이것을 삼보 에 둘러싸고 감사하거나 베풀어 준다면, 즉 무상 에 올바른 길을 요구하려고 하는 마음( 보리 마음)이 떠올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병이 있으면 그 바닥 근처를 떠나지 않고 친하게 스스로 간호해야 한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만약 부모가 완고하고, 도리에 정도, 삼보를 봉사하려고 하지 않고, 사려깊은 마음이 없어서 사람을 해치고, 불의를 가서 물건을 훔쳐, 예의 없이 색욕으로 삼키고, 신용 없이 사람을 좌절하고, 지에 쑥스럽게 술에 빠져 있다면 자) 그런 행위에서 깨닫게 해야 한다. 만약 그래도 다시 바꿀 수 없다면 울고 눈물로 자신의 음식을 거절하고 그렇게 하면 어려운 부모라도 아이가 죽을 것을 두려워 은애의 정에 끌려 강하게 견디겠다.
만약 부모가 마음을 바꾸면, 가족 모두가 은혜의 은혜를 받고, 십방의 신불선남선녀에게 이 부모에 대해 경애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고, 어떤 나쁜 존재도 이 부모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현세에 있어서는 평화롭게 온화하게 지내고, 나중의 세상에는 선한 곳에 태어나 불을 보고 법을 듣고 오랫동안 고통을 둘러싼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부모를 위해 사치스러운 생활을 마련하면 좋은 것은 아니다. , 예의 바르게 몸을 지키고, 온유한 마음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노력하고 덕에 속이고, 항상 마음을 조용히 진정하고, 학문 에 뜻을 격려하는 것이라도, 불도를 걸지 않으면, 혹시, 유혹에 지고 타락해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출가자는 독신 으로, 그 뜻을 청결하게 하고, 유일한 불도 에 맡겨라. 잘 고려해, 효양의 경중 완급을 알아야 한다.
대략 같은 것이 부모의 은혜에 보도하는 것이다.
매듭
[ 편집 ]위의 설법 후 아난다는 눈물을 흘리며 가르침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여 석존은 '부모 은중경'이라며, 한 번이라도 독서하면 유포의 은혜에 보도하게 된다고 말하고, 또 만약 일심하게 이경을 염두에 두고 다른 사람도 이 경을 염려하게 하면 그런데, 이 사람은 자주 부모의 은혜에 보도하게 되어, 일생의 사이에 만든 십악의 죄, 오역의 죄, 무간 지옥 에 타락하는 중죄도 모두 소멸해, 무상도 (최고의 사토리의 경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때, 범천 , 제석천 , 제천 , 인민, 여기에 모인 모든 자가 이 설법을 듣고, 일과 같이 보리심을 일으켜, 오체를 땅에 던지고, 눈물을 비처럼 흘려 기뻐했다.
경제에 대해
[ 편집 ]대장경에 수록되어 있는 본경의 명칭은 『불환부모 은중난보석 姚秦三藏法師鳩摩羅什奉詯譯』이다.
주·출처
[ 편집 ]- ^ 마스오 신이치로, 마루야마 히로시 (2001 년 5 월 1 일). 도교 경전을 읽는다 . 대수관 서점
관련 문헌
[ 편집 ]관련 서적
[ 편집 ]- 나가타 분 창당 편집부 「부모 온시게이츠」(나가타 분창당, 1953년 , 경절 책)
- 가마타 선상 저 「부모 온시게 강화 : 새로운 부모와 자식 동상의 발견 방송 텍스트」( 묘신지 파포 교사 연맹, 1960년 )
- 마키다 포스케 저 『의경 연구』( 교토 대학 인문과학 연구소 , 1976 년 ) 동 복간
- 히라이 타카히로 『부모 은중경 강화:신시대의 부모와 자식의 길』(타카노야마 출판사, 1978년)
- 타카다 요시카즈 저 「어머니:부모 은중경을 말한다」(카도카와 서점 , 1979년)ISBN 978-4198121495
- 유키 요시후미 『부모은 중경의 이야기』(오오쿠라 출판 , 1986년)ISBN 978-4804330204
- 마츠바라 야스 미치 『부모은 중경을 읽는다』(佼成出版社、2002년)ISBN 978-4333019588
===
같이 보기
Sutra of Filial Piety
| Part of a series on |
| Buddhism |
|---|
 |
The Sutra of Filial Piety (or Sutra on the Profundity of Filial Love, Sutra on Parental Benevolence, Chinese: 佛說大報父母恩重經) is an apocryphal sutra composed in China and apparently an exercise in Buddhist apologetics. It is claimed to have been translated by the monk Kumārajīva.
The text attempts to synthesise native Confucian ideals with Buddhist teachings and was probably produced by Chinese Buddhist monks in imitation of the Confucian Classic of Filial Piety.[1] The sutra seeks to refute Confucian criticism that Buddhism's traditionally monastic focus undermines the virtue of filial piety.
The sutra is still highly popular in China and Japan and in the latter is sometimes used as a focus in Naikan-type introspection practices.
See also
[edit]References
[edit]- ^ Arai, Keiyo (2005). The Sutra on the Profundity of Filial Love. In: Apocryphal Scriptures, Berkeley, Numata Center for Buddhist Translation and Research, ISBN 1-886439-29-X, p.118
Further reading
[edit]- Ch'en, Kenneth (1968). Filial Piety in Chinese Buddhism,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28, 81-97
External links
[edit]- The Filial Piety Sutra The Deep Kindness of Parents & Difficulty in Repaying It
- A translation of one version of the Sutra
- A fully illustrated English version of the Sutra, for children at the Internet Arch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