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6
알라딘: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AI 시대에 인간의 의미 찾기 강국진
미술선진국 발돋움, 텍스트 생산에 달렸다
미술선진국 발돋움, 텍스트 생산에 달렸다
한겨레입력 2024. 1. 5.
이코노미 인사이트 _ Economy insight
미술로 보는 자본주의
 전천후 예술평론가 김남수씨가 2년여에 걸쳐 준비·기획한 전시 ‘물의 왕: 동학과 화엄의 두물머리’ 포스터. 김지하의 말년 사유를 담은 책 <수왕사>를 텍스트로 자신의 사유를 전개하고 이를 참여 작가들과 공유해 제작한 작품들을 한자리에 펼쳐놓았다. 자하미술관 누리집
전천후 예술평론가 김남수씨가 2년여에 걸쳐 준비·기획한 전시 ‘물의 왕: 동학과 화엄의 두물머리’ 포스터. 김지하의 말년 사유를 담은 책 <수왕사>를 텍스트로 자신의 사유를 전개하고 이를 참여 작가들과 공유해 제작한 작품들을 한자리에 펼쳐놓았다. 자하미술관 누리집▶이코노미 인사이트 구독하기http://www.economyinsight.co.kr/com/com-spk4.html
===
미술 칼럼인데 새해 벽두부터 뜬금없이 웬 텍스트인가 싶을 것이다. 미술선진국은 좋은 작품을 제작하는 좋은 작가가 많으면 되는 것 아닌가? 물론 그렇다. 다만 좋은 작품의 기준이 무엇이며, 그걸 누가 정하고 평가하느냐가 문제다. 게다가 제조업에서 보듯이 선진국은 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만드는 방법을 생산하는 나라다.
좋은 미술을 정의하는 담론, 즉 텍스트는 그동안 서구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했다. 그들이 기준을 정했으니 당연히 그들이 좋다고 평가한 작품이 좋은 작품이다. 아무리 작품이 좋아도 우리에겐 발언권을 주지 않아 그들의 평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국내 최고 권위를 지닌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해 국내 대다수 미술상 심사위원에 외국인이 초대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가 정하더라도 그들의 인증을 받아야 국제적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처럼 미술선진국 되기는 작품보다 텍스트의 생산에 달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전시 ‘물의 왕: 동학과 화엄의 두물머리’
2023년 말, 서울 인왕산 자락의 한 미술관에서 열린 작은 전시가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영화, 미술, 무용을 넘나드는 전천후 예술평론가 김남수씨가 2년여에 걸쳐 준비·기획한 ‘물의 왕: 동학과 화엄의 두물머리’라는 전시다. 김지하의 말년 사유를 담은 책 <수왕사>를 텍스트로 자신의 사유를 전개하고, 이를 참여작가들과 공유해 제작한 작품들을 한자리에 펼쳐놓았다. 기획 과정에서 함께 텍스트 읽기에 참여했던 분들의 연계 강연과 퍼포먼스가 이어지고 입소문이 나면서 김지하, 생명사상, 개벽사상, 동학에 관심 있는 인사들이 삼삼오오 전시를 찾았다.
2022년 별세한 김지하는 사실상 한국 근대화를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지식인이다. 근대화 초기인 식민 치하에서 서구문화와 사유를 도입했던 지식인들이 처한 상황과 노력을 국문학자 김윤식은 <이광수와 그의 시대>라는 저술로 그려냈다. 근대화를 스스로 이뤄내는 1960~1990년대, 이에 따른 억압과 폐해를 비판적으로 반성하며 다시 자기에 대해 눈뜨기 시작한 이 시기는 ‘김지하와 그의 시대’라고 부를 만하다. 김지하를 중심으로 선배인 조동일, 후배인 미술가 오윤, 마당극의 임진택, 탈춤의 채희완, 대중가요의 김민기 등 그와 가까운 인물들뿐 아니라 그보다 앞선 신동엽부터 지금의 환경운동과 한살림운동에 이르기까지 한 시대의 사상적 지형을 그의 사유가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김지하는 민주화운동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운동권의 ‘얼굴마담’이었지만 그가 생명사상에 경도됐던 1980년대 신군부 치하에서는 진보 진영으로부터 이미 변심의 의혹을 샀다. 1991년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 ‘죽음의 굿판 당장 걷어치워라’는 변절자로 낙인찍히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후 그의 이름은 2012년 박근혜 지지를 선언했을 때 잠깐 회자했을 뿐 대중에게서 잊혔다. 그래서 막상 그의 장례는 문학계도 문화계도 아닌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졌다. 뒤늦게 이부영을 중심으로 ‘김지하시인추모문화제추진위원회’가 조직되면서 사십구재를 빌려 문화제를 치렀다.
김지하는 ‘오적’을 쓴 시인이자 군사독재에 저항한 민주투사이고, 한국문화를 되살리고 일군 민족적 문화운동가다. 또한 동학을 재발굴하면서 생명과 살림에 관한 사상을 펼친 생명사상가다. 그는 오늘, 바로 지금 가장 뜨거운 화두인 생명사상을 1980년대에 이미 설파했고, 최근 사상적·역사적 의의를 새롭게 조명받는 동학에 평생 심취했다. 한마디로 김지하는 시대를 앞선 사상가로,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될 귀중한 ‘텍스트’다.
텍스트는 생각을 담은 글이다. 인류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한 시대를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 갖춰야 할 생각이 우린들 왜 없었겠는가. 그동안 우리는 앞선 서구를 배우느라 철저하게 서구의 텍스트를 습득하는 데 올인했고, 그러다보니 근대 이후 한국에 사상가가 있었는지를 물을 지경이 됐다. 반면 서구는 매 시기 주요한 사상가들의 계보를 촘촘하게 세워 연구한다. 앞선 사상가를 읽으면서 자신의 사유를 세우고, 그 사유 위에 후학이 다시 자기 사유를 세우는 식으로 연구가 쌓이면 사유는 점점 더 정교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서구는 좋은 사유, 좋은 텍스트가 생산되기 유리한 선순환 구조가 확립돼 있다.
우리의 경우, 수년 전 철학자 이정우가 스승인 박홍규의 사상을 담아 <동일성과 차이생성: 소은 박홍규와 서구 존재론사>를 출간했다. 서구 존재론사를 그리스 철학에서 근대를 생략하고 앙리 베르그송으로 바로 뛰어넘어 축약·정리한 박홍규의 서구 존재론사를 다룬 책이다. 하지만 본인의 생각을 더해, 스승의 사유를 빌려 자신의 사유를 밝혔다. 텍스트는 이처럼 외워야 할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거기에 기대어 자신의 사유를 전개하는 비빌 언덕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서구의 텍스트를 절대적 진리인 양 암기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텍스트와 독자적인 사유, 즉 새로운 텍스트의 생산능력은 방기됐다.
우리 텍스트 읽고 소개해야
이제 우리 텍스트를 알리고 쓰는 작업이 저술과 전시에서 시작되고 있다. 스승의 텍스트를 알리면서 자신의 텍스트를 쓰는 이정우의 저술이나 김지하라는 텍스트를 모티브로 갑오농민전쟁 실패 이후 동학 재정립을 도모하던 당시의 사유를 오늘의 현실을 읽고 헤쳐나가기 위해 소환한 김남수의 전시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마침 홍콩 미술계에서 서울을 방문한 한 연구자가 내게 물었다. 한국문학이나 역사, 문화를 알고 싶은데 중요한 작가나 사상가, 사건 등을 알려달라고 말이다. 나는 한국의 주요한 텍스트로 김지하와 동학이 있다고 말했다. 연구자는 곧바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관련 게시글을 찾아본 뒤 내용이 맞냐고 물었다.
아무리 우리 텍스트를 알리고 싶어도 외부의 관심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국을 향한 외국의 관심이 높은 지금, 우리는 텍스트를 생산하는 나라로 발돋움할 문턱에 와 있다. 그리고 생산은 텍스트를 쓰고 연구하는 일뿐 아니라, 우리 텍스트를 스스로 읽고 소개하는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이승현 미술사학자 shl219@hanmail.net
2024/01/05
Luke Timothy Johnson
Yet, what were we to do with what was apparently a gift from God, given without our asking, given, in fact, despite our greatest fears?
Interspersed with my short stints back at the monastery, the flow of long letters and equally lengthy phone calls continued between 1971 and 1973. We tried to work out <how we could be faithful to God> and <honor what (we were increasingly convinced) God had given us>, and <not do damage to those to whom we were committed>. In the winter of 1972-1973, I left the rectory and moved to a one-room apartment on Chapel street. I set to work on papers petitioning for a dispensation from my vows. My petition was rejected; leaving the monastery meant, in effect, to be excommunicated. Joy's husband had already separated from her, and the process of divorce (on the grounds of abandonment) began. She petitioned the church for an annulment, and that petition likewise was rejected. We were on our own.
Cut off from the tradition that had sustained each of us throughout our lives, we depended even more on each other to make our way forward in darkness rather than light, in ambiguity rather than certainty. In June of 1973, I drove Joy and three of the youngest children to New Haven, where we leased a house near the divinity school on Edgehill Avenue. We began to try to create a life together, because each of our past lives was lost forever. We each would have to figure out <how to seek sanctity divorced from the contexts that had formerly given shape to that most fundamental of quests.>
To call all of this a distraction would be much too dismissive. The gift of Joy's love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my life, and it remained he most important element of my life for forty-seven years until Joy died in 2017.
Joy was, and remained to the end, not only <the singular symbol of God's grace in my life> but <the embodiment of that grace>.
She was for me <"the love of God poure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She taught me what grace was simply by being who she was.
It was not an affectation when I would later declare that everything I knew about grace I learned from Joy.
There is a reason why I dedicated the great majority of my books to her.
Not a distraction. But this new and powerful reality shattered the certainties of my former existence and meant that, from the very start of doctoral work, I labored at scholarship with one figurative hand behind my back. The other hand was always busy trying to stir and discern emotional tea leaves, and trying to deal with the human damage that illicit love (even if holy) can leave in its wake. Joy and I married in early 1974, and our daughter Tiffany was born later that year. I was now a new creation: a husband, a stepfather of six children three of them full ime in the household), and the father of one. I had not finished my PhD, and I was still a long way from having a job that could support this venture.
===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실제로는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겉보기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도원에서 짧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1971년부터 1973년까지 긴 편지와 똑같이 긴 전화 통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존중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1972-1973년 겨울, 나는 목사관을 떠나 (예일 대학 가까이에 있는) 채플 스트리트에 있는 원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나는 (수도승이 되는) 서약(의) 면제를 청원하는 서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만 내 청원이 거부되었습니다. 수도원을 떠나는 것은 사실상 파문을 의미했습니다. 조이의 남편은 이미 그녀와 별거했고, (버림을 이유로)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교회에 무효화 (?)를 청원했지만 그 청원도 마찬가지로 거부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둘만의 홀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를 평생 지탱해 온 전통에서 단절된 우리는 빛보다는 어둠 속에서, 확실성보다는 모호함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서로 의지했습니다. 1973년 6월에 나는 조이와 막내 세 자녀를 데리고 뉴헤이븐으로 가서 Edgehill Avenue에 있는 신학교 근처에 집을 임대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과거의 삶이 영원히 사라졌기 때문에 <함께 삶을 창조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탐구의 가장 근본적인 근본을 형성했던 이제까지의 맥락에서 분리된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을 마음의 혼란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사정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조이의 사랑>이라는 이 선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조이가 2017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47년 동안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었습니다.
--
조이는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유일한 상징>일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구현>이었고,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주었습니다. 내가 은혜에 관해 아는 모든 것을 조이에게서 배웠다고 나중에 선언한 것은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책의 대부분을 그녀에게 헌정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
혼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새롭고 강력한 현실은 나의 이전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산산조각 냈고, 이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박사 과정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한 손을 등 뒤로 한 채 학문 연구에 매진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른 한 손은 감정적인 찻잎을 휘젓고 분별하려고 애쓰며, (심지어 거룩하더라도) 불법적인 사랑이 그 여파로 남길 수 있는 인간적 피해를 처리하려고 애쓰느라 항상 바빴습니다. 조이와 나는 1974년 초에 결혼했고, 그 해 말에 우리 딸 티파니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남편이자 여섯 자녀 중 세 자녀를 둔 계부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박사 학위를 마치지 못했고, 이 벤처를 지원할 수 있는 직업을 갖기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
Not a distraction. But this new and powerful reality shattered the certainties of my former existence and meant that, from the very start of doctoral work, I labored at scholarship with one figurative hand behind my back.
The other hand was always busy trying to stir and discern emotional tea leaves, and trying to deal with the human damage that illicit love (even if holy) can leave in its wake. Joy and I married in early 1974, and our daughter Tiffany was born later that year. I was now a new creation: a husband, a stepfather of six children three of them full ime in the household), and the father of one. I had not finished my PhD, and I was still a long way from having a job that could support this venture.
유상용 - [산마을 너머, 지금 뭐해?] 이 책은 우리 동네에 있는 ‘대안 특성화 고등학교 산마을’을 졸업한 17명의...
[산마을 너머, 지금 뭐해?]
이 책은 우리 동네에 있는 ‘대안 특성화 고등학교 산마을’을 졸업한 17명의 20~30대 젊은이들의 산마을 이후의 삶과 그것의 바탕이 된 산마을에서의 체험을 돌아보는 글 모음집이다.
<대안학교는 있어도 대안사회가 따로 있지 않은> 세상에서, “대학 안가도 좋은 삶을 살 수 있어”라는 다 검증되지는 않은 희망과 권유를 받아들이며, 대학을 가든 안가든 무엇이 중한 지를 알아차려가는 인생 여행기다.
2000년도에 설립된 산마을고등학교는 올해로 24년을 맞이한 ‘청년’학교가 되었다. 편저자인 최보길선생은 이 책을 펴내면서, 산마을의 시작부터 함께 하면서 숙제처럼 여겨왔던 산마을에 대한 사람들의 질문을, 산마을과 그 이후를 온전히 살아온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통해 답해보려고 한다. 23년 동안 졸업한 392명의 젊은이들이 고뇌하며 자유를 찾아간 여정의 일단을 그 중 17명의 글을 통해 만난다.
< 장애인 협업농장, 지역 청년협동조합, 여성노동조합, 비영리 청소년 및 평화통일 단체 활동가, 인가 · 비인가 대안학교 교사, 프리랜서 인문학 연구 작가, 문학 작가, 출판기획자, 평화 인권 학습자 겸 기획가, 사회적 경제 부업을 하는 여행생활자(우피), 청년 주거공동체 출신 농부, 철학을 전공한 인터넷 뉴스 PD, 사진 찍는 스타트업 공간매니저, 축제를 연구하는 대학원생, 발도로프 교육에 관심 있는 건축학 전공자 >
참 다양한 길을 걸어가는 이들의 산마을에 관한 추억 중에는, ‘기숙생활을 포함한 3년 동안 너무 가까이 살아서, 좋아하고 미워하며, 많은 활동과 대화로, 무던히도 지지고 복고 살아온 시간들이, 졸업 후 시간이 흐르며 자기 삶의 자양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자연 평화 상생 (自然 平和 相生)이라는 산마을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 이념이 과연 학생들에게 얼마나 살아있는 것으로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때 생각하고 살아보고 흡수한 것은 아마도 시간이 흐르면서, 때로는 버티는 힘으로, 가끔 열어보는 일기장으로, 길을 잃을 때 쳐다보는 산위의 마을의 등불처럼, 서서히 힘을 발휘하겠지...
돌아보면 나의 고2시절도 미지의 세계에 대한 흥분과 열정과 두려움이 혼재된, 묘한 아름다움의 시기였다고 기억한다. 가능성의 꽃봉오리.
나도 산마을 야학 ‘마이라이프세미나’의 강사로서 9년간, 그들과 소수지만 깊게 대화를 나눠왔고, 둘째 아들도 3년전 산마을고를 졸업하고 지금은 군인이 되었다. 그 시기는 학교 내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 페미니즘의 바람이 불고, 인권-성평등-기후위기-채식 등의 공부와 활동이 활발한 때였다. 나는 학부모회장,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며 2년 이상 학생, 학부모, 교사들과 질풍의 시간을 함께 했다. 아들은 이제야 그 시기의 심적 부담에서 벗어나 돌아볼 수 있게 된 것 같다. 내가 대학교 때 겪었던 것을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 시절에 겪고 있던 것이다.
내가 대학시절에 겪고 의문을 품은 과제들은 나의 평생의 일이 되었고, 그 싹은 이미 고등학교 시절에 트기 시작했었다. 그러니 미지의 이 세상에서 정답을 일찍 결론 내기 보다는, 바른 질문을 찾아내어 돌사탕처럼 오래 입에 물고 슬슬 단맛을 녹여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글들은 또한 한국의 대안교육 20여년의 중간보고서로 읽어도 좋을 것 같다.
풀무학교와 같은 지사(志士)형 설립자 정신에 의한 개교와는 또 다른, 80~90년대 민주화와 이어진 대안사회, 대안교육운동의 시대정신으로 탄생한 한국의 여러 대안학교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고, 어떤 길로 가야할 지를 생각해보는 ‘산’ 증거로서의 사람과 글이다.
산마을고는 최근 산마을2.0을 모색해가고 있다. 그 중에 내가 특히 관심이 있는 것은 ‘마을-지역의 학교’로서의 산마을이다. 이미 여러 해 동안, 학교와 마을이 함께 길을 걸어왔고, 마을의 삶에서 실현해가고 있다.
홋카이도 조선학교의 삶을 다큐영화로 만든 ‘우리학교(김명준 감독, 2006)’가 있다. 당시 ‘공동체 상영’으로 산안마을 식구들과 함께 보며, 그 삶의 진정성에 감동해 눈물을 많이 흘렸다.
산마을은 ‘우리학교’다.

티머시 존슨의 ‘살아있는 예수’ < 한국성결신문, 뉴스조이
<화제의 책>티머시 존슨의 ‘살아있는 예수’
기자명 조재석 기자
입력 2012.03.28
‘역사 속 예수’ 아닌 ‘살아있는 예수’ 증언
성서, 전통, 예배와 성도 생활 등으로 예수 배우기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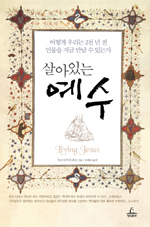
그는 이 책에서 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를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인물로 다루는 연구는 문제가 있으며 우리는 신약성서 전체에 나타난 예수의 복합적인 이미지 모두를 보아야 하며 그분은 부활하여 현재도 살아있는 예수임을 다양하고 신비로운 묘사로 설명한다.
저자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재정립하기 위해 역사적 예수를 재구성하려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역사적 방법으로 재구성한 예수에 근거해 그 신앙을 재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역사적 방법이 추구하는 과거의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살아있는 예수를 배우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해 가기 시작한다.
저자는 예수를 배우게 되는 복합적이고 풍부한 방식으로 성서와 신경, 신앙공동체의 교육 등 전통을 비롯하여 공동체의 예배와 성도들의 생활, 섬기고 포용하는 작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배우기를 설명한다. 특히 저자는 예수를 배우는 것은 결과적 산물보다 과정에 관심을 둘 것을 요청하면서 아내와의 상호 배움을 예를 들어 침묵과 묵상, 고난과 인내, 지속적인 배움, 공동체와 함께 배울 것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곳에 살아있는 주님으로서 현존하기 때문에 신약성서를 아득한 과거에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록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메시아의 특성을 풍부히 계시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러한 입장에 근거해 저자는 요한계시록을 비롯해 유다서, 베드로전?후서, 야고보서, 요한서신과 히브리서 등 서신서에 나타난 예수의 독특한 칭호를 살피며 예수의 현재적 실제와 신앙인의 관계성 진술 내용을 찾아간다. 이어 초기 그리스도인에게 예수가 가지는 의미를 보여준 최초의 증언인 바울서신과 예수에 대한 네 가지 묘사를 하고 있는 사복음서와 누가행전으로 통칭되는 사도행전의 예수 증언을 되살펴간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2000년전 어느 한 시점만이 아니라 역사와 신앙 속에서, 오늘의 현재에 살아있는 예수를 우리에게 생생히 경험케 한다.
이 책은 살아있는 예수를 설명하기 위하여 신약성서 각 글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학생이나 성도들에게 신약성서를 종합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개론으로서, 예수 연구나 기독교 과목의 교재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루크 티머시 존슨/청림출판/268쪽/1만3천원>
시놀, 5070세대 온라인 놀이터로 시니어 사회문제 해결 앞장 < K글로벌타임스
시놀, 5070세대 온라인 놀이터로 시니어 사회문제 해결 앞장
스크롤 이동 상태바
현재위치K글로벌 리포트
기자명최정훈 기자
입력 2023.08.22
신중년층 문화·여가·취미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
인공지능 가미해 MZ세대처럼 수용성 높여
해외교포 시작으로 시장확대 채비
[K글로벌타임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는 나라로 손꼽힌다. 노인 빈곤, 독거 노인, 고독사 등 언론보도를 통해 시니어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 없이 답보상태에 있다. 시니어에 속하는 5070세대들이 2,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전용 커뮤니티는 전무한 실정이다.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소외된 중년, 노인층들은 비활동성과 우울증 등 문제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시니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만남과 관계 형성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니어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선 스타트업이 등장해 이목을 끌고 있다. 시놀은 '인생 하반기 건강한 에이징을 위해'를 표방하며 5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액티비티 가득한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있다. 시놀은 시니어들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고객들을 위한 온라인 놀이터를 구현하는데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민지 시놀 대표 [사진=시놀]
김민지 시놀 대표 [사진=시놀]다시 찾아온 청춘 꽃피우도록 기여
우리나라에는 MZ세대와 알파 세대를 합친 것 이상으로 시니어 세대가 많다. 국내 5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3%를 넘었다. 게다가 국내 노년 인구 중 53.3%는 싱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시니어인데 중년, 노년층을 위한 서비스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점차 길어지는 노후로 인해 60대부터 100세까지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니어들은 외로움과 고립감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 중 챙겨줄 사람이 없는 독신이나 이혼한 사람의 우울증 비율은 2배 가까이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년층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축소되고 사회관계 수준이 낮아지며 자연스레 여가활동의 범위도 한정되기 일쑤이다. 이는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최근 이 같은 추세에서 등장한 '시니어 테크'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아도 건강 관리에 국한한 서비스만 떠오른다. '에이징 테크' 분야가 각광받고 있지만, 아직 액티브 시니어들이 활동할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서비스나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앱 등은 부재한 상황이다. 시놀의 가치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배경이다.
시니어의 우울증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놀'은 시니어 놀이터(놀자)의 약자이다. 5070 신중년들이 친구가 돼 서로 문화·여가·취미를 나누고, 제2의 인생을 찾도록 돕는 시니어 소셜벤처 기업이다.
김민지 시놀 대표는 "시니어 세대만을 위한 소셜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연령의 그들끼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 일을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하는데, 미래에셋증권 은퇴컨설팅 경력과 시니어 시장 이해도가 높은 저희 팀이 최적이라고 자신했다"고 밝혔다.
시놀은 단순 '시니어 데이팅'을 넘어 액티비티, 교육, 커머스, 컨시어지 등 시니어를 위한 'All-in-one'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커뮤니티 플랫폼 앱을 구축하고 있다.
 [사진=시놀]
[사진=시놀]진정성 있는 시니어 문제 해결에 방점
시놀은 현재 '단짝찾기'와 여행, 교육, 문화, 건강 등 온·오프라인 취미 여가 '모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짝찾기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주변 이성친구를 소개시켜 주는 서비스로, 온라인에서 부담없이 친구를 사귀고 대화할 수 있다. 핸드폰 번호로 3초 회원가입하게 되면 이용자는 '단짝 찾기' 메뉴에서 가까운 위치에 거주하며 관심사가 통하는 이성 친구를 추천받는다.
하루에 4명의 친구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구독권을 결제하면 매일 친구 10명 소개와 대화 무제한, 나에게 관심 있는 친구 보기 기능 등이 활성화된다. 특히 온라인상의 만남 주선이다 보니 매칭 전 상대방의 관심사와 나이, 직업, 종교, 결혼 상태, 음주량 등을 먼저 확인할 수 있다. 마음에 드는 짝이 나타나면 상대방에게 편지를 보내 관심을 표할 수 있으며, 이를 수락하면 매칭돼 대화로 이어진다.
또한 이달 론칭한 '모임'은 내 위치 주변의 관심 있는 모임을 검색하고 참여해 자연스럽게 소속감과 신체 건강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다. 누구나 모임장이 돼 재능을 맘껏 공유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활동하며 소득 창출의 기회도 얻을 수 있는 건강한 인생 하반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
모임은 8월 초 출시 이후 누적 앱 다운로드 3만건,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7,000여명을 기록하는 등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본인인증' 대신 ‘인공지능(AI) 실시간 안면 인식 사진 검증’으로 이용 장벽을 낮춰 50세이상 회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 시놀의 설명이다.
회원 성비는 남성 75%, 여성 25%다. 모임 메뉴를 통해 5070 누구나 운동이나 와인, 친목, 봉사활동 등 원하는 주제의 소모임을 개설할 수 있다. 모임장을 통해 자율 운영되며, 모임장은 재능을 기부하며 정기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시놀은 수월한 모임 운영을 위해 대관·홍보·정산 지원은 물론, 모임장 양성 교육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앱을 통해 자발적으로 생성된 모임은 벌써 100여개에 달한다. 가까운 거리에서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해 취미, 여가를 즐기는 회원이 많아지면서 모임 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 회원들의 모임 참여도, 앱 활동성이 증가하는 분위기라는 것이 시놀의 분석이다.
 '디캠프 디데이' 행사에서 시놀 IR 피칭하는 김민지 대표 [사진=시놀]
'디캠프 디데이' 행사에서 시놀 IR 피칭하는 김민지 대표 [사진=시놀]글로벌 시니어 고객에게 접근 박차
해외에서는 매치닷컴(Match.com) 등 시니어 데이팅 및 액티비티 서비스들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시니어 타겟 서비스가 개발 및 확산되는 추세이다.
시놀 또한 글로벌 시니어 고객을 유치할 목표로 해외시장 공략을 추진 중이다. 시놀은 1차적으로 현지시장 공략보다는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앱 서비스를 릴리즈 할 계획이다. 연말 20개국으로 앱 배포 지역을 확대하고, 국가별 반응을 토대로 최소 실행 가능한 번역 제품(MVP, Minium Viable Product)을 가지고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
시놀은 아직 서비스 1년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저 테스트를 통해 Product Market Fit을 찾아가는 것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아직 앱의 유료 결제자는 월 600여명 정도이고, 더 쉬운 이체 결제방법을 제공하는 것과 높은 사용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K글로벌타임스 최정훈 기자] paraclituss@naver.com
관련기사
2024/01/04
Quaker Testimony: What We Witness to the World - Friends Jour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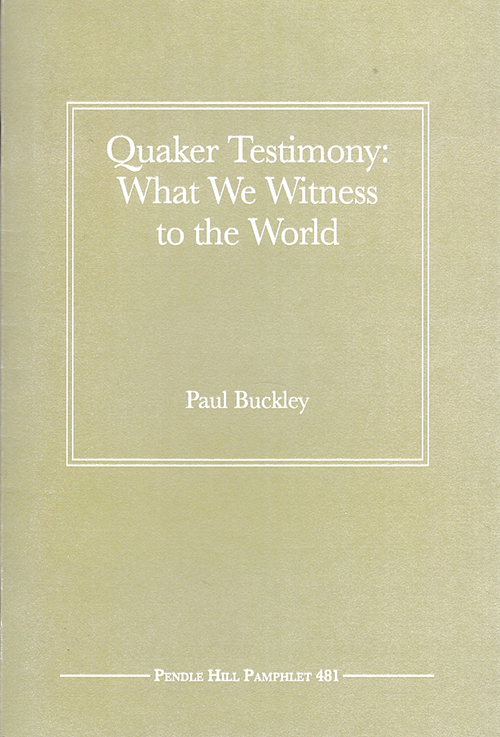
Quaker Testimony: What We Witness to the World
Reviewed by Marty Grundy
January 1, 2024
By Paul Buckley. Pendle Hill Pamphlets (number 481), 2023. 34 pages. $7.50/paperback or eBook.
“So you want to learn more about Quakerism?” I used to tell newcomers: find a Quaker, follow her around and watch how she lives. Paul Buckley has given us the Pendle Hill pamphlet we have been waiting for: one that rightly describes Friends testimony as the witness of our lives, 24/7.
The first part of the pamphlet describes the historic role of Quaker testimony.
For early Friends, a testimony was “an act that publicly witnesses or testifies to an aspect of our most basic spiritual beliefs;
it is an outward expression of something that the Inward Light has revealed to an individual or a group of people.” Buckley describes five characteristics specific to a Quaker testimony:
- It originates with a divine leading, not something we think is a good idea.
- It is a consistent public behavior, not an occasional or private action.
- It is communal behavior, not just personal.
- It is a challenge to act outside one’s comfort zone, and for others because it challenges their assumptions and normal conventions.
- It is rooted in God’s love for us and our love for the deep well-being of others.
Under persecution, it was obvious who was a Quaker and who was not. But after the 1689 Toleration Act, it became easier for someone to claim to be a Quaker while not having to do anything unpopular or difficult. In the eighteenth and early-nineteenth centuries, strict rules of behavior were codified: no longer to mark the frontier of the Lamb’s War but as a boundary between Friends and non-Friends. The rules became like a creed for Quakers. But as major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s multiplied—especially after the U.S. Civil War—these archaic rules broke down and were largely abandoned. The inner spiritual truth behind them had long since evaporated for most Friends.
======
Today most Friends are familiar with SPICES, an acronym for a basket of Quaker testimonies. There is no official definition, but often the letters are taken to stand for simplicity, peace, integrity, community, equality, and stewardship/sustainability.
Apparently the acronym began in the 1990s as a teaching tool for children (although the idea to single out Friends’ social principles into a list originated over 40 years earlier with Howard Brinton), especially to help non-Friends in Quaker schools get a handle on “Quaker values.” Buckley points out that “values are things we decide on. Testimonies are products of the Inward Light.”
=====
The dangers of emphasizing SPICES rather than testimony is that the former become a secular creed: the easy answer to the question, what do Quakers believe? SPICES do not need spiritual roots. They are generally acceptable to nearly anyone and are not distinctly Quaker. In effect, SPICES dumbs down Quakerism.
Instead of a vibrant faith based on listening for guidance from the Divine, it is a list of things to do. Instead of the traditional aim to be faithful, SPICES encourages us to be task-oriented, to achieve successful results. Everything Friends stand for has to be shoe-horned into one of these words, or we need to add more letters. Finally, by assuming the SPICES are the sum total of Quaker life, we constrict our vision of spiritual gifts. Above all, where is love in the list?
=====
Our testimony is our life; let our lives speak.
When necessary, use words. This pamphlet is highly recommended for every meeting to read and consider together. Discussion questions are included.
Marty Grundy is a member of Wellesley (Mass.) Meeting and has been trying for years to relay the message in this pamphlet to Friends.
이병철 - -연하장을 발송하다
이병철
17 m ·
-연하장을 발송하다/
어제 오후에 우체국에 가서 지인들에게 올해의 연하장을 보냈다. 다른 해보다 훨씬 빠르게 보낸 것인데, 평소 정원님과 둘이 하던 일을 마침 휴가차 집에 와 있던 막내가 거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새해 초에 판화 형태의 연하장을 직접 만들어 보내기 시작했던 것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햇수로는 거의 50여 년에 가까운 것 같다. 결혼 전부터인데, 내 기억으로는 76년부터라 싶다. 이 연도를 기억하는 것은 이 해가 내 생애의 중요한 변곡점(?)이 된 해라 싶기 때문이다.
75년 이른 봄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다가 농민운동을 그 길로 선택하고 뛰어든 해가 그 해부터였는데, 그 해의 초에 고무판에 그림을 새기고 엽서에 탁본하듯이 먹물로 찍어 보냈던 것이 그 처음이었으리라 싶다.
연하장 작업을 고무판에서 목판으로 바꾼 것은 80년, 결혼한 이후인데, 그 뒤로 한동안은 목판에 그림을 새겨 찍은 판화에 붓글씨로 써서 연하장을 만들어 보냈다.
정원님의 기억에 의하면 내 연하장 그림과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은 89년부터라고 하는데, 이 해부터 연하장의 그림 내용이 바뀌고 색채도 검정에서 채색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 연하장은 나도 기억한다. 연꽃을 새기고 붉은색을 입힌 판화였다. 홍련(紅蓮)을 새겨 보낸 것이다. 그동안 투쟁적이거나 강한 사회적 메시지를 표현한 그림 대신에 처음으로 꽃이 등장한 것이었다. 내가 기존의 운동에서 이른바 생명운동으로 전환(?)한 시점도 이때부터라 할 수 있다.
87년은 아마도 내 생애에서 가장 치열했던 때라 여겨지는데, 당시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의 조직을 책임지고 있던 나는 백성(民)이 나라의 주요 의제를 직접 결정하는 체제를 꿈꾸었고 이는 결국 단일화의 실패로 좌절되면서 사회운동에서의 은퇴를 선언(?)하고 집으로 돌아와 일 년 넘게 칩거하며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새롭게 모색했고 그런 모색 끝에 다다른 것이 생명운동이었기 때문이다.
내 연하장에서 그림 대신에 글씨로 바뀐 것은 2,000년대를 지난 뒤라 싶다. 모자라는 솜씨에 그림을 새긴다는 것이 갈수록 부담스러워 쉽고 편하게 한다고 글씨로 바꾸었다고 하겠는데, 글씨로 사자성어 등을 새기면 한 해의 메시지를 훨씬 더 쉽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이 또한 귀찮다는 생각에 글자 한 자를 새기기 시작했던 것도 어느새 십수 년에 이른 것 같다.
해마다 연초에 새해를 품어갈 한 글자를 써서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그동안 새겨 보낸 글자가 올해의 비(悲 24년), 성(省 23년), 성(醒 22년), 지(止 21년), 공(共 20년), 서(恕 19년) 등인데, 올해의 비(悲)와 함께 하는 '자(慈)'를 새겨보낸 해가 2014년이니, ‘자(慈)’와 ‘비(悲)’가 하나임을 깨닫는 것에 10년이 걸렸다고 할 수도 있으리라 싶다.
내가 얼마나 게으른가 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 내가 거의 오십여 년 가까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연하장을 만들어 보내왔다는 것은 내가 생각해도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가족들도 신기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다. 사실 나도 연말이 되면 인제 그만두어야지 하는 생각을 갈수록 더 하게 된다.
연하장을 한 장 한 장 목판으로 찍고 글씨를 써서 만들어 보내는 작업이 품과 시간이 여간 걸리는 게 아니다. 연말과 연초를 온통 이 일에 매달리다시피 해야 한다.
글자를 새긴 목판에 잉크를 묻히고 한지를 덮고 숟가락으로 문질러서 한 장씩 찍는 작업은 오래전부터 공부모임 도반들이 함께해주고 있지만 그 위에 다시 무언가를 쓰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작업은 우리 내외가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귀찮고 힘겹다는 생각이 들 때가 없지도 않다. 그래서 매번 연하장 보내는 것은 올해로 마지막이라고 말하곤 한다.
그럼에도 내가 이리 계속해온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 하나는 백수로 살아온 내가 신세 진 이들에게 그 고마움을 표현할 다른 마땅한 방법이 없이 이렇게라도 한 해의 인사를 대신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내가 직접 연하장을 만들어 보내는 일을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 때문이다.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연하장을 만들어 보낼 지인들이 있고, 아직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생각하면 이 또한 감사하고 즐거운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찍는 것이 한정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혹시 그동안 내 연하장을 받았는데, 왜 올해는 보내지 않는가 하고 서운해하는 이들이 계신다면 양해해주시길 바란다.
내가 깜빡했을 수도 있고, 만든 연하장이 모자랐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인지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한다는 의미가 갈수록 각별하게 느껴진다. 해가 바뀐다는 것이 그냥 달력 상의 바뀜만이 아님이 절실히 느껴지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곧 우주적 사건임이 몸으로도 경험되는 것이다.
해마다 한 해를 품어갈 한 글자와 그 글자에 담은 새해의 서시 한 편을 이번 생의 고마운 이들과 나눌 수 있어 고맙고 기쁘다.
올 한해, 함께 품어가자고 했던 '비(悲)'를 새삼 생각한다. 아픔을 함께 하지 못한다면 사랑일 수 없다는 것을.
아침에 연하장에 관한 생각이 들어 함께 나눈다.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