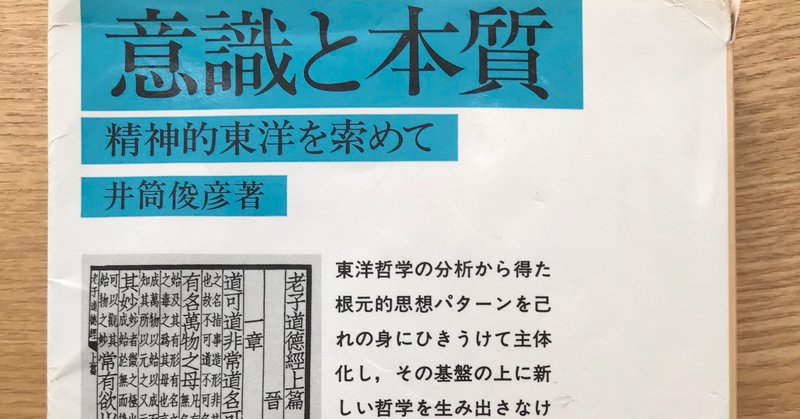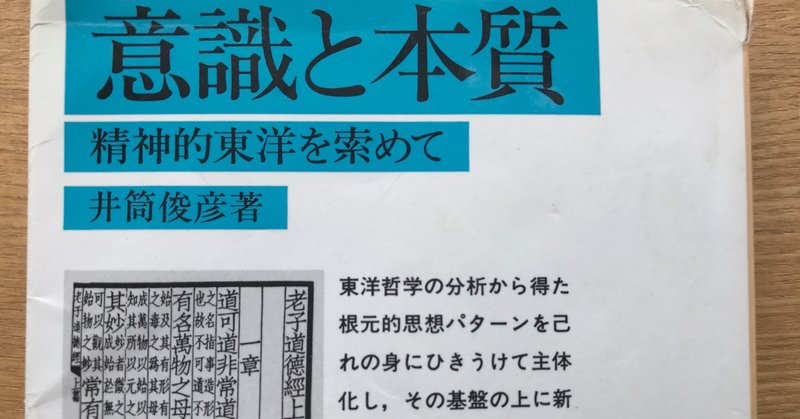
井通俊彦『의식과 본질』(7)
이츠쓰 슌히코의 「의식과 본질」을 단지 읽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으로, 장마다 자신 나름대로 개요를 정리해 본다, 라고 하는 시도.
【기본적으로 「의식과 본질」(이와나미 문고)의 본문을 인용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의 수행 과정은 "깨달음"을 정점으로 한 삼각형의 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저변의 2점 AB는 경험적 세계이다.) 저변의 A로부터 정점으로 향하는 한쪽 선은 이른바 향상도, 정점에서 경험적 세계의 저변 B로 향하는 하강선은 이른바 향하도로 이다. 향상도는 「미오」, 향하도는 「기오」의 상태. 경험적 세계에서 출발하여 위로 오르고 정점의 '깨달음'에 이르고 다시 원래의 경험적 세계 차원으로 내려온다.
선자의 본연을 나타내는 이 「미오(경험적 세계)」→「오오(정점)」→「기오(경험적 세계)」를, 「본질」론의 관점에서 「분절 Ⅰ(경험적 세계 A )」→「무분절(정점)」→분절Ⅱ(경험적 세계 B)」라는 형태로 대체해 본다.
삼각형의 정점을 이루는 「깨달음」 즉 무분절은 의식・존재의 제로 포인트. 우리가 보통 사물끼리의 사이나 사물과 자아 사이에 인정하고 있는 일절의 구별, 즉 분절이 예쁘게 깨끗이 소멸된 모습인 것이다.
그에 대해 삼각형 저변의 양단을 차지하는 분절 Ⅰ·Ⅱ는 사물이 서로 구별되고 또 그 사물을 인지하는 의식이 사물로부터 구별된 세계, 요컨대 우리의 평소 익숙한 보통의 경험적 세계 이다. 분절 Ⅰ과 Ⅱ는 완전히 같은 세계이며, 표면적으로는 양자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무분절이라는 형이상학적 「무」의 일점을 거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분절(Ⅰ)과 분절(Ⅱ)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왜냐하면, 어느 쪽도 동일하게 분절이라도, 「본질」론적으로 봐, 분절(Ⅰ)은 유「본질」적 분절이며, 이것에 반해 분절(Ⅱ)는 무「본질」적 분절이기 때문에 이다.
당대의 선사 아오하라 유신의 말에서 그 흐름에 대해 보자.
골신을 깎는 긴 수업의 세월을 거쳐 마침내 깨달음이 깊어지고, 안심의 경위에 진정할 수 있어 숙련된 아오하라 유노부가 선자로서의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고, 이것을 3단계 으로 나눈다.
첫 단계는 선의 길에 들어가기 이전 시기. 그는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눈으로 자기 밖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산은 산이고 강은 강. 세계는 유 「본질」적으로 확실히 분절되고 있다. 동일율과 모순률에 의해 엄격히 지배된 세계. 산은 어디까지나 산이어서 강이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제2단계에서는 참선하여 어느 정도 깨달음의 눈을 열어보면 세계가 한꺼번에 변모한다. 제1단계일 정도로 강력했던 동일율과 모순률이 효력을 잃고, 산은 산이 아니라 강은 강이 아니게 된다. 산도 강도, 모든 사물이, 「본질」이라고 하는 유금을 잃는다. 그때까지 이른바 객관적 세계를 가득 틈없이 채우고 있던 사물, 즉 '본질' 결정체가 녹아 흘러나온다. 존재세계의 표면에 종횡무진으로 끌어당겨져 있던 분절선이 닦아진다. 더 이상 산은 산이라는 결정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강은 강이라는 결정점이 없다. 즉, 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고 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산이나 강을 객체로 자신 밖에 보는 주체, 나도 거기에는 없다. 모든 것이 무「본질」, 따라서 무분절, 보다 간단하게 말하면 「무」인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다시 "유"의 세계. 두 번째 단계에서 일단 무화된 사물이 다시 유화되어 나타난다. 제1단계의 세계와 일견 조금도 다른 사물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다. 산을 보면, 그것은 이전과 같이 산이며, 강을 보면, 상도 변함없는 강. 깨달음이 깊어져 안심의 경지에 침착할 수 있었던 달도의 사람의 눈에 비치는 것은, 제1 단계와 같이 분절된 존재의 모습, 분절적 세계인 것이다. 하지만 제1단의 분절세계와 제3단의 분절세계 사이에는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제1단계에서 각각에 「본질」을 주어져 정연하게 분절되고 있던 다양한 사물은, 제2단계에서 「본질」을 빼앗겨, 분절을 잃는다.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옮겨 가면 해당 세그먼트가 모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분절은 돌아오지만 '본질'은 돌아오지 않는다. 존재분절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일물의 세계가 아니다. 산은 산으로 존재하고 강은 강으로 존재한다. 산도 있으면 강도 있다. 하지만, 그 산이나 강에는 「본질」이 없다. 즉, 그 산이나 강은 「본질」적 응고성을 갖지 않는 산이며, 강이다.
제1단계, 즉 분절(Ⅰ)'은 사물이 불변의 "본질"에 의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혼입하지 않는다. 모든 존재는 불투명하다. 산은 강에 대해 불투명하고 강은 산에 대해 불투명하다. 이 「본질」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인가. 대승불교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본질'은 인간의 '망망'에 의해 초래된다고 생각된다. 사실은 없는 '본질'을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험적 세계, 즉 「현실」이란, 이 실재하지 않는 「본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환상의 허구로 가득한 세계라고 생각한다.
그 세계를 망념, 망상이라고 인식하고, 경험적 세계의 모든 것이 사실은 무「본질」이라고 깨달을 때, 사람은 「향상」의 길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망상 분별을 제거해 버리면, 「산이다」라고 인식되고 있는 X와 「강이다」라고 인식되고 있는 Y와의 사이에 구별은 없어진다. 일체의 존재자에 대해 우리의 의식의 망상적 분별, 즉 분절 기능을 정지해 버리면, 모두는 무분절, 무「본질」, 보다 선적으로 말하면 「무」가 된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이성적인 이해라면 표층 의식을 한 걸음도 나오지 않는다. 표층 의식으로 이해된 것은 무엇이든 유 "본질"적으로 분절되어 있다. 수행을 통해 표층의식이 완전히 타파된 곳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심층의식적 사태야말로 이 삼각형의 정점, '깨달음'이며, 무분절, '무'이다.
그러나 선의 설하는 「무」는 절대 무분절자로서의 「무」이지만, 정적인 무는 아니다. 그것은 부단하게 자기 분절해 가는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무"이다. 분절을 향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지 않는 무분절은 단지 무이며, 하나의 사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선의 문제로 만드는 "무"가 아니다. 선이 생각하고 있는 「무」는 우주에 드는 생명의 원점이며, 세계 현출의 태원이다.
그러니까 제3단계, 「분절(Ⅱ)」에서는 정점인 무분절의 정점으로부터 다시 경험적 세계에 내려온다. 분절(Ⅱ)의 세계는 분절(Ⅰ)의 세계와 같이, 산은 산, 강은 강, 꽃은 꽃, 그리고 각각의 사물이 분절된 세계이다. 그러나 분절(Ⅰ)이 '본질'에 의해 사물이 분절되고 있는 반면, 분절(Ⅱ)은 사물은 '본질'에 의해 고정되어 있지 않은 무'본질'적인 분절이다. 분절(Ⅱ)의 차원에서, 모든 존재자는 서로 투명하다. 여기에서는, 꽃이 꽃이면서…혹은, 꽃으로서 현상하면서…게다가, 꽃 「이다」가 아니고, 꽃 「노모시」(길원)이다. 「…의 과시」란 「본질」에 의해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이 꽃은 존재적으로 투명한 꽃이며 다른 모든 것에 대해 스스로를 여는 꽃입니다. 분절(Ⅰ)의 차원에서, 꽃은 하나의, 그 자체로 독립적인, 닫힌 단체였다. 꽃은 모든 다른 것들에 대해 굳게 스스로를 닫고 있었다. 하지만 '본질'이 없는 분절(Ⅱ)의 세계로 옮겨질 때, 꽃은 완고한 자기 폐쇄를 풀어 몸을 연다.
그러면 원래 '본질'에 의거해야 할 분절이 어떻게 '본질' 봉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분절(Ⅱ)이 분절(Ⅰ)과 다른 결정적인 특징은 그것이 무분절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에 있다. 분절(Ⅱ)의 세계는 경험적 세계의 모든 사물 중 하나 하나가 각각 무분절자의 '전체를 들고 있는' 자기분절인 것이다. 「무」의 전체가 그대로 꽃이 되어 새가 된다. '분절(Ⅰ)'과 같이, 현실의 작게 구분된 부분이 단편적으로 잘려져, 그것이 꽃이거나 새이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 전체가 꽃이고 새이다. 국소적 한정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여지는, 여기에는 전혀 없다. 즉 무「본질」적인 것이다.
따라서, 무분절의 직접적인 무 매개 자기분절로서 성립된 꽃과 새는 근원적 무분절성의 차원에서 하나이다. 이러한 경위에서 이러한 형태로 분절된 사물 사이에 존재상통이 성립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꽃이 피고 새가 헐떡이다. 새와 꽃은 서로 투명하고, 서로 침투해, 융합해, 마침내 돌아가서 하나가 되어, 무라 사라진다. 하지만 사라진 순간, 간발을 견디지 못하고, 또 꽃은 피는 새는 헐떡이다.
번개와 같이 빠르고, 무분절과 분절 사이의이 차원 전환. 그것이 부단하게 반복되어 간다. 반복적이지만 매번 새로운 것. 이것이 존재라는 것이다. 적어도 분절(Ⅱ)의 관점에 서서 본 존재의 진상(=깊층)은 이와 같이 역동적인 것이다. 분절된 "물"(예를 들어, 꽃)이 그 자리에서 무분절에 귀입하고, 또 다음 순간에 무분절의 에너지가 전체를 들고 꽃을 분절한다. 이 존재의 차원 전환은 순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현실에는 무분절과 분절이 이중사진에 겹쳐 보인다. 그것이 즉 「꽃의 곁들임」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것은 각각 무분절자의 전체 그대로의 현실이기 때문에, 분절된 일체가 다른 일체를 포함한다. 꽃은 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적 존재 구조 그 자체 안에 새나 그 밖의 일절의 분절을 포함하고 있다. 새는 새일 뿐만 아니라 안에 꽃도 포함한다. 모든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무분절자가 부단하게 자기 분절해 가는, 그 분절의 방법은 한없이 자유. 우리 인간이 인간 특유의 감각 기관의 구조와 코토바의 문화적 제약성에 속박되면서 행하는 존재 분절은 무한히 가능한 분절 스타일 속의 매우 한정된 좁은 하나이다 단지. 예를 들어 물을 볼 때 인간의 한정된 시점을 넘어서 만약 텐진이나 용어들의 보다 고차적인 시점에서 보면 물은 완전히 달라 보인다. 그러나 더욱 거기도 넘어, 「물, 물을 보는」곳에 뛰어 나와야 한다고, 도모토는 말한다. 사람이 천인이거나 물고기가 보는 물이 아니라 물이 보는 물.
「물, 물을 본다」 여기에 분절(Ⅱ)은 그 유감스러운 깊이를 드러낸다. 「물, 물을 보는」의 경위는, 인간의 언어적 주체성의 역을 넘고 있다. 거기에 물을 보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 물을 보는'이 아니라 '물, 물을 보는' 것이다. 즉, 인간이 X를 보고, 「물」이라고 하는 말을 발해, 물로서 분절된 X에 물이라고 하는 「물」을 보는 것은 아니다. 물이 물 자체의 코토바에서 스스로를 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물의 이 자기분절을 「물, 물을 본다」라고 말한다. 물 그 자체의 코토바로, 라고는 무분절자 자신의 생의 코토바로, 라고 하는 것. 물이 물 자체를 무제한적으로 분절하는, 그것이 물의 현성이다. 그러므로, 분절된 물은 명백히 역력으로 현성되지만, 이것에 「본질」을 주고, 물을 「본질」적으로 고정하는 언어 주체는 여기에는 없다. 그러나 물이 물 자체를 물로 분절한다는 것은 결국 분절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분절하면서 분절하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무'본질'적 존재분절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